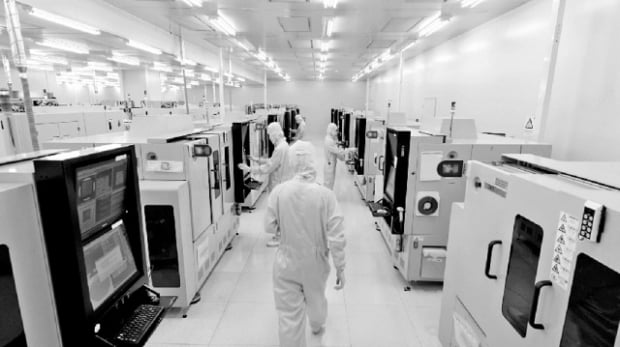
금융위기를 전후해 한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절반 수준으로 둔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책으로는 기업 혁신이 제시됐다.
4일 한국은행 BOK경제연구에 실린 '2001년 이후 한국의 노동생산성 성장과 인적자본: 교육의 질적 개선 효과를 중심으로' 논문에 따르면 2010~2018년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2.67% 증가하는데 그쳤다. 금융위기 이전인 2001~2008년 4.6%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노동생산성이란 국내총생산(GDP)을 총 노동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한 나라의 근로자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했는지를 보여준다.
이 논문에서 유혜미 한양대 부교수는 한은과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노동생산성 둔화 원인을 분석했다. 정확성 향상을 위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컸던 2009년은 자료에서 제외했다.
유 부교수는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둔화한 원인을 총요소생산성과 자본축적 둔화로 파악했다. 총요소생산성이란 노동이나 자본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가가치의 증가분을 의미한다. 이는 생산과정에서의 혁신과 관련이 깊은데, 혁신이 일어나면 근로자가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지만, 혁신이 지체되면 이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2001∼2008년까지만 해도 총요소생산성이 노동생산성을 연평균 0.52%가량 올리는 데 기여했으나 2010년∼2018년 시기에는 0.15% 높이는 데 그쳤다.
자본축적 등 기업투자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도 줄어들었다. 2001~2008년 자본축적이 노동생산성을 연평균 3.14% 끌어올렸다면 2010~2018년에는 1.41% 높이는 데 그쳤다. 기업투자가 과거처럼 활발하지 않아 근로자들의 생산성 증가율도 주춤해진 셈이다.
반대로 교육의 질이 높아지면서 인적자본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의 양·질적 증가분은 2008년 이전까지 노동생산성을 연평균 0.93% 높였다면 2010년 이후에는 1.11% 끌어올렸다.
유 부교수는 "한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크게 하락했고,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혁신의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며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인적자본을 축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