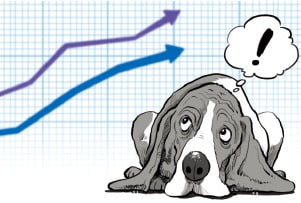 마트에서 늘 사던 감자칩을 집었는데 가볍게 느껴진다. 자세히 보니 가격과 봉투 크기는 그대로인데 감자칩 양이 줄었다. 유명한 패션잡지 ‘보그’ 2009년 6월호는 화려한 패션을 걸친 젊은 모델 대신 세 아이의 엄마가 된 왕년의 슈퍼모델 누드를 표지 사진으로 내걸었다.
마트에서 늘 사던 감자칩을 집었는데 가볍게 느껴진다. 자세히 보니 가격과 봉투 크기는 그대로인데 감자칩 양이 줄었다. 유명한 패션잡지 ‘보그’ 2009년 6월호는 화려한 패션을 걸친 젊은 모델 대신 세 아이의 엄마가 된 왕년의 슈퍼모델 누드를 표지 사진으로 내걸었다.이 두 가지 사실의 공통점은? 2016년 출간된 책 《시그널(Signals)》의 저자 피파 맘그렌은 모두 불황을 예고하는 ‘신호’들이라고 말한다. 감자칩 중량을 줄인 것은 원가 절감을 위한 제과업체의 고육책이라는 것이다. 잡지 커버에 등장한 유부녀의 누드는 패션의 주 고객층이 젊은 여성에서 안정적 소득을 가진 중년 여성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는 해석이다.
맘그렌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백악관 경제정책 특별보좌관을 지낸 경제학자이자 정책전문가다. 그는 “아집에 사로잡힌 전문가와 학자들은 이처럼 작은 일화나 사건들도 숫자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눈을 감는다. 그들은 거의 언제나 틀리면서도 숫자에 대한 굳은 확신은 버리지 않는다”고 일갈한다.
그의 분석이 모두 옳은지는 다소 논란이 있지만 경제를 보는 또 다른 시각을 제공한다는 점만은 부인하기 어렵다. 맘그렌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최근 국제 금값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은 보통 경기가 나쁠 때 인기가 올라간다. 실물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인플레이션이 기승을 부릴 때 최후의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게 금이다.
최근 글로벌 증시는 코로나로 인한 낙폭을 대부분 만회했다. 부동산시장도 나쁘지 않다. 주요국 물가도 안정세다. 그런데 금값은 왜 뛸까. 전문가들 중에는 금값 강세를 ‘인플레이션 시그널’로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로이터통신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개가 결국 짖을지도 모른다(Inflation dog may finally bark)’고 전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 각국 정부가 경쟁적으로 돈을 풀었지만 물가 안정세가 지속된 것을 두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짖지 않는 개(the dog that didn’t bark)’라고 표현한 것을 거꾸로 비유한 것이다.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억제된 것은 글로벌 분업화와 기술혁신 덕분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상당히 훼손돼 이제는 개가 다시 짖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다. 치솟는 금값이 인플레이션을 알리는 진짜 ‘시그널’이 될지, 개가 짖지 않고 계속 침묵을 지킬지 두고 볼 일이다.
김선태 논설위원 kst@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