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 발탁 과정에서 정부가 정한 인사 7대 원칙보다 다주택 보유 여부가 더 중요한 자격으로 떠올랐다. 부글부글 끓는 부동산 민심 여파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사진)는 제기된 위장전입 의혹 일부를 인정했다. 김대지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 관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실상 위장전입을 인정했다.
그는 "한 동네에서 계속 살던 딸이 잠실로 주소를 옮길 때 학교 적응을 우려해 부모 입장에서 (아이) 엄마의 주소를 늦게 옮기는 방법으로 (기존 학교에) 다녔다"고 말했다.
앞서 김대지 후보자는 캐나다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2009년 서울 송파구로 이사하면서 기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소를 유지해 딸의 전학을 막기 위한 위장전입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위장전입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초부터 제시한 고위공직자 배제 '인사 원칙' 항목 중 하나지만, 이날 청문회 온도는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현황을 따질 때와는 사뭇 달랐다. 김대지 후보자 임명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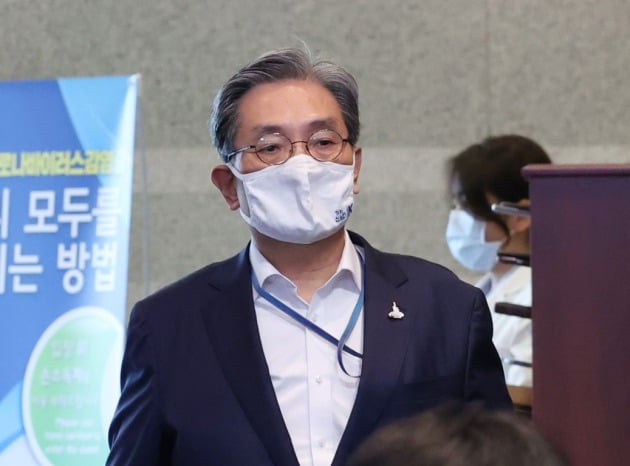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과정에서 5대 인사 원칙을 제시했다.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을 저지른 경우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배제한다는 골자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과정에서 5대 인사 원칙을 제시했다.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을 저지른 경우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배제한다는 골자였다.이들 원칙은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해당 인사들은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지만 청와대는 "국민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임명을 강행했다.
청와대는 같은해 11월 보다 강화된 7개 인사 원칙을 발표했다. 기존 5대 기준에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가 추가됐다. 하지만 원칙은 또 깨졌다. 위장전입과 논문표절 의혹에 휩싸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아파트 '다운 계약서'를 썼기 때문이다. 위장전입 등으로 곤욕을 치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도 마찬가지였다.
정권 후반기로 접어들며 청와대의 도덕성 검증 기준이 옅어지면서 오히려 다주택 여부가 중요 잣대로 떠올랐다. 집값이 폭등하고 여론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 고위 참모진들의 다주택 보유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줬다는 평가 때문이다.
지난 7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 전원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던 게 이런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똘똘한 한 채' 논란에 휩싸였던 노영민 실장은 당초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려 했지만 청와대가 강남 불패를 부추긴다는 비판 여론에 결국 서울 반포 아파트까지 팔았다. 도곡동과 잠실동에 각각 본인과 부인 명의로 한 채씩 2주택자인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물을 내놓아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후 청와대는 이달 12일 정만호 국민소통수석과 윤창렬 사회수석 인사를 발표하며 '사실상 1주택자'라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인사검증 단계에서 정만호 수석은 서울 도봉구와 강원 양구군 주택 중 양구를, 윤창렬 수석은 서울 서초구와 세종시 주택 중 세종 주택을 팔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공직사회의 문화가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공직자 인사에서 다주택자를 배제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 기조는 국세청장 지명에 이어 이번 달말 발표를 앞둔 차기 한국은행 부총재 인사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공직자 인사에서 다주택자를 배제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 기조는 국세청장 지명에 이어 이번 달말 발표를 앞둔 차기 한국은행 부총재 인사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 배경으로 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과잉 유동성을 지목하는 분위기가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어, 청와대가 인사검증에서 다주택 여부를 주요 체크포인트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