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러다임(paradigm)은 토머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1962)에서 처음 언급된 용어다.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규정하는 인식 체계인 패러다임이 바뀌면 생활이나 생각의 방식이 변한다. 때로는 과거의 것들이 부정되고, 새로운 것들이 뉴 노멀(새 표준)이 된다. 과학이나 기술, 철학 등은 패러다임을 바꾸는 핵심이다. 스마트폰은 세상을 바꿔놓은 기술의 결정체다. 스마트폰 이전과 이후의 세상은 확연히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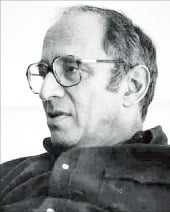 인류가 야만에서 문명으로 나온 길목 곳곳에는 ‘기술’이 숨어 있다. 활자, 증기기관, 자동차, 기차, 비행기, 전화기, 스마트폰 등은 모두 기술 진화의 산물이다. 인류의 삶은 기술 진화로 부유하고 풍성해졌다. 하지만 기술 진화의 변곡점에는 저항도 만만찮았다. 이른바 ‘붉은 깃발법(Red Flag Act)이 대표적 사례다.
인류가 야만에서 문명으로 나온 길목 곳곳에는 ‘기술’이 숨어 있다. 활자, 증기기관, 자동차, 기차, 비행기, 전화기, 스마트폰 등은 모두 기술 진화의 산물이다. 인류의 삶은 기술 진화로 부유하고 풍성해졌다. 하지만 기술 진화의 변곡점에는 저항도 만만찮았다. 이른바 ‘붉은 깃발법(Red Flag Act)이 대표적 사례다.산업혁명은 영국에서 태동했고, 촉매는 증기기관이다. 한데 산업혁명의 발상지인 영국에서는 왜 자동차산업이 꽃을 피우지 못했을까. 이 의문에 대한 힌트는 ‘붉은 깃발법(적기 조례)’이다. 증기자동차 이전 영국의 주요 교통수단은 마차였다. 증기자동차는 수많은 마부의 일자리를 빼앗아 갔고, 일자리를 잃은 마부들은 격렬한 시위에 나섰다. 결국 1865년 빅토리아 여왕은 ‘붉은 깃발법’을 선포한다. 한 사람이 붉은 깃발을 들고 증기기관차 55m 앞을 달리면서 차를 선도했고, 증기기관차의 최고 속도는 시속 6.4㎞(시가지에서는 3.2㎞)로 제한했다. 마부들의 저항에 자동차를 만들고 타야 할 유인(誘引)을 아예 없애버렸다. 혁신 산업인 자동차는 사양산업인 마차에 막혔고, 그사이 자동차는 독일과 프랑스를 질주했다. 결과적으로 자동차는 인류의 삶을 바꾸고, 자동차산업은 사라진 마부의 일자리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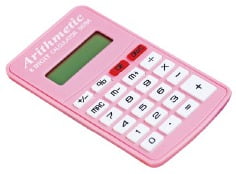 “인간이 기술 발달로 실업이라는 신종 질병에 걸리고 있다.”
“인간이 기술 발달로 실업이라는 신종 질병에 걸리고 있다.”1920년대 말 대공황으로 실업이 전염병처럼 지구촌을 떠돌자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가 실업을 옮기는 바이러스로 기계를 지목하면서 한 말이다. “앞으로 20년 안에 로봇이 미국 모든 일자리의 47%를 대체한다”는 메릴린치의 전망은 섬뜩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신기술은 일자리를 없애는 대신 새로운 일자리를, 때로는 사라진 일자리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스마트폰의 ‘스마트(smart)’라는 기술도 마찬가지다.
 1980년대 컴퓨터의 등장으로 타자수는 사라졌지만 그에 비할 수 없는 신규 일자리가 생겼으며 정보기술(IT), 디지털, 모바일, 인터넷, 바이오 혁명은 예전엔 상상조차 못한 일자리들을 만들어낸다. 스마트폰의 진화는 단순히 통신수단 발전을 넘어 게임산업 빅뱅의 토대가 됐으며 유통, 의료, 보험, 여행 등에서도 새로운 지도를 그리고 있다. 스마트폰 기술에 기반한 에어비앤비, 우버, 배달의민족 등은 ‘스마트 기술’이 기존의 일자리를 없애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 대표적 사례다.
1980년대 컴퓨터의 등장으로 타자수는 사라졌지만 그에 비할 수 없는 신규 일자리가 생겼으며 정보기술(IT), 디지털, 모바일, 인터넷, 바이오 혁명은 예전엔 상상조차 못한 일자리들을 만들어낸다. 스마트폰의 진화는 단순히 통신수단 발전을 넘어 게임산업 빅뱅의 토대가 됐으며 유통, 의료, 보험, 여행 등에서도 새로운 지도를 그리고 있다. 스마트폰 기술에 기반한 에어비앤비, 우버, 배달의민족 등은 ‘스마트 기술’이 기존의 일자리를 없애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 대표적 사례다.스마트폰도 양면이 있다. 스마트폰으로 삶은 편리해지고, 즐거움 또한 다양해졌다. 하지만 책에서는 그만큼 멀어졌다. 머리에 담은 지식보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지식을 즐겨 찾고, 묵직한 담론보다 얕은 얘기들이 대화의 주메뉴가 되어간다.
기술은 진화한다. 1800년대 초 일자리를 빼앗길까 두려워한 유럽의 노동자들이 기계에 모래를 뿌리며 저항했지만 결국 더 다양한 기계들이, 더 빠르게 돌아갔고 인류의 삶은 그만큼 풍성해졌다. 찰리 채플린은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라고 했다. 만물은 시각에 따라 달리 보이고, 다양한 형상을 조화롭게 맞춰가는 게 지혜다.
신동열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
② 스마트폰의 진화로 사라지는 일자리나 기업, 생겨나는 일자리나 기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③ 역사적으로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신적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