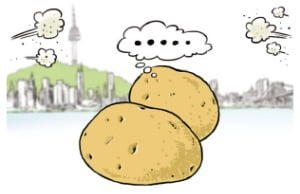 감자는 밀과 쌀, 옥수수에 이은 세계 4대 주요 작물이지만 오랫동안 환영받지 못했다. 1539년 남미 페루에서 감자를 처음 접한 스페인인들이 유럽으로 가져왔지만, 감자가 유럽인의 식탁에 오르기까진 우여곡절이 많았다.
감자는 밀과 쌀, 옥수수에 이은 세계 4대 주요 작물이지만 오랫동안 환영받지 못했다. 1539년 남미 페루에서 감자를 처음 접한 스페인인들이 유럽으로 가져왔지만, 감자가 유럽인의 식탁에 오르기까진 우여곡절이 많았다.스페인 군대는 ‘30년 전쟁’ 등 주요 전장에서 말 사료용으로 감자를 이용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원주민의 음식’으로 감자를 폄하했던 그들은 다른 식량이 모두 떨어졌을 때만 마지못해 감자를 입에 댔다. 농부들도 약탈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을 뿐 아니라 땅속에 있어 눈에 띄지 않는 감자를 ‘보험용’으로 약간 심었을 따름이었다.
무엇보다 익숙지 않았던 감자의 ‘외모’가 사람들의 접근을 주저하게 했다. 어두운 땅속에서 자라는 감자는 ‘악마의 사과’로 불렸다. 감자를 먹으면 나병에 걸린다는 소문도 빠르게 퍼졌다. 철학자 제러미 벤담은 감시시설 ‘파놉티콘’에서 죄수들에게 감자만 먹인 채 강제노동을 시킨다는 구상을 했다. 1835년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선 농부들이 감자 재배를 거부하면 요새 건설현장으로 보내졌다.
이처럼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채 ‘악마’ ‘처벌’ 등 부정적 이미지와 얽혔던 감자의 기구한 인연이 떠오르는 사건이 또다시 불거졌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이 지난달 강원 평창군과 협약을 맺고 대량 수매한 감자를 이용해 만든 ‘감자빵’을 출시 사흘 만에 판매 중단키로 한 것이다. 감자 재배 농민을 돕겠다는 선의에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파리바게뜨의 감자빵에는 골목상권을 침해한 ‘대기업의 횡포’, 중소업체의 레시피를 도용한 ‘표절’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춘천의 한 카페가 자신이 만들어 파는 감자빵과 비슷하다며 “대기업은 먼저 소상공인과 상생하라”고 나서면서 대기업을 성토하는 여론이 불붙은 탓이다. 대기업을 비난하는 이들에겐 2018년 초 파리바게뜨 중국법인에서 이미 똑같은 모양의 감자빵을 판 사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다.
이번 사건은 “대기업은 악(惡), 골목상권은 선(善)”이라는 ‘언더 도그마’로 인해 지역 농민을 돕겠다는 선의가 악덕으로 둔갑한 또 하나의 사례로 기억되게 됐다. 19세기 초 한반도에 들어와 구황작물로 큰 역할을 해온 감자는 서민의 삶에 ‘단비’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그런 서민적 이미지 탓에 반(反)기업 정서에 불을 붙이는 소재가 되기도 쉬운 듯하다. 감자처럼 실상과 얽힌 이미지가 오랜 기간 엇박자를 빚는 존재도 드물 것 같다.
김동욱 논설위원 kimdw@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