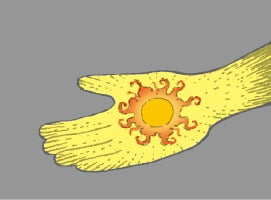 태양은 매 순간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한다. 1초에 내뿜는 에너지가 전 인류의 연간 소비량보다 7000배나 많다. 이 에너지는 핵융합 반응에 의해 4개의 수소 원자핵이 헬륨으로 바뀔 때 생성된다. 영화 ‘스파이더맨’이나 ‘아이언맨’ ‘설국열차’에 등장하는 상상 속의 핵융합 발전도 이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태양은 매 순간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한다. 1초에 내뿜는 에너지가 전 인류의 연간 소비량보다 7000배나 많다. 이 에너지는 핵융합 반응에 의해 4개의 수소 원자핵이 헬륨으로 바뀔 때 생성된다. 영화 ‘스파이더맨’이나 ‘아이언맨’ ‘설국열차’에 등장하는 상상 속의 핵융합 발전도 이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핵융합 과정의 열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를 ‘인공태양’이라고 한다. 여기에 사용하는 수소는 보통 수소보다 두 배가량 무거워 중(重)수소라고 부른다. 중수소는 바닷물 30L에 1g씩 들어 있다. 이것으로 석유 8t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온실가스와 방사능, 핵폐기물도 나오지 않는다.
문제는 핵융합 반응을 인공적으로 일으키는 게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태양보다 중력이 약한 지구에서는 1억 도 이상의 초고온 플라즈마(고체·액체·기체를 넘어선 제4의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뜨거운 플라즈마를 담을 용기도 필요하다.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표면에 닿지 않는 용기’다. 플라즈마에 자기장을 걸어 공중에 띄우고 그 안에서 계속 돌게 하는 장치를 토카막이라고 한다. 모양은 지름 10m의 대형 도넛과 닮았다.
핵융합이 안정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초고온 플라즈마가 오랫동안 유지돼야 한다. 미국·일본·유럽이 플라즈마 온도를 1억 도로 끌어올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유지시간이 7초 정도에 불과하다. 중국은 2018년 10초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후발주자인데도 2018년 1.5초, 지난해 8초에 이어 최근 20초의 세계 최장기록을 세웠다. 10여 년간 2만5860여 회의 실험으로 얻은 결과다.
이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K스타(KSTAR)’로 불리는 한국형 초전도핵융합장치의 운전시간을 2023년 50초, 2024년 100초, 2025년 300초로 늘린다는 목표다. 300초 운전이 가능하면 핵융합발전소를 365일 운영할 수 있다. KSTAR는 우리나라와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 일본 중국 인도 등 7개국이 공동으로 프랑스에 건립 중인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의 핵심 부품으로도 제공되고 있다.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되면 거의 모든 에너지원이 인공태양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바닷물에 있는 중수소만 1500년 이상 쓸 수 있는 분량이다. 나무에서 화석연료로 바뀐 인류의 에너지가 인공태양에 의해 새로운 혁명기를 맞고 있다. 그 역사를 새로 쓰는 한국 과학자들이 자랑스럽다.
고두현 논설위원 kdh@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