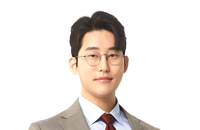하청업체 노조원이 원청사를 점거해 집단행동을 해도 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입장도 점점 굳어지는 모양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한국수자원공사 사건에서 처음 이같이 판결한 이후 지난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건에서 이를 재확인했다. 노동계는 환영하지만 노동법 교수 등 전문가 중에는 의문을 나타내는 이가 많다. 원청업체 사업주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와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하청업체 노조원이 원청사를 점거해 집단행동을 해도 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입장도 점점 굳어지는 모양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한국수자원공사 사건에서 처음 이같이 판결한 이후 지난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건에서 이를 재확인했다. 노동계는 환영하지만 노동법 교수 등 전문가 중에는 의문을 나타내는 이가 많다. 원청업체 사업주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와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구체적으로 9월 수자원공사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보자. 수자원공사와 계약을 맺은 청소용역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은 2012년 6월 소속 회사와 단체교섭을 벌이다 결렬되자 파업에 들어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인 이들은 원청업체인 수자원공사를 점거해 확성기 시위를 벌이고 심지어 공사 건물에 쓰레기까지 투척해 업무방해, 퇴거불응 등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다르지 않다. 인천공항과 계약을 맺은 경비용역업체 소속 특수경비원들은 2014년 9월 소속 업체와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이들 역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이다.
문제는 장소였다. 경비원들은 원청인 인천공항에 줄지어 서서 피켓 시위를 했다. 공항은 항공법에 따라 호객, 소란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는 시설이다. 불법 시위를 벌인 결과 이들도 업무방해,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수자원공사 사건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공사가)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장소를 제공하고, 근로의 결과를 향유했기 때문에 원청업체는 근로자들의 집단행동을 수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확대하라는 노동계 주장에 치우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본다. 노동계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원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줄곧 요구해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19일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내놓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개정안에는 ‘하청업체가 바뀔 때 하도급 근로자들의 고용이 승계되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같은 달 3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옥주 국회환경노동위원장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협약을 맺었다. 외주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이 승계되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대법원에 이어 정부, 국회까지 모두 공감하는 모양새다. 노동계 요구에 기우는 분위기가 확연해지는 가운데 “법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기업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jsc@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