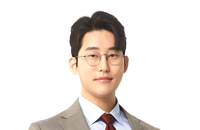대통령은 이민자를 혐오했다. 이민을 규제하는 법령에 서명했고 적대적인 국가 출신의 이민자는 강제 이주시키기까지 했다. 자신의 정책에 반기를 드는 언론은 탄압했다. 대통령 지지자와 반대파 사이에는 연일 내전을 방불케 하는 사태가 속출했다. 최근 미국 이야기가 아니다. 1798년 존 애덤스 미국 대통령이 ‘외국인 규제 및 선동금지법’에 서명할 당시 상황이다.
대통령은 이민자를 혐오했다. 이민을 규제하는 법령에 서명했고 적대적인 국가 출신의 이민자는 강제 이주시키기까지 했다. 자신의 정책에 반기를 드는 언론은 탄압했다. 대통령 지지자와 반대파 사이에는 연일 내전을 방불케 하는 사태가 속출했다. 최근 미국 이야기가 아니다. 1798년 존 애덤스 미국 대통령이 ‘외국인 규제 및 선동금지법’에 서명할 당시 상황이다.작년 말 미국 대선 이후 발생한 일련의 극한 대립과 폭력 난동 사태를 보고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수잔 메틀러 코넬대 교수와 로버트 리버먼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네 가지 위협: 미국 민주주의의 반복되는 위기》에서 미국이 겪어온 민주주의 파행의 역사를 분석하고 최근 위기의 본질을 새롭게 조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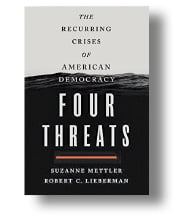 데모크라시는 단순히 ‘인민에 의한 지배’라는 뜻 이상으로, 그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네 가지 축이 있다. ①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절차 ②다양한 의견 간 공정한 경쟁 ③법의 지배 ④구성원 사이에 시민권의 차별 없는 포괄성이다. 노예해방 갈등으로부터 남북전쟁 발발에 이르는 시기, 19세기 말 도금시대, 20세기 세계 대공황 직후,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모두 미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파행기였다. 위기 때마다 이 네 개 축 가운데 어느 곳인가는 처참히 붕괴됐다. 다음 네 가지 위협이 그 원인이었다.
데모크라시는 단순히 ‘인민에 의한 지배’라는 뜻 이상으로, 그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네 가지 축이 있다. ①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절차 ②다양한 의견 간 공정한 경쟁 ③법의 지배 ④구성원 사이에 시민권의 차별 없는 포괄성이다. 노예해방 갈등으로부터 남북전쟁 발발에 이르는 시기, 19세기 말 도금시대, 20세기 세계 대공황 직후,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모두 미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파행기였다. 위기 때마다 이 네 개 축 가운데 어느 곳인가는 처참히 붕괴됐다. 다음 네 가지 위협이 그 원인이었다.첫째, 정치 양극화다. 정상적 민주주의 아래에선 진영이 달라도 상대를 존중할 줄 안다. 하지만 양극화 시기에는 서로 죽여야 할 적이 된다. 1980년대 일부 의원이 공격적 투쟁 노선으로 기운 이후 미국 정치는 당파싸움처럼 변질되기 시작했다.
둘째, 시민권이 평등하게 인정되지 않는다. 미국은 건국 당시 노예제를 인정하고 흑인의 인권과 여성 참정권을 부정한 상태로 출발했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이 약점 때문에 미국 사회는 훗날 숱한 갈등에 노출됐고 민주주의는 위협받았다.
셋째, 경제적 불평등이다. 부자를 혐오하는 빈자의 반란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다. 부자들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책에 맞서 자신의 이익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로비에 전념했다. 금권 엘리트와 결탁한 정치인과 정부 기구가 민주주의를 퇴행시켰다. 넷째, 행정부의 권한 비대화다. 원래 미국 정부는 건국 이후 의회 중심으로 작동했다. 행정부는 뒷전이었고 대통령의 권력은 제한돼 있었다. 그러다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행정부의 위상이 급상승했고, 대통령 성향에 따라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막기 어려운 사태가 일어나곤 했다.
저자에 따르면, 역사상 위기 때마다 이 네 가지 위협 중 기껏 두 가지 정도만이 작용했을 뿐이다. 그러나 지금의 위기는 이 네 가지 위협이 동시에 터져 나온다는 점에서 전례가 없다. 대통령과 그 열혈 지지자들이 나서서 이토록 사회 내 어떤 집단을 콕 찍어 만인의 적으로 몰아세운 적은 없었다. 대통령은 갈등을 봉합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겼다. 편법으로 우회하든, 비밀리에 협박하든 행정부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입법부와 사법부를 이토록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오랜 세월을 거쳐 정착된, 당연히 지켜야 할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즉흥으로 모든 정책을 밀어붙이려 한 적도 없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독재자들도 대개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걸고 통치한다. 게다가 ‘국민의 뜻’을 내세우고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라고 외친다. 그러나 그들이 범하는 온갖 법치 무력화와 집단 간 갈등 선동이 사실은 민주주의를 파멸시키는 주범임을 대다수 유권자, 특히 열혈 지지자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오히려 순혈 민주주의라고 착각한다. 미국은 지금 그런 상황의 벼랑 끝까지 몰려 있는 것이다. 1830년대 알렉시 드 토크빌은 미국 민주주의가 훗날 자칫 ‘민주적 전제정치(democratic despotism)’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민주주의 도입 역사가 지극히 짧은 우리나라는 어떤가? 성숙하기도 전에 자기 파괴 끝에 몰락할 것인가, 본연의 기능에 도달할 것인가? 결국 키를 쥔 정치인들의 자각과 선택에 달려 있다.
송경모 <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