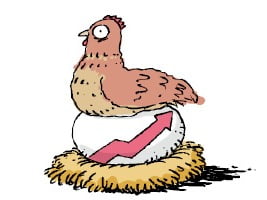 식료품 등 생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오랫동안 위정자들이 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한국어와 중국어, 타갈로그어 등에서 “밥 먹었니”란 표현이 인사말로 쓰일 정도로 먹는 게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식료품 등 생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오랫동안 위정자들이 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한국어와 중국어, 타갈로그어 등에서 “밥 먹었니”란 표현이 인사말로 쓰일 정도로 먹는 게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이다.요즘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2008년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50개 생필품 물가를 집중 관리하라”고 지시했을 정도다.
생필품 가격이 치솟는 것만큼 어지러운 사회상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없다. 1920년대 런던데일리메일의 베를린 특파원은 독일의 초인플레이션의 참상을 “하루 새 샌드위치 가격이 1만4000마르크에서 2만4000마르크로 뛰었다”고 압축해 전했다. 러시아에선 17세기 초 ‘대기근’시대를 ‘빵값이 100배 뛴 시기’라는 한마디로 요약한다.
생필품 물가 관리는 예나 지금이나 쉬운 일이 아니다. 《한서(漢書)》엔 “곡물가는 보통 한 말에 40~50전가량이지만 풍년에는 4~5전까지 떨어지고, 흉년에는 1000전을 넘는다”고 전했다. 조선 시대엔 경시서(京市署)에서 나물류와 어육(魚肉) 등의 시가 통제에 나섰지만 가격은 ‘조석으로’ 변했다. 현대에도 농사의 작황 등 변동 요인이 많아 생필품 가격 관리는 ‘최고난도 기술’(경제학자 발레리 키옙스키)에 비유될 정도다.
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식료품들은 특별관리를 받아왔다. 한국에선 달걀과 짜장면 가격이 오랫동안 서민물가를 가늠하는 지표로 사용됐다. 달걀은 1950년대까지 한 꾸러미 값이 소고기 한 근 값과 같았지만 1960년대 이후엔 싼값에 단백질을 공급하는 대상으로 위상이 바뀌었다. 서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196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 통계품목에 포함돼 특별관리를 받았다. 1965년부터 2019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가 1998.1% 오를 동안 달걀값 지수는 절반 수준(1118.2%) 상승에 그치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다 조류인플루엔자(AI), 국제 식량 가격상승 등 악재가 겹치면서 설연휴를 앞두고 ‘밥상 물가’가 들썩인다는 소식이다. 닭고기 가격이 20% 이상 올랐고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등의 가격도 껑충 뛰었다. 무엇보다 잘 안 오른다던 달걀 가격마저 전월 대비 40~50% 급등하는 등 상승세가 심상찮다.
먹는 것이 불안하면 사회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경제회복을 바란다면 ‘밥상 물가’를 지키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김동욱 논설위원 kimdw@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