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자는 사랑이 전부라는 말, 지긋지긋해요.”
조(시얼샤 로넌 분)는 남북 전쟁이 한창이던 1860년대, 미국의 한 시골 마을의 평범한 집에서 나고 자란 천방지축 소녀다. 아버지는 전쟁터로 떠나 없지만, 네 자매가 사는 조의 집은 늘 시끌벅적하다. 멋을 낼 줄도, 이성과 어울릴 줄도 모르며 ‘선머슴’처럼 살던 그는 언니 메그(엠마 왓슨 분)에게 등 떠밀려 간 사교파티장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의 부잣집 청년 로리(티모시 샬라메 분)와 급격히 가까워진다.
지난해 개봉한 영화 ‘작은아씨들’은 1968년 출판된 고전 소설(원작명 Little woman)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다. 네 자매의 성장 스토리를 그린 이 소설은 1933년부터 아홉 번이나 영화로 리메이크돼 개봉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재개봉된 영화 역시 19세기 여성의 삶과 당시의 경제적 배경을 생생하게 그려냈다는 평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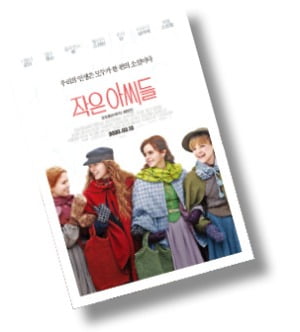 네 자매는 예술적 재능이 남다르다. 메그는 배우를 꿈꾸고, 조는 작가 지망생이다. 셋째 베스(엘리자 스캔런 분)와 막내 에이미(플로렌스 퓨 분)는 각각 음악가와 화가를 꿈꾼다. 하지만 이들을 돕는 대고모(메릴 스트립 분)는 부잣집 남자를 만나 결혼할 것을 종용한다. “창녀나 배우가 아니면 여자는 돈을 벌 길이 없다”면서.
네 자매는 예술적 재능이 남다르다. 메그는 배우를 꿈꾸고, 조는 작가 지망생이다. 셋째 베스(엘리자 스캔런 분)와 막내 에이미(플로렌스 퓨 분)는 각각 음악가와 화가를 꿈꾼다. 하지만 이들을 돕는 대고모(메릴 스트립 분)는 부잣집 남자를 만나 결혼할 것을 종용한다. “창녀나 배우가 아니면 여자는 돈을 벌 길이 없다”면서.실제 영화의 배경인 19세기까지 대부분 나라에서 여성은 교육과 직업의 기회를 거의 갖지 못했다. 여성은 재산권을 얻지 못했고, 기혼 여성은 ‘남편의 소유’로 인정됐다. 극 중 로리에게 따지는 에이미의 대사에 이런 모습은 고스란히 녹아 있다. “돈도 없지만, 만약 있더라도 결혼하는 순간 남편 소유가 돼. 그리고 아이를 낳아도 남편 소유야. 남편의 재산이지. 그러니까 결혼이 경제적인 거래가 아니라곤 하지 마.”
이런 탓에 여성이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성공한 배우나 예술가가 되는 길 외에는 거의 없었다. 그마저 성공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다. 조가 남성인 친구의 이름으로 책을 내 돈을 버는 것도 그런 이유였다.
반대로 로리와 그의 할아버지 로렌스는 특별한 일을 하지 않지만 대저택에서 호화롭게 산다. 미국의 사회학자 베블런은 1899년 《유한계급론》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소유한 재산으로 소비만 하는 계층’을 ‘유한계급’으로 정의했다. 노동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명예를 주로 추구하는 계층을 일컫는 말이다. 베블런은 인간이 ‘소유권’을 갖게 되면서 유한계급이 나타났다고 봤다. 특히 남성이 여성을 ‘소유’하기 시작하면서 유한계급은 남성의 영역이 됐다
는 설명이다.
네 자매는 로리와 연극 소모임을 하면서 가족처럼 가까워진다. 이들은 자주 로리의 집으로 향한다. 거대한 서재와 대형 피아노가 있는 집은 자매에게는 꿈 같은 공간이었다. 첫째 메그는 그곳에서 만난 로리의 과외 교사와 사랑에 빠진다. 로리는 조를 짝사랑하지만, 마음을 숨긴 채 친구처럼 지낸다.
이들은 왜 빈손이던 예술가 지망생 자매를 지원했을까. 물론 선의에서 나온 행동이겠지만 ‘유한계급론’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다. 베블런은 유한계급이 ‘과시 소비’를 통해 부를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고 봤다. 대표적 대상이 예술이었다. 중세 이후 예술가들은 대부분 유한계급의 후원을 받아 성장했고, 이 때문에 당시 미술과 음악 건축 분야가 급격히 발전했다는 해석이 많다. 귀족들이 가난한 화가를 후원하고 대신 자신을 그려달라고 부탁한 초상화가 작품으로 남은 사례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오늘날에는 유한계급 대신 정부나 기업이 주로 예술을 후원한다. 경제학적으로는 예술에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표1>을 보면 공공재는 비경합성(사용 시 경합이 생기지 않는 특성)과 비배제성(사용 시 누군가를 배제할 수 없는 특성)을 갖는다. 수익을 내기 어렵지만 모두에게 필요한 재화인 경우 대부분 정부 예산이나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운영된다. 개인의 정서와 도시 분위기 등에 미치는 긍정적 역할을 고려할 때 공공재로 볼 수 있다는 게 경제적 시각이다.
오늘날에는 유한계급 대신 정부나 기업이 주로 예술을 후원한다. 경제학적으로는 예술에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표1>을 보면 공공재는 비경합성(사용 시 경합이 생기지 않는 특성)과 비배제성(사용 시 누군가를 배제할 수 없는 특성)을 갖는다. 수익을 내기 어렵지만 모두에게 필요한 재화인 경우 대부분 정부 예산이나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운영된다. 개인의 정서와 도시 분위기 등에 미치는 긍정적 역할을 고려할 때 공공재로 볼 수 있다는 게 경제적 시각이다.따뜻한 후원에도 네 자매가 모두 꿈을 이루지는 못한다. 메그는 배우를 포기하고, 가난하지만 마음이 따뜻한 로리의 과외교사와의 결혼을 택한다. 에이미는 야심 차게 오른 유학길에서 ‘천재’들을 만나며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다. 그는 부잣집 청년의 청혼을 받아주기 직전, 우연히 로리와 다시 조우하며 진짜 사랑이 누군지 깨닫는다. 조에게 거절당한 뒤 한참을 방황하던 로리도 에이미에게 마음을 정착한다. 둘은 부부가 되기로 한다.
자신의 힘으로 꿈에 가까워진 건 조가 유일했다. 그는 로리의 고백을 거부하고, 가족의 품도 떠나 미국 뉴욕에서 작가로 데뷔한다. 그곳에서 눈길이 가는 유학생 프리드리히도 만난다.
조도 제 짝을 찾는다. 프리드리히가 조를 만나러 왔다가 돌아간 날, 평소와는 다른 조의 태도에 가족들은 외친다. “그게 바로 사랑이야. 놓치지마!” 조는 프리드리히가 떠나는 기차역까지 한걸음에 달려가 먼저 고백한다.
웃음과 울음이 뒤섞인 네 자매의 인생 이야기가 곧 조의 소설의 줄거리가 된다. 진심이 담긴 역작이지만, 출판사를 통하지 않고는 이를 대중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초기의 막대한 고정비용을 개인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출판을 비롯한 음악, 영화, 방송 등 대부분의 예술은 기업을 통해 전파된다. 대신 개인은 무형의 재산권인 저작권을 갖고, 기업은 개인에게 이에 대한 비용을 준다. 이 구조는 플랫폼만 다양화됐을 뿐 오늘날에도 유지되고 있다. 조 역시 이런 과정을 거친다. 출판사는 원고를 회사 소유로 바꾸고 싶어 하지만, 영리한 조는 저작권을 지켜낸다. 인세 조건도 유리하게 받아낸다. 무형의 재산권인 지식재산권을 인식한 것이다. 단 조건이 걸렸다. “주인공(조)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해피 엔딩’이 아니니, 결혼하는 것으로 결말을 바꾸라”는 것. ‘비용’을 투자하는 출판사로서는 당시 기준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해 수익을 높이려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원작 소설 《작은아씨들》에서는 조도 다른 자매들처럼 결혼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영화 마지막 장면의 조도 마찬가지다. 결혼을 하고, 남편인 프리드리히와 짝을 지어 다른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 평화롭게 식사를 한다. 그러나 감독은 이를 조의 소설 속 엔딩처럼 처리한다. 실제 조의 선택을 ‘열린 결말’로 남겨 둔 셈이다. 만약 조가 현재를 살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유한계급도, 미디어의 독점도 흐릿해진 세상 속에서 낸 소설의 결말은 영화 속 그의 대사와 같지 않았을까. “나는 차라리 자유로운 독신이 되어서, 스스로 노를 저어 나가겠어요.”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2020년 2월 15일부터 매주 토요일자에 연재해 온 시네마노믹스가 이번주로 끝을 맺습니다. 그동안 성원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