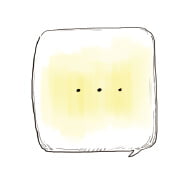 새를 열자 아침이 시작되었다
새를 열자 아침이 시작되었다지저귀던 햇살들이 마당에
모여 들었다
서둘러 부화를 말하는 입속에
부리가 노란 봄이 가득해졌다
여러 개의 혀가 파닥거렸다
누설된 색깔들이 사라지고
없는 말들이 자욱해졌다
그가 보이지 않았다
금기어는 심장을 찔러도 피가 나지 않았다
-시집 《중세를 적다》(민음사) 中
새들도 봄이 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화의 기미가 가득한 부리로 지저귀는 걸 보면 말입니다. 새를 열면 아침이 시작된다는 시인의 전언을 따라 햇살 가득한 마당을 그려봅니다. 햇살이 지저귄다고 믿고 싶을 만큼 마당에는 따뜻한 새들이 모여 들었겠지요. 봄눈이 내렸지만, 하루 만에 금세 녹아내렸습니다. 봄이 오는 방향에서 없는 것들이 곧 나타나겠지요. 그때 내가 몰랐던 ‘없던 말’들이 내 입속의 혀를 굴릴 것입니다. 곧 봄빛이 몸을 열고 쳐들어올 테니까요.
이소연 시인(2014 한경신춘문예 당선자)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