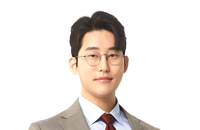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크게 강화된다. 소득에 비례해 대출 한도가 정해진다는 게 골자다. DSR은 개인 연소득을 매년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DSR이 0%에 가까우면 빚이 거의 없다는 얘기고, 100%에 가깝다면 번 돈 대부분을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쓴다는 의미다. DSR 40% 규제가 점진적으로 도입되면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추가 대출 여력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내 대출 한도가 얼마인지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향후 내집마련이나 재테크 과정에서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연소득 5500만원에 연 3% 금리로 8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보유한 A씨의 예를 들어보자. A씨는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내 7억원짜리 집을 구매하기 위해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 3억원(연 3%·30년 만기·원리금균등상환)을 빌렸다. 참고로 조정대상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는 50%여서 대출 한도는 3억5000만원이다. 지금까지 신용대출은 DSR을 계산할 때 10년간 분할해 원리금을 갚는 것으로 간주해 왔다. A씨는 신용대출만으로 한 해에 927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한다고 계산된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1517만원을 더하면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2444만원이다. A씨의 DSR은 44.43%(2427만원÷5500만원)인 셈이다
만약 내년 7월 이후라면 한도는 더 쪼그라든다. 신용대출 기준이 7년에서 5년으로 또다시 축소되기 때문이다. 대출 여력은 9389만원에 불과하지만, 다행히 총 대출 한도 2억원에 대해선 DSR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억2000만원까지는 대출받을 수 있다. 만약 동일한 대출을 내후년 7월 이후 신청한다면 DSR 한도가 적용돼 대출 여력이 다시 9389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국세청이나 사회보험료 납부로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도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추정 소득’을 도입하기로 했다. A씨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는 은퇴자나 일용근로자(매월 적금을 납부 중인 학생 포함)라면 대출 여력을 늘릴 수 있다.
매년 1500만원씩 신용카드를 쓰면서 대출이 없는 전업주부 B씨를 가정해보자. B씨의 추정소득은 1년간 개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1500만원)에서 신용카드 사용률(45.5%)을 나눈 후 90%를 곱해 ‘3000만원’이 된다. DSR 40%까지 신용대출을 받는다면 연 소득이 3000만원이기 때문에 연간 원리금상환액은 1200만원 이내여야 한다. 이 방식이 당장 7월부터 도입된다면 최대 7568만원(신용대출 7년 상환, 연 3% 금리)을 빌릴 수 있다.
김대훈/박진우 기자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