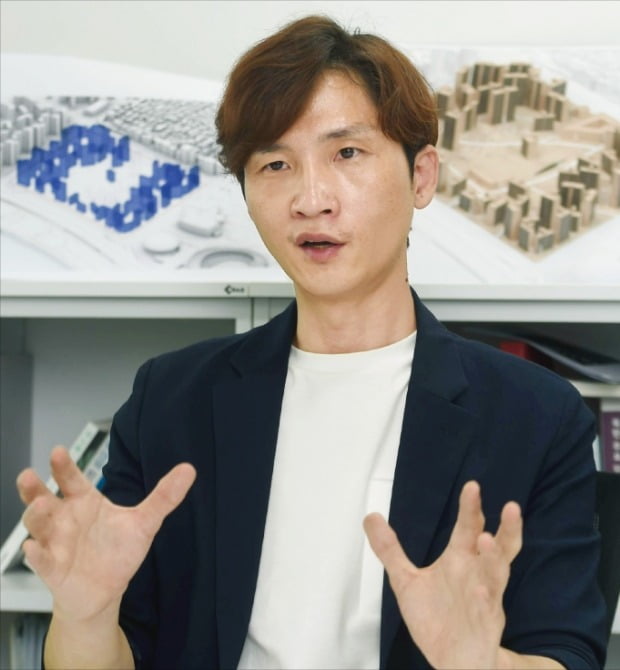
“경기 나쁘면 돈 못 벌고, 좋은 땅 사면 돈 벌고. 건설업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이죠. 건설업 핵심은 기획 단계부터 나사가 몇 개 들어갈지 예측하는 ‘디테일’입니다.”
DL이앤씨(옛 대림산업)의 ‘인공지능(AI) 혁명’을 이끄는 김정헌 주택사업본부 전문임원(상무)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제조업이 건설업”이라고 말했다. 제조기업은 과거 판매 이력을 기반으로 상품을 설계하고, 시장을 조사해 이윤을 남긴다. 같은 맥락에서 조 단위 사업비가 움직이는 건설업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간이 쉽게 엿볼 수 없는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 그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AI를 ‘스마트폰 개발 같은 혁신’으로 표현한 이유다.
아파트 동 배치 기술은 앞으로 ‘스케일’이 달라진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다. AI가 용적률, 일조량, 가구 수 등을 고려해 가장 우수한 설계를 스스로 짚어내는 기능까지 갖추는 시점이다. 최근 완성된 프로토타입은 ‘제네틱 알고리즘(유전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기능을 강화했다. 세대 단위로 가상 실험을 반복해 ‘우수 결과값’만 남기는 AI 분야 학습 방법을 쓴 것이다. 이 기술은 지난해 11월부터 미국 카네기멜론대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AI는 하자 보수 영역에서도 활약한다. 작업자 또는 현장 관리자가 벽지를 촬영하면 AI가 조그만 벽지 하자도 찾아내는 것이다. 누수 및 결로로 오염된 벽지도 파악할 수 있다. 6만 건의 벽지 데이터를 학습시켜 이뤄낸 결과다. 이미지를 잘게 쪼개는 학습 기법이 정확도를 더했다. 이 기술 역시 올 6월 특허 출원됐다. 장기적으로는 ‘땅을 주면 나사 하나까지도 AI가 설계한 뒤 각종 하자까지 자동으로 찾는 것’이 DL이앤씨의 목표다.
그럼에도 난관은 상당했다. 건설 데이터를 AI에 학습시키는 것부터가 장벽이었다. 김 상무는 “광학문자판독(OCR) 기반 AI 송장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 적이 있는데, 꼬박 1년간 외주를 줘도 정확도가 90% 이상 오르지 않았다”며 “파트너를 구하러 다녔던 벽지 하자 기술은 빅테크 대기업, AI 전문 기업 모두 손사래를 쳤다”고 했다. “같은 곳에서 찍은 현장들도 햇빛 때문에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건설업”이라며 “데이터 성질을 이해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고 당시를 돌아봤다.
BIM팀 직원들이 ‘AI 전사’로 거듭난 것은 이때부터다. AI 개발을 돕는 프로그램인 구글 ‘오토ML’이 무기가 됐다. 그는 “건설 AI 데이터는 결국 현장을 아는 사람만이 관리할 수 있었다”며 “향후 AI 분야 협업도 중장비, 자동차 등 고유한 사업 영역이 있는 기업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건설 AI를 ‘스마트폰’에 비유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 상무는 “AI는 그 자체로도 혁신”이라며 “다만 건설산업이 스스로 AI를 적용할 기반 생태계를 닦아내지 못하면 생산성은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정헌 상무는
△1972년생
△서울대 건축학과 학사, 경희대 건축학과 석사
△대림산업 건축기획팀
△대림산업 건축CM팀 파트장
△대림산업 BIM팀장
글=이시은 기자/사진=신경훈 기자 se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