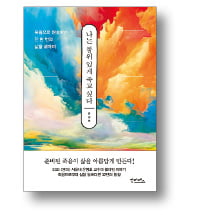 《나는 품위 있게 죽고 싶다》(윤영호 지음, 안타레스)는 ‘죽음을 준비시키는 의사’인 윤영호 서울대 교수의 책이다. 그는 국민 모두가 품위 있게 죽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5년 78.2세였던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19년 83.3세로 늘었다. 조만간 90세로 늘어날 기세다. 하지만 건강수명은 2005년 68.6세에서 2018년 64.4세로 도리어 줄었다. 죽는 나이가 늦춰졌지만 병을 앓다가 죽는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불행하게 노후를 보내야 한다면 장수가 축복일 수 없다.
《나는 품위 있게 죽고 싶다》(윤영호 지음, 안타레스)는 ‘죽음을 준비시키는 의사’인 윤영호 서울대 교수의 책이다. 그는 국민 모두가 품위 있게 죽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5년 78.2세였던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19년 83.3세로 늘었다. 조만간 90세로 늘어날 기세다. 하지만 건강수명은 2005년 68.6세에서 2018년 64.4세로 도리어 줄었다. 죽는 나이가 늦춰졌지만 병을 앓다가 죽는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불행하게 노후를 보내야 한다면 장수가 축복일 수 없다.아무리 돈이 많거나, 유명인으로 살았거나, 권력으로 세상을 잡았어도 소용없다. 죽을 때가 돼서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해 영양 튜브와 주사로 연명하다 인공호흡기에 매달린 채 비참하게 죽는다. 가족과 별다른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다. 저자는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완성’이라고 강조한다. 단 한 번 죽는 것을 잘 죽어야 삶을 제대로 완성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그런 준비를 못 하고 있다. 간병 살인과 동반 자살이 빈번히 일어나는 이유다. 넓은 의미에서 웰다잉(좋은 죽음)을 제공하는 국가적·법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죽은 자가 말할 때》(클라아스 부쉬만 지음, 웨일북)는 독일에서 15년 동안 법의학자로 활동한 저자가 담당했던 사건 중 가장 인상적이고 비극적이었던 12가지 이야기를 소개한다. 사람들은 막연히 노년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둘러싸여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리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전체 사망자 중에서 질병 이외의 외부 요인에 의해 사망하는 경우가 8.7%를 차지한다. 대략 10명 중 1명은 미처 준비할 시간도 없이, 갑작스레 죽음을 맞이한다는 뜻이다.
《죽은 자가 말할 때》(클라아스 부쉬만 지음, 웨일북)는 독일에서 15년 동안 법의학자로 활동한 저자가 담당했던 사건 중 가장 인상적이고 비극적이었던 12가지 이야기를 소개한다. 사람들은 막연히 노년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둘러싸여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리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전체 사망자 중에서 질병 이외의 외부 요인에 의해 사망하는 경우가 8.7%를 차지한다. 대략 10명 중 1명은 미처 준비할 시간도 없이, 갑작스레 죽음을 맞이한다는 뜻이다.이들이 전하지 못하고 떠난 이야기들은 어디로 갈까. 밝혀지지 않은 진실은 끝내 묻히고 마는 걸까. 이를 드러내는 게 법의학자들의 역할이다. 불의의 사고, 잔혹한 범죄 사건, 의문스러운 죽음 등 이 책에 실린 다양한 죽음의 이야기는 새로운 관점에서 죽음을 생각하게 만든다. 죽음이 이렇게나 삶 가까이에 있음을 새삼 깨닫는다. 책은 실제 법의학 사례를 소개하면서 추상적으로 다가왔던 죽음의 실체를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디지털 장의사, 잊(히)고 싶은 기억을 지웁니다》(김호진 지음, 위즈덤하우스)는 국내 1호 디지털 장의사의 책이다. 살아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이들은 디지털 세상에선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 한다. 디지털 세계에서의 죽음을 통해 현실 세계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장의사, 잊(히)고 싶은 기억을 지웁니다》(김호진 지음, 위즈덤하우스)는 국내 1호 디지털 장의사의 책이다. 살아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이들은 디지털 세상에선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 한다. 디지털 세계에서의 죽음을 통해 현실 세계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디지털 세상은 망각을 허용하지 않는다. 글과 사진, 영상 등은 여기저기 복제돼 디지털 세상에 박제된다. 그리고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랜덤 채팅 앱에 접속했다가 속옷 사진으로 약점이 잡히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된 영상이 떠돌기도 한다. 소셜미디어에 올린 얼굴 사진을 합성해 악용하기도 하고, 거짓으로 각종 누명을 씌우기도 한다.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인터넷은 진화의 흐름을 거슬러 기억이라는 저주를 걸었다. 이제 인간 본연의 능력인 망각을 디지털 세상에 전해줄 때다. 우리는 다시, 잊혀야만 한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