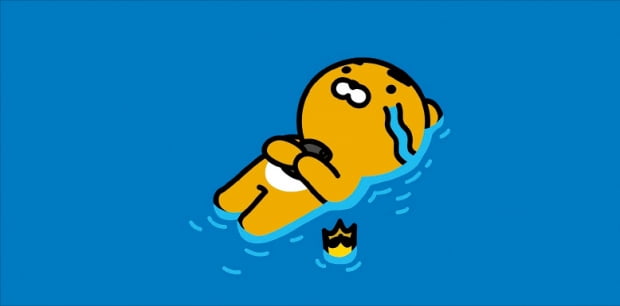 “카카오에선 지금까지도 이수만 선생님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죠. CJ ENM보다 훨씬 높은 인수 가격을 제시했는데도 거절한 것이니까요.”
“카카오에선 지금까지도 이수만 선생님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죠. CJ ENM보다 훨씬 높은 인수 가격을 제시했는데도 거절한 것이니까요.”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추진하던 지난해 말 SM엔터 최대주주인 이수만 총괄프로듀서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우리와 거래하면 시가보다 30% 싼 가격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넘기겠다”는 내용이다. 그렇게 낮은 가격으로 특정인에게 넘기는 건 불법이 아니냐는 반문에 거래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답을 내놨다. “현재 가격에 사면 됩니다. 다른 사모펀드(PEF)가 곧바로 20% 가까이 높은 가격에 카카오엔터에 투자하기로 했거든요. 이 프로듀서의 주식은 앉은 자리에서 30% 이상 뛰는 셈이죠.”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추진하던 지난해 말 SM엔터 최대주주인 이수만 총괄프로듀서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우리와 거래하면 시가보다 30% 싼 가격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넘기겠다”는 내용이다. 그렇게 낮은 가격으로 특정인에게 넘기는 건 불법이 아니냐는 반문에 거래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답을 내놨다. “현재 가격에 사면 됩니다. 다른 사모펀드(PEF)가 곧바로 20% 가까이 높은 가격에 카카오엔터에 투자하기로 했거든요. 이 프로듀서의 주식은 앉은 자리에서 30% 이상 뛰는 셈이죠.”2016년 카카오가 멜론을 운영하는 로엔엔터테인먼트를 1조9000억원에 깜짝 인수했을 때만 해도 자본시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보유 현금·부채 비율 등 기존 시각으론 무리한 M&A가 분명했기 때문이다. 카카오가 이런 시각을 뒤엎고 한때 시가총액 120조원의 왕국을 조성하는 덴 이로부터 채 5년이 걸리지 않았다.
특히 최근 2~3년 사이 카카오의 가장 큰 혁신은 이 같은 ‘파이낸싱’에 있었다. 주요 핵심 사업을 분사한 뒤 곧장 투자 유치에 성공해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의 몸값을 인정받았다. 카카오페이·카카오뱅크 등 계열사들이 증시에 안착하면서 현금과 영향력이 쌓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분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유망 기업과 손을 잡았다. 절차는 간결했고 회사 경영권을 인수해 키우느라 노조와 씨름할 필요도, 실적을 두고 머리를 싸맬 필요도 없었다. 영토 확장은 끝이 없어 보였다.
이 같은 전략은 사실 카카오가 원조는 아니다. 여러 회사를 M&A해 ‘벤처 연합군’을 세우고, 이를 상장하겠다며 출범한 옐로모바일이 대표적이다. 2015년 국내에서 두 번째로 유니콘 기업 반열에 오르며 각광받았다. 나스닥과 코스닥시장을 두고 저울질 중이라는 보도가 쏟아졌지만 지금은 각종 구설로 존재감이 약해졌다.
물론 카카오와 옐로모바일을 같은 잣대로 비교하는 건 무리다. 카카오는 월간 5000만 명의 이용자가 사용하는 카카오톡이란 ‘구심점’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임직원의 주식 매각이 계열사들의 상장 제동으로 이어지는 등 뜻하지 않은 위기에 처한 카카오엔 한 번쯤 곱씹어 볼 사례다. M&A와 금융기법으로 쌓은 ‘제국’이 구심점을 잃으면 무너지는 것도 전례없이 빠르다는 반면교사가 됐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그룹 컨트롤타워인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를 세워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여전히 실무진에선 “미리 굵직한 상장은 끝낸 게 천만다행”이란 분위기도 감지된다. PEF 관계자의 뼈 있는 이야기가 맴돈다. “그래서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는 언제 상장하나요?”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