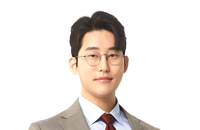《하룻밤에 읽는 동양 철학·서양 철학》(양승권 지음, 페이퍼로드)은 두 권의 책이다. 공자부터 정약용까지의 동양 철학과 탈레스부터 질 들뢰즈까지의 서양 철학을 샅샅이 훑는다. ‘하룻밤에 읽는’이란 제목처럼 쉬운 말로 핵심만을 전달하는 게 이 책의 매력이다.
《하룻밤에 읽는 동양 철학·서양 철학》(양승권 지음, 페이퍼로드)은 두 권의 책이다. 공자부터 정약용까지의 동양 철학과 탈레스부터 질 들뢰즈까지의 서양 철학을 샅샅이 훑는다. ‘하룻밤에 읽는’이란 제목처럼 쉬운 말로 핵심만을 전달하는 게 이 책의 매력이다.공자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바랐다.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도덕도 지켜지지 않는 세상이었기 때문이다. 맹자는 더 나아가 도덕적 품격이 넘치는 국가가 되려면 군주가 먼저 모범이 돼야 한다고 했다. 노자와 장자의 철학은 ‘동양의 실존주의’였다. 저자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행한 서구의 실존주의와 맞닿는 지점이 많다”고 설명한다.
서양 철학은 플라톤에서 시작됐다. 국가론, 영혼론, 이데아, 우주관, 윤리학 등 서양 철학의 중심 화두가 모두 그로부터 나왔다. 어렵기로 소문난 칸트의 철학도 쉬운 말로 풀어낸다. 칸트는 합리론과 경험론의 대립 구도에서 양자를 융합하려 했다. ‘감성’을 통해 외부의 대상을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오성’으로 개념화해 인식을 완성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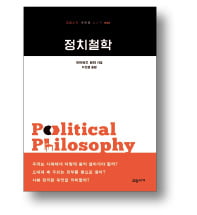 《정치철학》(데이비드 밀러 지음, 교유서가)은 영국 옥스퍼드대 정치학과 교수가 정치철학을 접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썼다. 마을 단위로 모여 살던 사람들이 거대한 국가의 통치를 받게 됐다. 토머스 홉스가 《리바이어던》에서 주장한 것처럼 국가의 개입과 간섭이 어쩔 수 없다면, 이를 어느 수준까지 용인해야 하는지가 정치철학의 중요한 쟁점이다.
《정치철학》(데이비드 밀러 지음, 교유서가)은 영국 옥스퍼드대 정치학과 교수가 정치철학을 접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썼다. 마을 단위로 모여 살던 사람들이 거대한 국가의 통치를 받게 됐다. 토머스 홉스가 《리바이어던》에서 주장한 것처럼 국가의 개입과 간섭이 어쩔 수 없다면, 이를 어느 수준까지 용인해야 하는지가 정치철학의 중요한 쟁점이다.역사적으로 현명한 군주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인간 사회는 절대군주에 의탁하는 것에서 벗어나 민주주의를 도입하게 됐다. 하지만 민주주의 역시 시민에게 제한된 선택권만 준다. 민주주의에서도 미래를 결정하는 진정한 힘은 정부 각료나 관료, 의회나 다른 입법기관 구성원 등 극소수 사람들의 수중에 있다. 책은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며 정치철학의 이슈를 탐구한다.
 《어쩌다 마주친 철학》(황진규 지음, 지경사)은 역사 속 철학자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고민에 답을 건네는 식으로 구성했다. 예컨대 ‘왜 무기력해질까요?’라는 고민에 책은 플라톤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모든 사물의 의미는 세상 너머에 있는 형상(이데아)에 의해 이미 결정돼 있다는 세계관이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노력하든 이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 처방은 들뢰즈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라는 것이다. 정해져 있는 삶의 의미 같은 것은 없고, 우연한 마주침에 의해 삶의 의미가 구성된다고 보는 세계관이다.
《어쩌다 마주친 철학》(황진규 지음, 지경사)은 역사 속 철학자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고민에 답을 건네는 식으로 구성했다. 예컨대 ‘왜 무기력해질까요?’라는 고민에 책은 플라톤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모든 사물의 의미는 세상 너머에 있는 형상(이데아)에 의해 이미 결정돼 있다는 세계관이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노력하든 이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 처방은 들뢰즈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라는 것이다. 정해져 있는 삶의 의미 같은 것은 없고, 우연한 마주침에 의해 삶의 의미가 구성된다고 보는 세계관이다.‘일하지 않고 돈 벌고 싶은가요?’라는 물음엔 “노동 없는 삶을 추구하지 말라”고 한다. 기쁨은 삶 밖이 아니라 삶 안에 있는 만큼 ‘사유와 존재의 일치가 진리’라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은 틀렸다고 지적한다. “초월적 존재가 되려고 하지 말고, 두 발을 땅에 꼭 붙이고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 가장 기쁜 삶은 죽기 전날에도 하고 싶은 노동을 찾은 삶”이란 얘기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