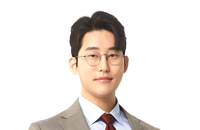암 백신은 크게 암 치료용 백신과 예방용 백신으로 나뉩니다. 암 예방 백신은 전체 암 백신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큰 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대부분 인유두종바이러스(HPV)에 의해 발생하는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인 가다실, 간암의 주요 원인인 B형간염 바이러스 백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암 발생만 예방을 하고 있는 셈입이다.
그런데 최근 암세포를 공격하는 면역시스템을 활용한 암 예방 백신이 임상 진입을 앞두고 있어, 시장의 기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린치 증후군 타깃하는 ‘누스-209’
주목해야 할 암 예방 백신으로는 오는 6월 임상 1·2상에 진입할 ‘누스-209(Nous-209)’가 있습니다. 이 백신은 린치 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암을 예방합니다. 린치 증후군은 DNA 손상을 복구하는 데 관여하는 유전자에 변이가 생긴 유전질환입니다. 린치 증후군 환자의 70~80%는 대장암이 발생하며, 40~50%는 자궁암이 발생합니다.
누스-209를 개발한 미국의 누스컴은 린치 증후군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여러 암종을 분석해 209개의 신생 항원을 발굴했습니다. 이후 바이러스를 이용해 신생 항원을 암호화하는 DNA를 인체 내부에 투여합니다.
누스-209는 면역계의 감작(priming)을 일으키는 프라이밍 백신과 면역반응을 활성화시키는 부스팅 백신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프라이밍 백신은 아데노바이러스를, 부스팅 백신은 변형된 백시니아바이러스를 이용합니다.
누스-209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209개의 종양 신생 항원에 대한 면역반응을 유도한다는 점입니다. 엘리사 스카셀리 누스컴 최고과학책임자(CSO)는 “사람마다 각 신생 항원에 반응하는 정도가 다르다”며 “이 때문에 최선의 접근방식은 최대한 많은 신생 항원을 확보하고, 면역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스-209는 암이 발병하지 않았거나 혹은 발병 이후 종양이 완전히 제거된 완전관해 상태의 린치 증후군 환자 45명을 대상으로 오는 6월부터 투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회사의 계획대로라면 2025년 말 임상이 마무리되고, 이듬해 데이터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카셀리 CSO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5~10년간 수백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를 확인할 것”이라며 “암 백신이 발생 위험을 0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발병 및 재발 위험을 낮춘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누스-209는 암 예방 백신뿐만 아니라 암 치료 백신으로도 임상을 진행 중입니다. 린치 증후군 환자가 가진 유전자 돌연변이는 중간에 염기서열이 빠지거나 끼어들어 염기서열이 쭉 밀리는 ‘프레임시프트(Frame Shift)’ 현상이 발생합니다.
암 치료 백신으로서의 누스-209는 린치 증후군 환자는 아니더라도, 프레임시프트 변이로 인해 암이 발생한 환자가 대상입니다. 임상은 면역관문억제제인 ‘키트루다’와 병용투여로 진행합니다. 총 84명의 환자가 참여했으며, 2019년 임상 1·2상을 시작해 2024년께 연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회사가 지난해 발표한 임상 1상 중간 연구 결과에 따르면 12명의 환자 중 7명에게서 종양의 크기가 줄어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FDA 승인 위해서는 ‘대리 지표’ 발굴 필요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mRNA 백신에 대한 가능성이 입증되며, mRNA를 이용해 암 예방 백신을 개발하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2047년까지 암 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캔서 문샷’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암 예방 백신 개발 계획도 포함돼 있습니다. 백신 개발을 주도할 예정인 보건고등연구계획국(ARPA-H)은 “mRNA 백신으로 암 예방 백신을 개발해 암을 유발하는 50여 가지의 유전적 돌연변이에 대한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한때 무모한 도전으로 여겨졌던 암 예방 백신이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지만, 아직 남아있는 허들도 있습니다. 우선 효능을 평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감염병의 경우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감염 여부를 알 수 있지만, 암은 상대적으로 발병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고 제각각입니다. 이 때문에 백신이 실제로 암 발병을 예방했는지를 확인하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긴 시간 추적 관찰을 한다고 해도, 암 발생에 관여하는 여러 환경적 요인을 통제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이런 이유로 암 예방 백신의 임상은 대부분 대리지표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자궁경부암 백신인 가다실은 4~5년간 추적 관찰을 하며 HPV의 감염 여부, 자궁경부암으로 진행되는 단계인 ‘CIN grade’를 대리지표로 내세웠습니다.
결장암 예방 백신을 개발하는 미국 피츠버그대 연구진의 경우, 결장암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폴립’을 대리지표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폴립은 장의 빈 공간을 에워싸는 벽에 조직이 돌출한 것을 의미합니다.
로버트 보더헤이드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에브럼슨 암센터장은 “FDA의 승인을 받으려면 그들을 설득할 만한 대리지표를 찾아야 한다”며 “이는 쉽지 않은 여정이 되겠지만, 엄청난 의료적 혜택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