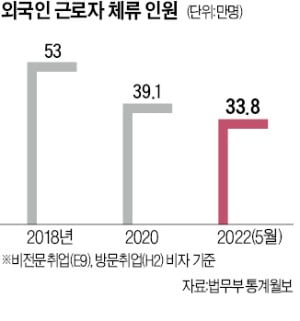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한 기업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3~4명씩 짝을 지어 공장 밖에 차를 대기해 두고 일이 힘든지, 급여는 높은지 등을 ‘쇼핑’하듯 알아보고 떠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외국인 근로자 공급이 한동안 막히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40만 명가량의 불법체류자도 ‘귀한 몸’이 됐다. 인력난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 “불법체류자를 쓰지 않으면 공장이 안 돌아간다”는 것이 중소제조업계의 반응이다.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한 기업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3~4명씩 짝을 지어 공장 밖에 차를 대기해 두고 일이 힘든지, 급여는 높은지 등을 ‘쇼핑’하듯 알아보고 떠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외국인 근로자 공급이 한동안 막히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40만 명가량의 불법체류자도 ‘귀한 몸’이 됐다. 인력난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 “불법체류자를 쓰지 않으면 공장이 안 돌아간다”는 것이 중소제조업계의 반응이다.한 중소기업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는 원래 3년간 3회만 이직이 가능한데 불법체류자로 신분을 바꾸면서 임금에 따라 수시로 이직하고 주 52시간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음껏 연장근로를 한다”며 “이런 식으로 월 600만원을 버는 사례도 많다”고 했다. 불법체류자가 되고 주 52시간제를 어겨도 사업주만 강도 높게 처벌하는 한국 법의 맹점을 노리고 사업장을 옮겨가며 돈벌이에 나선 것이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촌 수확철을 맞아 일당이 20만~25만원대인 농어촌 일터로 대거 이직하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소제조업 일당은 15만~18만원 선이다.
전문가들은 당장 외국인 공급을 늘려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작년 입국자의 10배인 총 10만 명을 올해 입국시켜 수요 적체를 해소할 계획이지만, 현장에서 필요한 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노동력 부족 산업에 외국인 근로자가 수혈돼 산업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당장 외국 인력을 들여와 공장부터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개별 기업과 업종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를 풀어달라고 고용부 등에 요구하고 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