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혜자 화백 (1937~2022)이 별세했다. 향년 85세.
재불 원로화가 방혜자 씨는 15일(현지시각) 노환으로 입원 중이던 프랑스 파리 병원에서 영면했다고 16일 유족이 밝혔다. 올해는 그가 프랑스로 떠나 활동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다. 올 봄 건강이 악화할 때까지 붓을 놓지 않았던 방 화백은 유럽과 한국을 오가며 약 150회에 걸쳐 개인전과 단체전을 열었다.
한국적인 자연채색의 대가이자 추상 대작들을 남겨 세계 화단에서 '빛의 구도자'로 불렸다.


방 화백은 1956년 서울대 미술대학 서양화과에 입학, 당시 교수였던 장욱진(1917~1990)에게 배웠다. 이후 파리 국립미술학교와 파리 국립응용미술학교 등에서 벽화와 색유리화 수업을 받았다. 1961년 프랑스 파리로 떠난 국비 장학생 1호다.
경기도 고양군 능동(현재는 서울) 아차산 아래 마을에서 태어난 방 화백은 마을의 맑은 개울 속에 잠겨 반짝이던 자갈돌들의 투명한 빛에서 예술적 영감을 얻었다. 7남매 중 가장 몸이 약하게 태어나 죽음의 문턱에 간 경험도 있다.
어린 나이에 식민지와 전쟁 등을 겪으며 평화와 사랑, 생명의 가치에 대해 일찍 눈떴다. 어린 시절의 악몽이 평생을 따라다녔지만,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빛'을 탐구했다.
<i> “일생동안 가장 고심해온 것은 어떻게 하면 예술을 통해 평화에 이르는 길을 제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죠. 세상에 환한 빛을 고루 비추는 것이지요.”</i>
서울대 미술대학 재학시절에 그린 첫 작품 '서울풍경(1958)'이 그에게 평생 작품의 주제가 된 ‘빛’과의 인연을 시작한 계기였다.
1961년 봄 파리 유학 시절은 고달팠다. 남의 집 다락방에서 살며 빵 한 조각으로 버틴 날도 많았다. 학교 사감이 아픈 방 화백을 발견해 기숙사로 데려간 뒤에도 배고픈 날들을 무수히 견뎌야 했다.

처음엔 살기 위해 그렸다. 하지만 그림이 팔려 돈이 생기면 먹을 것보다 물감부터 샀다. 1967년 파리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을 당시 프랑스 미술평론가협회 회장이자 미술사가였던 피에르 쿠르티용이 그를 알아봤다.
첫 전시회에 작품이 거의 다 팔렸고, 쿠르티용은 91세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방 화백을 후원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뒤 그는 파리행 항공료를 모으기 위해 졸업을 앞두고 첫 개인전을 열었다. 당시 박수근 선생, 법정 스님 등이 찾았다. 법정스님은 방명록에 마음을 그리는 화가라는 뜻의 '심여화사(心如畵師)'라는 글씨를 써주기도 했다.
그 인연으로 파리 길상사가 문을 열었을 때 그곳의 후불탱화를 추상으로 그렸다. 서울 보각사와 개화사의 후불탱화도 방혜자의 빛 그림으로 채워졌다.

빛이 모두에게 공평한 것처럼, 그가 인연을 맺은 사람들도 그랬다. 고암(顧庵) 이응로 선생은 미술공부를 하던 여대생에게 '소를 끌고가는 사람'이라는 그림을 그려줬다. 고삐를 잡고 채찍을 든 힘이 넘치는 그림이었는데, 고암은 그에게 소처럼 꾸준하고 묵묵히 그림에 정진하라는 뜻으로 이 그림을 그렸다.
파리 유학 시절 고암을 다시 만나 1989년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방 화백은 한 가족처 지내며 예술적 스승으로 그를 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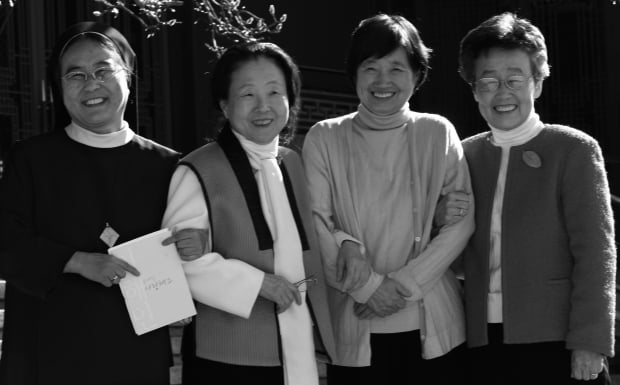
수화(樹話) 김환기(1974년 작고) 선생과도 자주 만나 미술적 영감을 교류했다. 방 화백의 그림들이 수화의 후기작들과 연결되는 지점도 여기에 있다.

유럽의 천체 물리학자들과도 교류했다. 그의 그림을 보고 스위스의 한 천체연구소에서 연락해와 "과학자도 아닌데 어떻게 자신들이 그토록 오래 연구한 것과 흡사한 모양의 빛의 입자를 그렸냐"고 했다. 마리퀴리대학에서 천체물리학자와 공동으로 강연하기도 했다.
프랑스 비평가 질베르 라스코는 “우주를 경탄하는 방혜자의 시선은 우리가 무궁무진한 아름다움을 감상하도록 도모한다. 그녀는 또 우주의 아름다움, 조화, 다양함을 증언하기 위해 깨어 있다”고 평가했다.
수십 번을 칠하면 뒤에서 배어들고 앞으로 우러나는 자연채색의 기법이 완성된다. 종이 자체의 아름다움으로 마치 빛이 번져 나가는 것을 표현했다고 그는 말해왔다.

방 화백의 그림 그리는 과정은 수도승의 그것 같았다. 그림을 그리기 전 빈 종이를 앞에 두고 기공수련을 하는 것으로도 유명했다. 더 맑은 정신과 건강한 몸으로, 우주의 에너지와 소통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대했다.
<i>"세상이 허망하고 고통스럽고 전쟁이 많고, 아픔이 가득한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항상 고뇌했어요. 나날이 더 깊은 마음으로 작업하면서 세상에 한 줌의 빛이라도 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행복합니다."</i>

방 화백의 유작은 프랑스 샤르트르 대성당에 걸려 있다. 샤르트르 대성당은 프랑스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제1호로 등록한 세계적인 종교 성지다. 한 해 100만 명이 찾는 곳이다.
2018년 3월 샤르트르 대성당 종교 참사회의실에 새로 설치되는 4개의 스테인드 글라스 창엔 방혜자 화백의 작품이 선정됐다. 대성당의 창과 같은 청색 바탕의 4개 창에 각각 빛, 생명, 사랑, 평화의 메시지를 담았다.
지난해 완공된 이 작품은 아직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방 화백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기념식을 올해 하반기로 미뤄왔다.

방 화백은 1967년 파리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교수이자 저명한 한국학자였던 알렉상드르 기예모즈와 결혼했다. 기예모즈는 지난해 세상을 떠났다. 슬하에 아들과 딸을 두었다. 아직 장례 일정과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보라 기자
<hr >
아래는 시를 즐겨 쓰던 방혜자 화백이 2008년도에 쓴 시다. <i><안으로 가는길 > -방혜자
마음을 비우고
우주의 중심으로 걸어간다
텅빈 가운데
아무도 아무것도 없는
안으로 가는길은
마음이 깨어나는길
어둠을 다 거두고
밝게 피어나는 시작의 길
세포 하나 하나까지도
활짝 깨어나
새로 태어나는 길
천지에 마음의 빛
뿌리며 간다</i>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