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업계에 따르면 현장을 고려하지 않고 규제 문구를 확대 해석한 탁상행정으로 적잖은 기업이 과도한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금업계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안전 강화를 명분으로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도금 작업에서 하도급 인력의 공정 투입을 금지했다.
문제는 관련 부처가 도금 전·후 공정까지 ‘도금 작업’으로 광범위하게 해석하면서 빚어졌다. A사처럼 도금 공정 전체를 자동화하고, 도금 전·후 부품 이송 작업만 하도급 업체 직원이 맡아도 불법 하도급 업체로 낙인찍힌다.
고용부는 한 공장 내에서 도금 작업을 할 때 전·후 공정 사이에 작업 인력의 안전을 위한 벽을 설치해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면 도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공장 자동화로 컨베이어벨트를 따라 이뤄지는 도금 생산 공정상 중간에 벽을 설치하는 것은 도로 한가운데 집을 짓는 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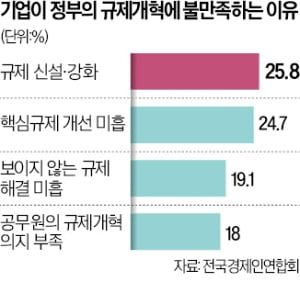 A사 대표는 “일본 도요타와 독일 벤츠, 아우디 협력사들이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로 산업 안전과 스마트 공정에 대한 명성이 높았는데 정부의 과징금 부과는 충격적”이라고 한탄했다.
A사 대표는 “일본 도요타와 독일 벤츠, 아우디 협력사들이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로 산업 안전과 스마트 공정에 대한 명성이 높았는데 정부의 과징금 부과는 충격적”이라고 한탄했다.미국, 독일, 일본에도 없는 세계 최강 규제에 직면한 영세 도금 업체들은 2018년 법 제정 이후 줄곧 문제를 제기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수년째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규제 적용의 현실성 여부와 별개로 규제 마련의 근거가 취약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도금업계는 고용노동부가 주장하는 도금 전·후 공정의 유해 가능성을 두고 계속 이의를 제기해왔다. 이상오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전무는 “국내 대부분 도금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뿐 아니라 환경 규제도 동시에 받는다”며 “밀폐된 공간에서 자동화설비로 이뤄지고 있어 유해물질 유출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도금할 부품을 미리 옮기는 도금 전 공정이나 물로 세척해 건조된 제품을 포장·검사하는 도금 후 공정에서도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도금업계는 도금작업이 반도체 제조 공정보다 인체에 덜 유해하고, 심지어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기름을 넣을 때보다 유해물질 노출이 적은데 유독 도급이 금지된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 도금업체 대표는 “고용부 입장처럼 도금 작업이 인체에 유해하다면 도급만 금지하지 말고 원청업체 작업도 전면 금지해야 하지 않겠냐”고 꼬집었다.
탁상행정 피해는 이뿐만 아니다.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이 부서 저 부서로 오가길 반복하거나 규제 개선 요구가 실종되기 일쑤다. 도금업체는 화학물질을 다루기 때문에 화학물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9개 법률과 산안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관련 2개 법률을 동시에 대처해야 한다. 업체당 평균 137가지 종류의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 환경부 산하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신규 물질 하나를 등록하기 위해 같은 서류를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 환경과학원, 환경공단 등에 중복으로 제출해야 하는 부담도 컸다.
이에 업계는 서류를 한 번만 등록해 여러 기관이 조회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환경부, 고용부 등 부처 간 이견으로 한 걸음도 진척되지 못했다.
각종 규제에 발목 잡힌 도금업계의 위기가 도미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도금이 모든 제품의 ‘마무리 공정’에 쓰이는 만큼 자칫 스마트폰과 자동차부터 선박, 항공기 부품에 이르기까지 산업계 전 분야의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지역 한 도금업체 대표는 “지난 1년간 주원료인 니켈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다”며 “제조 환경 악화에 인력 파견(도급)을 금지한 산안법 규제 같은 제약까지 겹치면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고 전했다.
안대규/강경주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