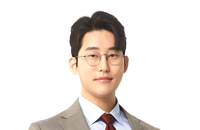“기업은 기업다운 일을 해야 합니다. 제약사라면 신약을 개발해야죠. 남이 만든 약만 팔면 그건 유통회사 아닌가요.”
“기업은 기업다운 일을 해야 합니다. 제약사라면 신약을 개발해야죠. 남이 만든 약만 팔면 그건 유통회사 아닌가요.”꼭 2년 전 김승호 보령 회장이 했던 말이다.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 자리에서다. 화제는 연 매출 1000억원을 막 넘긴 국산 고혈압 신약 ‘카나브’였다. 그는 카나브를 ‘20년 넘는 시간과 수백억원의 돈, 수많은 좌절의 대가로 얻은 끈기의 산물’이라고 표현했다.
작년 카나브 국내 처방액은 1418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산 신약 중 최대 실적이다. 해외 영토도 빠르게 확장 중이다. 2014년 멕시코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40여 개국에 진출했다. 해외 누적 판매액은 1억5000만달러(약 2000억원)에 이른다.
‘카나브 신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이젠 ‘카나브 키즈’들이 해외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인 HK이노엔의 케이캡과 대웅제약의 펙수클루, 호중구감소증 치료제인 한미약품의 롤론티스 등이 주인공이다. 35개국에 수출 계약을 한 케이캡은 출시 3년 만인 작년에만 1252억원어치가 팔린 블록버스터가 됐다. 2021년 허가받은 대웅제약의 펙수클루도 벌써 15개국에서 수출 계약을 이뤄냈다.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는 작년 미국에서만 1692억원어치가 팔렸다.
해외에 기술 수출한 국산 신약도 빛을 보기 시작했다. 한미약품이 2012년 미국 스펙트럼에 넘겨 공동 개발한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가 선두 주자다. 지난해 미국 출시 1분기 만에 1000만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2년 넘도록 돈 가뭄에 시달리는 바이오벤처 생태계를 떠받칠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1조원 규모 메가펀드 조성이 전부다. 지금 바이오업계에 가장 시급한 건 투자 자본 선순환이다. 높은 상장 문턱 때문에 자금 회수 길이 막히자 바이오 투자가 뚝 끊겨버려서다. 대웅제약 한미약품 등 기존 사업으로 신약 개발 자금을 대는 제약사와 다르게 상당수 바이오벤처가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다.
신약은 개발에만 10년 넘게 걸리고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되지만 성공하면 그 부가가치는 반도체, 자동차를 능가한다. 정부 말마따나 포기할 수 없는 분야다. 그러니 서둘러야 한다. ‘제2의 카나브’ 개발을 꿈꾸는 유망 바이오벤처들이 일시적 자금난에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