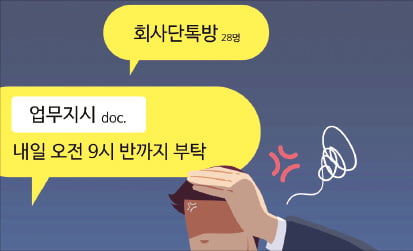
‘연결되지 않을 권리(연결차단권)’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본 권리에 해당할까.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보호를 명목으로 이런 내용을 법에 담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022년 후반 더불어민주당의 한 국회의원이 퇴근 후 카카오톡 등 휴대폰을 이용한 반복적인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 그 연장이다. 흥미로운 대목은 진보좌파 표방 정당에서 내놓은 법안과 거의 비슷한 내용을 보수우파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검토 중이라는 점이다. 개인이 업무시간 외 직장(상사)으로부터 업무든 아니든 이런저런 간섭·감독을 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해줘야 한다는 주장과 이런 것까지 어떻게 법제화가 가능하냐는 쟁점이 부딪치고 있다. 연결차단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직장인이어도 이런 개인영역을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회사를 상대로 개인은 이런 사항에 대한 저항권이나 발언권을 보장받기 어렵다. 정부가 근로자 보호 혹은 근로권 확보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 근로시간제도 개편 일환으로 볼 필요가 있다. 2021년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8%가 퇴근 후 업무 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불만을 삭이고 인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항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해외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프랑스가 2019년 세계 최초로 이 권리를 법제화해 5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노사 협의 내용을 매년 단체교섭 협상에 포함하도록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보통신기기(전화·SNS 등)로부터 근로자는 차단될 권리를 확보했다. 재택근무자에 대해서는 연결차단권을 더욱 확보해주고 있다. 물론 연결만으로 바로 처벌은 아니고, 관련 ‘단체협상’을 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하는 방식이다. 슬로바키아 필리핀 포르투갈 캐나다 같은 나라에도 유사한 법이 있다.
카톡이나 문자로 회사관계자끼리 업무 연락을 나누게 됐다면 급한 사정이 생겼기 때문일 수 있다. 심야나 업무 외적인 일을 두고 상습적으로 연락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처벌법’ 등으로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고, 다른 제재법도 있다. 무서운 처벌법을 내세우기에 앞서 노사 간 자율적 단체협약에 포함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그런 내용을 노사교섭을 통해 명시한 기업에는 고용정책 등에서 인센티브를 주며 직장에서 자율적으로 좋은 관행이 정착되게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그래도 문제가 심각하다면 그때 가서 법제화를 공론에 부쳐도 늦지 않다. 정부가 모든 것을 관할하고 개인사와 사적 관계까지 간섭·감독하겠다는 식의 ‘어버이 국가’는 곤란하다. 여기서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 자칫 독재가 될 수도 있다.
고용과 근로조건, 노사관계로 보면 정부가 나서 바로잡아야 할 게 너무도 많다. 그런 시급한 과제에 비하면 ‘몇 시 이후엔 카톡 연결을 하라 말라’며 간섭하겠다는 것은 한가한 발상이다.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주 52시간제’만 해도 근로자가 회사 측과의 합의하에 더 일하는 것을 막는 법이다. 자발적으로 돈을 더 벌고 싶어도 못하게 하는 이런 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불법 파업에 회사 측의 대항 수단으로 ‘파견근로제’를 경영계에서 줄곧 요구하고 있지만, 대다수 선진국이 시행 중인 이런 다급한 제도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엉뚱한 데에 열을 올린다.
 ‘잊힐 권리’를 연상시키는 인터넷·SNS 기반 현대사회의 논쟁거리다. 과거의 1·2차 산업 종사자와 업무 형태가 많이 다른 지식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쉴 때는 제대로 쉬고 싶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안 그래도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국제 비교에서 과도하게 많다는 게 한국 노동계의 해묵은 불만이다. 물론 여기서도 노동의 집중도, 즉 근로시간에 얼마나 몰두해서 일을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남는다. 중요한 관심사지만 법부터 만든다고 좋은 결과를 보장한다는 법도 없고, 그런 접근방식이 늘 옳다고 보기도 어렵다. 먼저 노사 합의를 유도하고, 일터나 업무계약관계에서 자율적인 규율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근로시간·임금과 고용관계·노사관계 등에서 풀어야 할 중요한 현안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이런 문제 해결이 먼저다. 법만 자꾸 만든다고 이상사회가 실현되는 것도 아니다.
‘잊힐 권리’를 연상시키는 인터넷·SNS 기반 현대사회의 논쟁거리다. 과거의 1·2차 산업 종사자와 업무 형태가 많이 다른 지식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쉴 때는 제대로 쉬고 싶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안 그래도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국제 비교에서 과도하게 많다는 게 한국 노동계의 해묵은 불만이다. 물론 여기서도 노동의 집중도, 즉 근로시간에 얼마나 몰두해서 일을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남는다. 중요한 관심사지만 법부터 만든다고 좋은 결과를 보장한다는 법도 없고, 그런 접근방식이 늘 옳다고 보기도 어렵다. 먼저 노사 합의를 유도하고, 일터나 업무계약관계에서 자율적인 규율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근로시간·임금과 고용관계·노사관계 등에서 풀어야 할 중요한 현안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이런 문제 해결이 먼저다. 법만 자꾸 만든다고 이상사회가 실현되는 것도 아니다.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huhws@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