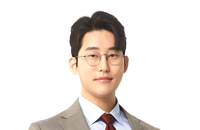지난해 16개 시·도 교육청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폭 실태조사에서 피해 응답률은 1.7%였다. 낮은 비율 같지만 무려 5만4000여 명이 학폭 피해를 봤다는 통계다. 내 아이가 학폭 피해자라면, 또는 가해자라면 부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가장 찬란해야 할 학창 시절이 상처로 얼룩지지 않도록 부모는 아이의 감정을 어떻게 돌봐야 할까. 김효원 서울아산병원 소아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도움을 받아 정리했다.
무엇보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피해 사실을 학교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 정도에 따라 가해 학생과 아이를 즉시 분리할 필요가 있어서다. 사과를 받아내는 것도 1차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피해 학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본 전제가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여서다. 부모와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자신 때문에 부모가 상처받고 힘들어질 것을 염려하면 아이는 부모를 찾지 않게 된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만성화하고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는 걸 조심해야 한다. 두통이나 복통, 어지럼증을 호소할 때도 있는데 이런 경우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자신감 없는 말과 행동을 하거나, ‘될 대로 돼라’라는 식으로 행동할 땐 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자칫 부모가 꾀병으로 치부하거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이는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아이의 감정을 이해해주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아이에겐 큰 위로가 된다. 특히 아이가 신학기에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아이의 어려움과 감정을 잘 들여다봐야 한다. 그렇다고 섣불리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건 금물이다. 아이는 자신의 감정에 부모가 관심을 갖고 공감해주길 바란다. 아이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것이 좋다.
어린아이라도 친한 친구와의 세력을 과시하려 들거나, 다른 아이를 따돌리는 행동을 한다면 따끔하게 주의를 줘야 한다. 무조건적인 허용이나 방임은 교정할 시기를 놓치게 한다. 중·고교로 올라가면 가해 이유가 좀 더 복잡해진다. 개인적인 성향과 더불어 부모의 양육 방식, 가족 관계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아이의 불안감이다. ‘내가 다른 아이보다 우월하지 않으면,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나를 괴롭히면 어떻게 하지’라는 불안함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공부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공격성의 원인이 된다.
부정적인 감정을 말로 표현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친구가 별명을 불러서 놀림당한 것 같았구나. 그래서 네가 많이 화가 났구나”처럼 부정적인 감정을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자신의 감정을 누군가 이해한다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화를 참을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주는 것도 좋다. 심호흡을 크게 한다거나, 음악을 듣는 식으로 감정 조절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공격성을 보이는 아이 중에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나 반항성 도전장애, 불안장애 같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다. 아이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격성을 조절하기 위한 약물 치료도 도움이 된다. ‘정신과 약을 먹는다’는 것이 부모에게 큰 걱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내 아이의 공격성이 ADHD나 불안, 우울에서 비롯됐다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건강에도 무리가 되지 않는 약으로 이를 조절해야 한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