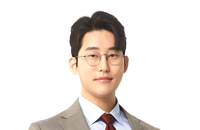△2023년 음력 날짜: 음력 1월 1일(양력 1월 22일), 음력 2월 1일(양력 2월 20일), 음력 윤2월 1일(양력 3월 22일), 음력 3월 1일(양력 4월 20일), …. △24절기: 소한 1월 6일, 대한 1월 20일, 입춘 2월 4일, 우수 2월 19일, ….
지난해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해 달력 제작의 기준으로 삼을 보도자료를 하나 배포했다. ‘2023년 월력요항’이 그것이다. ‘월력(月曆)’은 ‘달력(-曆)’과 같은 말이다. ‘월력요항’에는 천문역법에 따른 양력과 음력 날짜, 24절기, 명절, 공휴일 및 각종 기념일 등의 자료가 담긴다. 과기정통부 산하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매년 여름 발표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윤이월’이 표제어로 올라 있다. 윤달은 윤이월뿐만 아니라 윤삼월도 있고, 윤사월도 있고 연말·연초를 빼곤 달마다 다 있다. 그런데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윤이월만 있고 다른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외려 ‘윤사월’은 윤달 중에서도 우리 귀에 익은 말이라 표제어로 올릴 만하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은 ‘윤사월’을 올림말로 다뤘다. 윤사월이 유난히 우리에게 친근한 까닭은 만화방창한 이 계절을 노래한 문학예술 작품이 많기 때문인 듯하다. 고즈넉한 봄날 산속 정경과 그리움을 애잔하게 읊은 박목월의 시 ‘윤사월’이 유명하다. 김동리의 단편소설 ‘윤사월’도 널리 알려져 있다.
윤달은 대략 5년에 두 번꼴, 즉 2~3년에 한 번씩 드는데 어떤 달에 윤달을 넣을지는 천문연구원에서 결정한다. 윤달이 든 해는 대개 절기상 입춘이 앞뒤로 두 번 든다. 입춘은 보통 설 직후에 드는데, 윤달로 한 달이란 기간이 더해지다 보니 다음 해 설이 돌아오기 전에 입춘이 또 드는 것이다. 예컨대 올해 설은 양력 1월 22일이었고 그 13일 뒤인 2월 4일이 입춘이었다. 내년(2024년)에는 설이 2월 10일인데 새해 입춘은 그 전인 2월 4일에 다시 든다.
쌍춘년은 국어사전에 없는 말이다. 언론에 등장한 지도 20년이 채 안 된다. 대략 2006년을 전후해 나타나기 시작했다. 원래 있던, 예전부터 쓰던 우리말이 아니라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각종 ‘00데이’처럼 다분히 상업적 필요에 따라 의도적으로 부각된 말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런 점에서 ‘쌍춘년’이 우리말 안에서 뿌리를 내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윤달은 음력 날짜와 실제 계절과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 ‘원달’에 덤으로 얹는 달이다. ‘공달(空-)’이다 보니 나쁜 액이 없다는 속설이 생겼다. 그래서 윤달은 ‘손 없는 달’이라고도 불린다. 이때의 ‘손’은 민속에서 날짜에 따라 방향을 달리해 따라다니면서 사람 일을 방해한다는 귀신을 가리키는 고유어다.
 그래서인지 윤달에는 이사, 결혼, 이장 등이 평소보다 훨씬 많아진다는 통계가 있다. 쌍춘년 길일을 맞아 평년보다 혼인이 늘어나기를 기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혼인 연령이 점점 늦춰지고, 덩달아 저출생 심화로 나라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에 해보는 소리다. 그것이 우리말 안에서 아직 자리잡지 못한 ‘쌍춘년’의 위상을 살펴본 까닭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윤달에는 이사, 결혼, 이장 등이 평소보다 훨씬 많아진다는 통계가 있다. 쌍춘년 길일을 맞아 평년보다 혼인이 늘어나기를 기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혼인 연령이 점점 늦춰지고, 덩달아 저출생 심화로 나라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에 해보는 소리다. 그것이 우리말 안에서 아직 자리잡지 못한 ‘쌍춘년’의 위상을 살펴본 까닭이기도 하다.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