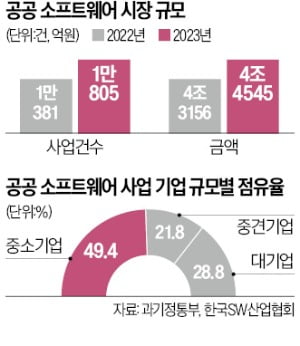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두 기업은 국방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쟁점인 군수통합정보체계 사업비 감정 결과를 이달 초 민사합의47부에 냈다. SW사업 규모를 정하는 국제규격화기구(ISO)표준인 기능점수(FP)가 11만여 점으로 국방부가 발주할 때 정한 4만8531점보다 두 배 이상 많다는 내용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두 기업은 국방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쟁점인 군수통합정보체계 사업비 감정 결과를 이달 초 민사합의47부에 냈다. SW사업 규모를 정하는 국제규격화기구(ISO)표준인 기능점수(FP)가 11만여 점으로 국방부가 발주할 때 정한 4만8531점보다 두 배 이상 많다는 내용이다.2015년 발주 당시 법제상 기능점수 1점당 단가는 51만9203원이었다. 이 감정대로라면 국방부는 점수 차 단가에 해당하는 300억여원을 CJ 측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두 기업 측은 “과도한 업무 증가로 사업비(251억원) 못지않은 큰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의 1200억원짜리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도 SI기업과 정부 간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생겼다. 이 사업을 주관하는 LG CNS컨소시엄이 복지부 측에 최근 사업 포기 의사를 전달했으나 복지부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LG CNS 등이 30개월간 사업을 벌여 지난해 10월 개통한 이 시스템은 개통 직후 오류가 빗발쳤다. 증명서 발급이 늦어 차상위계층 전형으로 대학 입시에 지원하지 못한 고교생 등 피해가 잇따랐다. LG CNS컨소시엄은 최근 이 시스템 후속 사업(3·4차)을 하기 어렵다는 뜻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전달했다. 늘어난 일감의 사업비를 다시 산정하고, 최근 2~3년 새 급증한 개발자 인건비를 반영하지 않으면 적자가 너무 커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작할 때 확정한 FP가 실제 개발 과정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이다. 한 SW기업 대표는 “공공기관 발주는 ‘1000억원을 줄 테니 50층 건물을 멋지게 잘 지어 달라’는 식”이라며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 발주기관 담당자도 책임을 지게 법령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SW법령상 과업이 증가하면 상응한 대가가 지급돼야 하지만 실제론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과업이 대폭 늘어도 사업 기간과 투입 인력은 그대로라 시스템이 불완전한 상태로 개통할 수밖에 없다. 나이스를 발주한 교육학술정보원 관계자는 “개발 후 보상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만 현실적으론 예산을 다시 받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공공SW 부실화 배경엔 중소기업 참여를 늘리겠다며 소프트웨어진흥법에 10년 전 명시한 ‘분리발주’도 거론된다. 쌍용정보통신과 아이티센이 개발한 나이스는 미래월드, SGA, 타임소프트 등 영세 기업에 수천만원씩 배정한 작은 사업이 적지 않다. 사업이 잘게 쪼개지는데 컨트롤타워가 없으니 시스템이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해성/김진원 기자 ihs@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