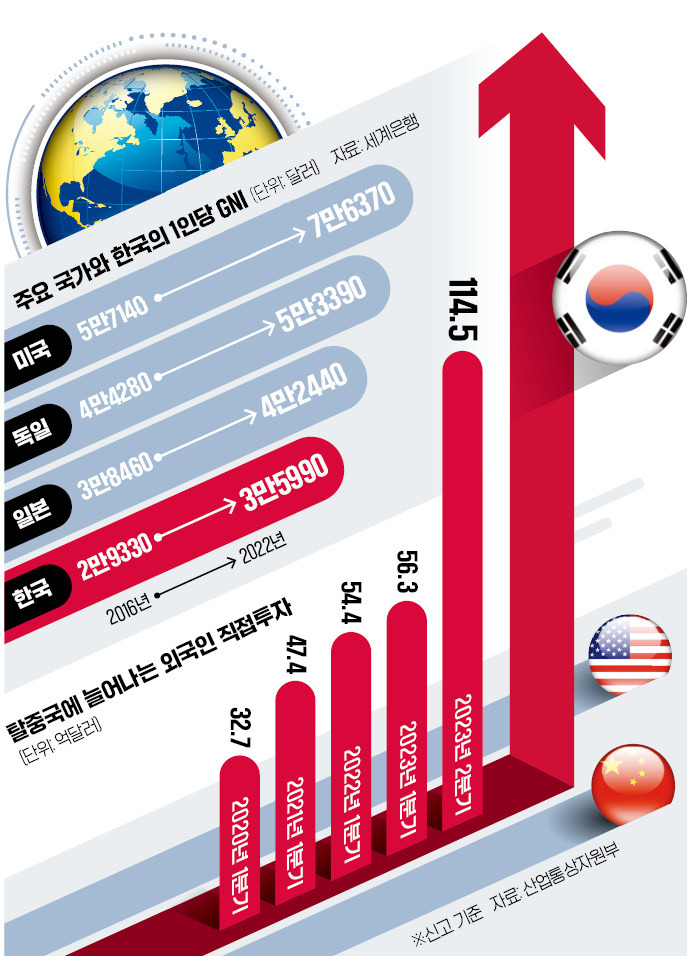
국내 산업화 1세대가 물러나는 과정에서 최고 60%에 달하는 ‘징벌적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동진섬유(신발 원단), 락앤락(밀폐용기) 등 업종별 국내 1위 업체가 상속세 부담에 회사를 매각했고 세계 시장을 휩쓸던 유니더스(콘돔), 쓰리세븐(손톱깎이)마저 가업 승계를 포기했다.
‘부자는 많지만 자본가는 적고, 기존 제도로는 자본가로의 전환이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IFS의 문제의식이다. 그러면서 민간 자본이 기술 혁신을 지원한 다양한 해외 사례를 들었다.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이 5대에 걸쳐 160여년간 이끄는 발렌베리그룹이 대표적이다. 이 그룹은 지주회사를 통해 아스트라제네카(제약), 에릭슨(통신), 일렉트로룩스(가전), 사브(항공) 등 핵심 자회사를 관리하고 가문이 세운 재단이 세금 부담 없는 승계와 차등의결권 제도를 활용해 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가문의 경영권을 보장받는 대신 재단을 통해 수익금의 80%를 과학·기술·의학 분야 연구 등 공익적 목적에 사용한다.
유럽 기업뿐 아니라 미국 빅테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메타(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모기업)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와 부인은 2015년 당시 페이스북 지분의 99%에 달하는 약 52조원의 주식을 자선사업을 위한 유한책임회사(LLC)인 첸-저커버그이니셔티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페이스북 주식을 클래스A·B·C 등 세 종류로 나눈 뒤 본인은 클래스A 주식을 소유해 전체 주식의 15%만 가져도 54%에 달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그렇다고 ‘제왕적 창업자’를 만들자는 것은 아니다. 구글은 창업자와 전문경영인이 공존하고 있다. 구글 공동 창업자인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2019년 일선에서 물러났고, 전문경영인인 순다르 피차이가 이끌고 있다. 페이지와 브린의 알파벳(구글 모회사) 지분은 각각 6% 안팎이지만, 주당 10배의 차등의결권 덕분에 전체의 절반이 넘는 의결권을 갖고 있다. 이들은 이사회 멤버이자 피차이의 조언자로서 미래 신기술에 집중하며 전문경영인과 역할을 나눴다.
IFS는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민간 재단처럼 국내에서도 기업 공익법인을 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업이 공익법인을 통해 사회공헌을 강화하고, 동시에 소유지배구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다.
풀어야 할 규제가 한둘이 아니다. 상속·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이 주식을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 넘게 취득하면 증여세를 물리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공익법인의 주식 의결권 행사를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등 글로벌 수준으로 공익법인 관련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공정거래법상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을 폐지하거나 20% 이상으로 상향하고, 상속·증여세법상 면세 비율도 20%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익법인이 설립 취지에 맞게 활동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