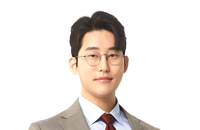아키히토 전 일왕이 재위한 1989~2019년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상당 부분 겹친다. 이 때문에 그의 연호인 ‘헤이세이’는 일본의 기나긴 내리막을 은유하기도 한다. 요시미 슌야 도쿄대 교수는 저서 <헤이세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에서 이 몰락을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아키히토 전 일왕이 재위한 1989~2019년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상당 부분 겹친다. 이 때문에 그의 연호인 ‘헤이세이’는 일본의 기나긴 내리막을 은유하기도 한다. 요시미 슌야 도쿄대 교수는 저서 <헤이세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에서 이 몰락을 입체적으로 분석했다.플라자 합의와 자산 버블, 10대 전자기업 몰락 등과 함께 슌야 교수는 일본 정치를 몰락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일본 정치권은 정책 주도권을 쥐겠다며 관료 사회 개혁을 화두로 내걸었다. 이 같은 작업은 자민당 55년 독주를 종식하고 집권한 1993년 호소카와 연립내각을 시작으로 아베까지 헤이세이 시기 내내 지속됐다. 고이즈미 자민당 총리의 우정국 개혁도, 하토야마 민주당 총리의 대장성 해체도 같은 맥락이다.
기자는 비슷한 후회의 말을 2019년 대만 타이베이에서 들었다. 장산정 전 행정원장(국무총리에 해당)은 인터뷰에서 한류 열풍을 높이 평가하며 “양안(중국·대만) 문제에 지나치게 함몰되지 않았다면 대만의 문화적 역량도 못지않았을 것”이라고 회한 섞인 표정으로 말했다.
경제와 군사 등에서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중국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대만에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대만이 발버둥친다고 해도 현상을 변화시킬 여지가 적다는 점도 엄연한 현실이다. 친중과 반중으로 나뉘어 정치권이 싸우는 동안 정작 대만 자체의 역량을 키우는 것에는 소홀했다는 것이 장 전 원장의 지적이었다.
결국 오늘 정치인들이 무엇을 갖고 싸우는지가 국가의 내일을 결정한다. 일본의 관료 개혁도, 대만의 양안 문제도 나름 중요했다. 하지만 공론을 논할 사회적 자원이 제한된 가운데 다른 이슈를 집어삼킬 만큼 절실한 문제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슌야 교수와 장 전 원장의 문제의식은 만난다.
일본과 대만의 사례에 비춰 여러 의문이 꼬리를 문다. 지금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목소리 높이는 문제는 내일의 한국과 어떤 관계가 있나. 현실화된 인구 감소와 저성장 앞에서 절실한 구조 개혁에 도움이 되나. 미래 세대는 후쿠시마와 반국가 세력 논쟁에 매몰된 오늘의 정치권을 어떻게 평가할까.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