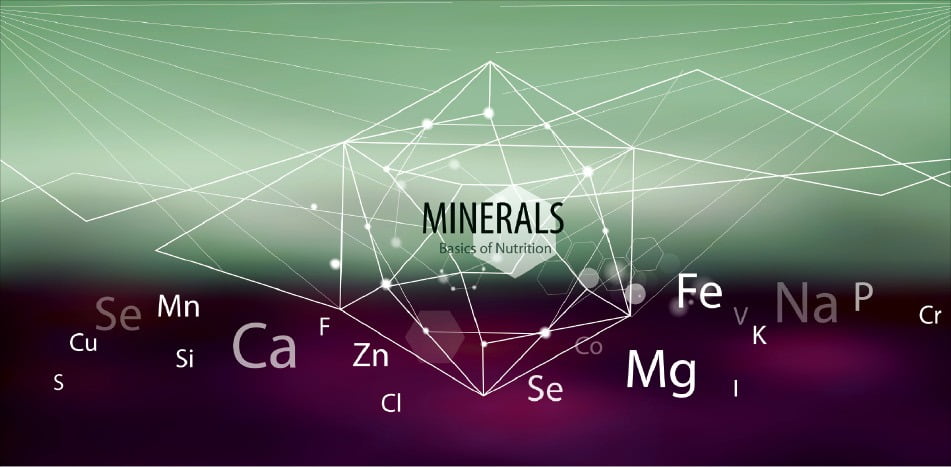
희토류는 한자어 의미 그대로 ‘드문 흙 종류’입니다. 사실 그 자체로 희귀한 금속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광물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추출해 비슷한 종류끼리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스칸듐(Sc), 이트륨(Y), 세륨(Ce), 란타넘(La), 네오디뮴(Nd) 등을 비롯한 17개의 원소로 구성돼 있어요. 주로 모나자이트와 바스트네사이트 광석에 네오디뮴, 란타넘, 세륨 등 경희토류와 같은 희토류 성분 함유량이 많아요. 희토류 원소는 화학적으로 안정돼 있고, 열전도율이 높아요. 첨단 제품의 핵심 소재로 쓰이죠. 하드디스크, 반도체, 전기차, 풍력 터빈 등 21세기 핵심 소재에서 빠지지 않죠.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소재입니다.
원소 번호와 무게에 따라 경희토류, 중희토류로 크게 나뉘어요. 전 세계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경희토류는 세륨, 란타넘, 네오디뮴 등이 많이 생산됩니다. 이들은 강화유리나 페인트 등으로 쓰임새가 제한적입니다. 중희토류는 희토류 전체 생산량의 10%가 안 되는데 이트륨, 테르븀, 홀뮴, 툴륨, 루테튬 등이 대표적이죠. 영구자석, 레이저, 합금첨가제, 석유화학 촉매, X선 방출원 등 첨단 소재로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중희토류입니다.
특히 중희토류는 중국이 거의 100%를 생산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은 희토류를 자신들의 전략자원으로 삼고 있어요. 2010년 센카쿠 제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갈등 과정에서도 중국은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는 강수를 뒀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경희토류인 네오디뮴은 영구자석 소재인데, 전기차 모터 등에 쓰여요. 문제는 고온이 되면 자성을 잃기 때문에 이를 보존하기 위해 중희토류인 디스프로슘과 터븀이 필수로 들어가죠. 터븀의 경우 1kg당 1000달러가 넘을 정도로 비싼데, 생산량도 전 세계에서 연간 400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기차 수요는 늘어나는데, 모터 생산을 위한 소재는 공급이 충분치 않다는 얘기죠.
문제는 희토류가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면서 ‘탈탄소’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 정책과 부딪힌다는 점입니다. 희토류를 광석에서 분리하는 과정에서는 염산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산 혼합액을 사용해요.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1톤의 희토류를 생산할 경우 염산 6만m³(약 6000만 리터), 폐수 200m³(20만 리터), 방사능 1~1.4톤의 환경오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환경오염이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쉽사리 시작하지 못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론 중국이 환경오염을 야기하면서 전략자원 확보에 몰두한다는 비판을 받는 지점이지요. 실제로 선진국들이 희토류 생산을 확대하려다 환경단체 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중단된 사례가 많습니다. 그야말로 ‘필요악’이 돼버린 희토류, 석유 못지않게 중요한 자원을 놓고 전 세계의 소리 없는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중국이 환경오염을 야기하면서 전략자원 확보에 몰두한다는 비판을 받는 지점이지요. 실제로 선진국들이 희토류 생산을 확대하려다 환경단체 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중단된 사례가 많습니다. 그야말로 ‘필요악’이 돼버린 희토류, 석유 못지않게 중요한 자원을 놓고 전 세계의 소리 없는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고윤상 기자
2. 희토류가 전략자원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3. 전략자원 문제에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지 이야기해보자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