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호킹(1942~2018)은 그의 역작 <시간의 역사>(1988)에서 이같이 선언했다. 수학적 계산과 물리 법칙만으로 ‘신의 의도’에 다가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책은 ‘우주는 어떻게 시작했는가’ ‘블랙홀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등 질문을 던지며 전 세계적으로 2500만 부 넘게 팔렸다.
이내 호킹은 한계에 부딪혔다. 마치 누군가 정교하게 설계한 것처럼 우주는 ‘지나치게’ 생명에 우호적이었다. 암흑에너지와 우주배경복사, 중력 등이 조금만 어긋났어도 인간이 나타날 수 없었다. 우주의 기원을 함수로 풀어낸 그의 이론은 이를 설명하지 못했다. 호킹은 훗날 이렇게 말했다. “<시간의 역사>는 잘못된 관점에서 쓴 책입니다. 신과 같은 관점에서 우주를 바라볼 것을 권했지만, 우리는 우주 밖으로 나갈 수 없죠. 이제 신 놀음을 그만둘 때가 됐습니다.”
최근 출간된 <시간의 기원>은 ‘스티븐 호킹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이론’이란 부제를 달고 나왔다.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으니 호킹이 직접 쓴 책은 아니다. 그의 제자이자 공동 연구자로 20여 년을 함께한 토마스 헤르토흐가 호킹의 마지막 연구를 정리하고, 호킹과의 인간적인 에피소드를 소개한다.
호킹은 마지막 연구에서 빅뱅 이론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형이상학적 물리 법칙 대신 인간 관찰자의 시선에 주목했다. 만물을 굽어보는 ‘신’이 아닌, 땅을 살아가는 ‘벌레’의 시선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그러자 불변의 진리로 여겨졌던 물리 법칙도 우주의 탄생과 함께 진화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책 제목이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연상케 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저자와 호킹은 1998년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학생과 교수로 만났다. 호킹이 기계장치로 건넨 첫 마디부터 알쏭달쏭했다. “나와 함께 빅뱅 이론을 연구해줬으면 합니다. 다중우주에서 파생된 문제를 해결해야 하거든요.”
당시 과학계는 다중우주론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우리 우주 외에도 수많은 우주가 존재한다는 가설이다. 다중우주론에 따르면 무한대의 우주 중 생명체에 우호적인 공간이 생성될 경우의 수가 충분히 많다. 인간이 지금 같은 우주에 살게 된 것은 우연히 희박한 확률을 뚫은 결과라는 뜻이다.
호킹은 다중우주론에 회의적이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우주를 인간이 관측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우리가 어디쯤 있는지, 어디로 나아갈지 확인할 길이 없었다. 빅뱅의 미시 세계에 작용하는 양자역학의 문법으로 광대한 우주를 관장하는 상대성이론을 설명한 결과다. 아주 작은 세계와 아주 거대한 세계의 관계를 다룬 이 방정식에 인간이 설 자리는 없었다.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호킹은 인간을 중심에 세웠다. 빅뱅 직후 우주가 빠르게 냉각하며 우주를 관장하는 법칙 자체가 변했다고 봤다. 양자역학에 의하면 이런 진화는 현재 인간 관찰자의 관측에 따라 결정된다. 쉽게 와닿는 가설은 아니지만, 책은 “우주의 역사는 우리가 하는 질문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호킹은 2018년 세상을 떠났다. 지병이 악화한 마지막 10년 동안은 기계장치를 통한 소통도 어려웠다. 자신의 이론을 가장 활발히 설명해야 할 시기, 그의 시간은 육신에 갇힌 채 끝난 것이다. 저자의 입을 통해 그의 마지막 목소리를 전해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읽어볼 만한 책이다.
안시욱 기자 siook95@hankyung.com
관련뉴스




 “완벽한 이론을 찾는다면 … 신의 마음을 읽을 것이다.”
“완벽한 이론을 찾는다면 … 신의 마음을 읽을 것이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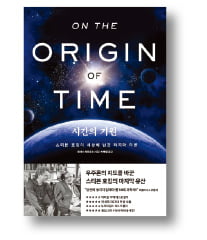 최근 출간된 <시간의 기원>은 ‘스티븐 호킹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이론’이란 부제를 달고 나왔다.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으니 호킹이 직접 쓴 책은 아니다. 그의 제자이자 공동 연구자로 20여 년을 함께한 토마스 헤르토흐가 호킹의 마지막 연구를 정리하고, 호킹과의 인간적인 에피소드를 소개한다.
최근 출간된 <시간의 기원>은 ‘스티븐 호킹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이론’이란 부제를 달고 나왔다.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으니 호킹이 직접 쓴 책은 아니다. 그의 제자이자 공동 연구자로 20여 년을 함께한 토마스 헤르토흐가 호킹의 마지막 연구를 정리하고, 호킹과의 인간적인 에피소드를 소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