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의 ‘동네 빵집’ 성심당은 지난해 매출 1200억원을 넘겼다. 대전에서만 딱 네 곳의 빵집을 운영해 거둔 성과다. 아니, 성과라고 하기엔 너무 작은 느낌이다. 동네 빵집의 ‘전설’, ‘신화’로 불려도 손색이 없겠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성심당은 1956년 문을 열었다. 70년 가까이 된 ‘노포’인데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매출이 늘었다. 크게 달라진 것도 없다. 매장을 더 늘린 것도, 신메뉴로 대박을 터뜨린 것도 아니다. 성심당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튀김소보로가 나온 건 1981년이다. 예전에 임영진 성심당 대표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사람들이 좋은 빵을 잘 알아본 것 같다”고 했다. 그땐 그저 겸손한 대답으로 여기고 넘겼는데, 요즘 보니 그냥 한 말은 아니었던 것 같다.
대전의 ‘동네 빵집’ 성심당은 지난해 매출 1200억원을 넘겼다. 대전에서만 딱 네 곳의 빵집을 운영해 거둔 성과다. 아니, 성과라고 하기엔 너무 작은 느낌이다. 동네 빵집의 ‘전설’, ‘신화’로 불려도 손색이 없겠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성심당은 1956년 문을 열었다. 70년 가까이 된 ‘노포’인데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매출이 늘었다. 크게 달라진 것도 없다. 매장을 더 늘린 것도, 신메뉴로 대박을 터뜨린 것도 아니다. 성심당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튀김소보로가 나온 건 1981년이다. 예전에 임영진 성심당 대표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사람들이 좋은 빵을 잘 알아본 것 같다”고 했다. 그땐 그저 겸손한 대답으로 여기고 넘겼는데, 요즘 보니 그냥 한 말은 아니었던 것 같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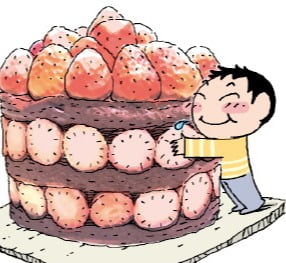 성심당의 작년 기준 매출 원가율은 52%였다. 빵집 프랜차이즈가 30%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높다. 재료를 아끼지 않고 듬뿍 넣어 맛있게 만든 빵이란 의미다. 성심당이 작년 말 내놓은 4만3000원짜리 딸기시루케이크도 그렇다. 케이크 무게가 2.3㎏인데 딸기만 800g이 들어간다. 10만원을 넘는 특급호텔 케이크보다 더 많은 재료를 넣었다. 그럼 남는 게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다. 매출의 약 25%를 영업이익으로 남겼다. ‘전국구 빵집 1위’ 파리바게트의 이익률(1.2%)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수익성이 좋다. 광고, 홍보, 판촉 같은 다른 비용을 최소화한 결과다.
성심당의 작년 기준 매출 원가율은 52%였다. 빵집 프랜차이즈가 30%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높다. 재료를 아끼지 않고 듬뿍 넣어 맛있게 만든 빵이란 의미다. 성심당이 작년 말 내놓은 4만3000원짜리 딸기시루케이크도 그렇다. 케이크 무게가 2.3㎏인데 딸기만 800g이 들어간다. 10만원을 넘는 특급호텔 케이크보다 더 많은 재료를 넣었다. 그럼 남는 게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다. 매출의 약 25%를 영업이익으로 남겼다. ‘전국구 빵집 1위’ 파리바게트의 이익률(1.2%)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수익성이 좋다. 광고, 홍보, 판촉 같은 다른 비용을 최소화한 결과다.좋은 재료를 쓰고, 원가 비중을 높이고, 품질에 집중해 성공한 곳은 비단 성심당뿐만이 아니다. 화장품 시장엔 최근 큰 변화가 있었다. 그 핵심이 바로 비주류 화장품, ‘인디 브랜드’의 선전이었다. 브랜드보다는 내용물에, 광고보다는 효능에 초점을 맞춘 게 인디 브랜드다. 틱톡,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화장품 지식을 습득하고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화장품을 찾아내는 게 일상적 소비로 자리 잡으면서 급부상했다. 인디 브랜드의 ‘성지’ CJ올리브영은 국내 화장품 최강자가 됐다. 백화점에서 팔진 않지만 온라인과 SNS에서 화제가 된 상품을 빠르게 매장에 가져다놓는 전략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 약 3조8000억원을 거뒀는데, 이는 국내 ‘양대’ 화장품 기업인 아모레퍼시픽(약 3조6000억원)과 LG생활건강 화장품 부문(2조8000억원)보다 많은 것이다.
반면 기존 명성에 기대 원가를 아끼고 품질 개선을 등한시한 주류 브랜드 일부는 ‘재앙’을 맞고 있다.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 계열 명품 브랜드 디올이 그렇다. 지난 6월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은 ‘의도치 않게’ 디올 백 원가를 공개했다. 명품 하청 업체 노동 착취 문제를 다루면서 내놓은 판결문엔 하청사의 납품단가가 담겼다. 단돈 58유로(약 8만원)였다. 이 백은 디올 유럽 매장에서 2600유로(약 385만원)에 팔린다.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것도 아니었다. 중국, 필리핀 등에서 온 불법 체류자들이 휴일도 없이 밤을 새워가며 납품한 것이다. 디올 불매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했고, 매장 앞 긴 대기줄은 사라졌다.
디올뿐만 아니라 다른 명품 브랜드에 대한 신뢰까지 떨어뜨렸다. 7월 국내 백화점의 해외 명품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11% 감소했다. ‘디올 사태’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유통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 일이 있기 전 명품의 원가에 관심조차 없던 소비자들이 이제 원가를 따지기 시작했다. 매년 비슷한 제품을 내놓으면서 가격을 계속 올린 명품은 이제 ‘돈값’을 하는지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나이키의 퇴조도 그렇다. 한때 나이키는 ‘마케팅의 교과서’란 말을 들었다. 제조는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주로 맡기고 본사는 광고·마케팅에 주력했다. 이 전략은 수십 년간 유효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소비자들은 좋은 마케팅이 아니라 좋은 제품을 더 원했다. 하지만 나이키는 매년 비슷한 제품을 우려먹다가 소비자로부터 외면받았다. 그새 못생겼지만 오로지 품질에 집중한 스위스 온러닝 같은 브랜드가 확 떠올랐다.
‘예술 혼’을 담아내듯 품질에 집중하고 원가를 아끼지 않은 비주류 브랜드의 부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인공지능(AI) 등 온갖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고, 이들은 ‘귀신같이’ 제2의 성심당과 온러닝을 발굴할 것이기 때문이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