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 자주 먹던 거에요.”
“어머니 이름이에요, 손맛이 대단했죠”
“정신없이 뛰놀던 동네 뒷동산 이름입니다.”
“특별할 게 있나요, 그냥 생각나는대로...”
동네 간판의 출신배경에는 이러저러한 사연들이 참으로 많다.
사람마냥 판이한 얼굴에 이름과 행색도 제각각이다.
시골 가게는 촌스럽고 유치하며 도시 가게는 감각적이며 화려하다.
아버지 간판에는 삶의 고달픔이 있고 아들에는 그 고달픔이 만든 이야기가 있다.
그에겐 특별한 규칙도, 엄청난 기술도, 탄탄한 배경도 없다.
어떻게든 살겠다는 간절한 바램, 그리고 그 염원이 만들어 낸 시행착오가 전부이다.
그는 살아있는 생명체다. 돌보고 가꿀수록 성장하며 빛을 발한다. 시간에 순응하며 넉넉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때로는 태어나자 마자 병치레를 시작한다. 견디다 못해 세상을 등질 때도 있다.
한번 아픔을 이겨낸 생명체는 더욱 견고해지고 또렷해진다.
그리고 그 끝은 세대를 너머 세상을 바꾸기도 한다.
간판의 사전적 의미는 ‘타인과 비교해 자신만의 능력과 특징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표지 또는 행위’이다.
달라야 주목 받고 관심을 얻어야 선택 받을 수 있는 세상.
실제 잘난 누군가의 특별하고 화려한 간판은 타인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다.
성공의 지름길이자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음식점 간판은 더욱 극적이다.
몇 년전 국내 한 방송사가 간판을 주제로 실험을 했다.
거리의 화려한 간판이 사람들의 눈에 얼마나 잘 띄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카메라는 걷고 있는 보행자의 시선에 집중했다.
그러나 눈동자의 움직임은 매장주인의 바램과는 한참 어긋났다.
보행자가 한 지점에 머무는 시간은 겨우 0.3초에 불과했다.
도대체 우리들은 무엇을 본 것일까?
걷기에 그저 바빴고 인식하기엔 너무 귀찮았다.
그럴수록 간판은 더 공격적이고 과감해졌다.
덩치는 커지고 색깔은 농염하며 압박은 여지없다.
피곤한 시선의 머무름은 더욱 짧아졌고 그럴수록 간판의 성마름은 더해졌다.
짧은 생각이 애달픔을 키운 것이다.
내 방식 내 맘대로 다가섰고 내 얘기만 늘어놓았다.
들어줄거라 믿었고 기억할거라 확신했다.
그러나 착각이었다.
잘난 스펙의 사람보다,
내 이야기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더욱 그리운 세상이다.
우리에겐 그들이 아닌 우리의 이야기를 담고 싶기 때문이다.
“지치고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이 미치도록 그립습니다.”
간판은 세우기보다 만들어진다.
간판은 연출이 아닌 연줄에 있다.
그런 간판일수록 멋이 있고 맛이 있다.
뜨끈한 국밥 한 그릇, 시어터진 묵은 김치, 투박한 된장 뚝배기.
우리를 오랫동안 위로해온 음식에는 소박함과 단순함 그리고 기다림이 있다.
문 밖을 나서면 쉬임없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0.3초의 간판,
그 간판을 통해 우리들의 먹고 사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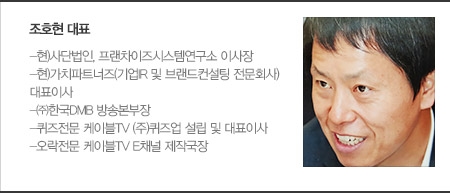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