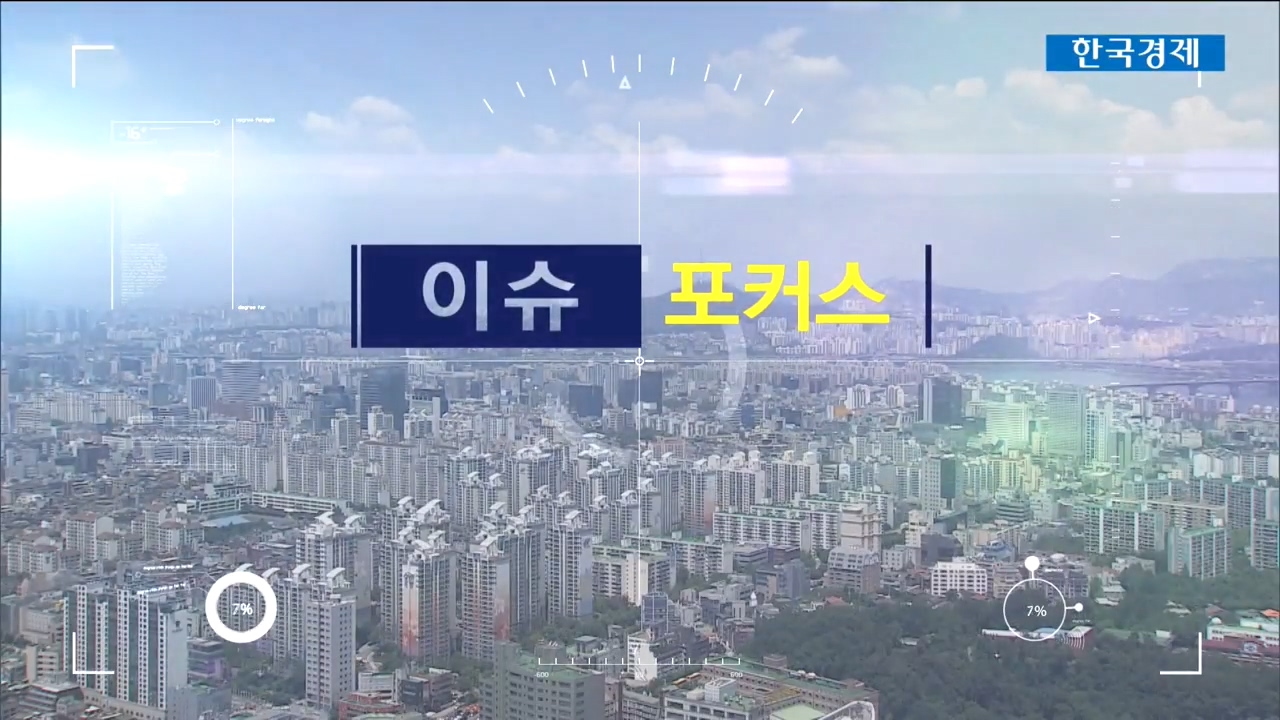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들 짚어보는 이슈포커스 시간입니다. 신용훈 기자 나와있습니다.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를 꼽자면 바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는 것일 텐데요.
시행 전후로 주택시장 분위기 어떻게 달라졌는지 먼저 짚어주시죠
<기자>
가장 큰 변화는 청약조정대상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매기가 쏠림 현상이 본격화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은 미리 예고가 됐던 만큼 올 초부터 조정지역 이외 지역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올초부터 3월까지 수도권 비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들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5.86대1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올 2월에 분양했던 용인 수지구의 성복역롯데캐슬파크나인의 경우는 1순위 청약경쟁률이 무려 39대1이나 됐었고, 부천시 괴안동의 e편한세상온수역은 31대1을 기록했습니다.
3월에 분양된 시흥시 장현동의 시흥장현제일풍경채의 경우도 13대1로 1순위 마감이 되는 등 전반적으로 비 청약조정대상지역이 반사이익을 보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이할 만한 지역이 바로 김포시 입니다.
김포는 최근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부산 서구, 강원도 원주시와 함께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추가한 곳 이거든요.
그런 김포가 최근에 다시 분양 열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대건설이 이번 주 청약에 나선 힐스테이트 리버시티의 경우 3천500여세대에 대단지 여서 당초 분양에 어려움이 있을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전체 48개 타입 가운데 9개를 뺀 39개 타입이 모두 1순위에서 마감되는 성적을 거뒀습니다.
실수요자 뿐 아니라 투자목적의 수요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김포지역 분양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병욱 경기도 김포시
"투자 목적으로 투자목적도 있고…위치가 주변이 아직 개발이 덜 된 상태라 조금 리스크는 있죠 그런데 그걸 감안하고 투자 하는 거죠"
<인터뷰>장은경 경기도 김포시
"앞으로 시네폴리스나 한강 쪽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래도 김포가 괜찮을 것 같아요"
<앵커>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이후 비 청약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투자 쏠림 현상이 본격화 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열지구를 옥죄는 쪽으로 간다면 앞으로 이런 쏠림 현상은 심화될 가능성이 높겠군요?
<기자>
물론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규제 이외 지역으로의 풍선효과 강도가 점점 세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조정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을 청약할 때는 다 주택자라도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는데다 나중에 팔 때 2주택자 10% 3주택자 20%의 추가 세율이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자금이 지속적으로 몰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비 조정대상지역이라 할 지라도 지역별 온도차는 있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서울과의 거리가 가깝거나 연계 교통 인프라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희비가 엇갈릴 것이란 겁니다.
또 올해부터는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임대수익률이 높지 않은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시도는 청약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반사이익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높은 것이란 전망입니다.
<앵커>
분양시장에서 서울과 근접한 비 조정지역으로 청약 쏠림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는 소식 살펴봤고요.
주택시장 이슈 가운데서 또 하나 눈여겨 볼만한 것이 전국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서 강남 4구를 포함해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많이 꺾인데다 지방은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주비 기자의 리포트 보시죠.
<앵커>
비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반사이익도 지방은 비껴가고 있는 셈이군요
<기자>
네, 전반적인 주택시장이 침체기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나마 강남 재건축 이슈가 있는 서울이나 비 조정대상지역 호재가 있는 수도권은 보합세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지방은 이미 시장 하락기에 접어들었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미분양 물량만 보더라도 지방은 7년만에 5만가구를 넘겼습니다.
지역별로 특별한 호재가 없는 한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악성미분양으로 남게 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2015년 이전 겪었던 공급과잉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신기자 수고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