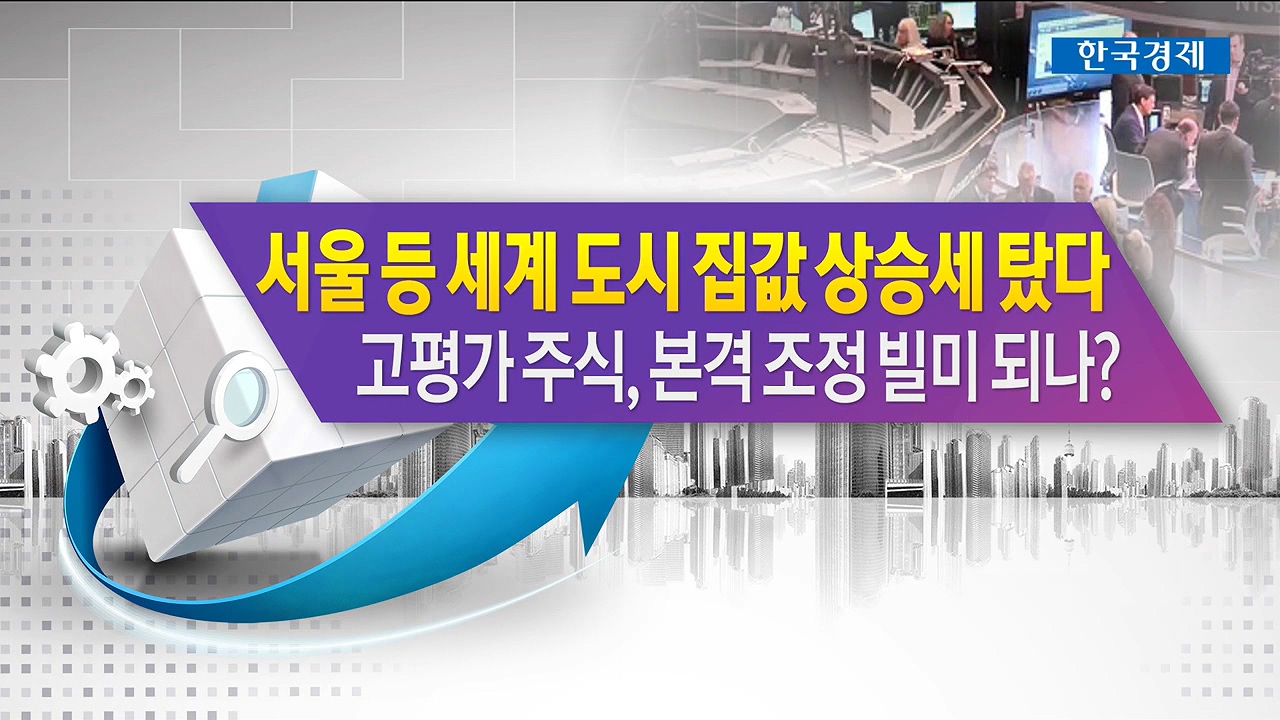미국 하락세도 멈춰
Q. 미국 시간으로 오늘부터 양일 간 연준 회의가 열리는 날인데요. 증시는 계속해서 오르지 않았습니까?
-美 3대 주가, 고용지표 호조로 상승세 지속
-5월 일자리 증가, ‘fake’가 아니라 ‘error’로
-유동성 장세에서 ‘펀더멘털 장세’로 이행
-FGI, 1달 전 ‘44’→1주 전 ‘58’-> 6월 7일 ‘67’
-코로나 사태 이후 달러 가치 최저치로 하락
-달러인덱스, 3월 20일 103대→6월 9일 96대
-어제 원·달러 환율, 장중 한때 1200원 붕괴
Q. 지난 3월 중순 이후 세계 증시가 무섭게 달아오르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 그 열기가 주택시장으로 이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 부동산 시장 꽁꽁 얼어붙어
-사회적 거리두기, 특히 상업용 부동산 침체
-거래금액 클수록 상업용 부동산 ‘거래 절벽’
-주택시장, 재택근무 등으로 상대적으로 양호
-이달 들어 서울 집값 상승세, 확산조짐 주목
-차별화 심화, 지방 주택시장은 침체국면 지속
Q. 눈에 띠는 것은 서울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거래량도 같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거래량·거래규모 클수록 ‘부동산 선행지표’
-코로나 직후 강남 3구, 300건 밑으로 위축
-지난달에는 거래규모 5백건 이상으로 증가
-서울 전체적으로 3,430건…전월比 13.6%↑
-9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 거래도 꾸준히 늘어
-지난달 고가아파트 거래량 690건, 4월 571건
-고가아파트 가격하락 주도 강남구, 급매물 해소
Q. 증시에 이어 주택시장에 왜 훈풍이 부는지 그 요인들을 분석해주시다면?
-코로나 사태 이후 유동성 가장 많이 풀려
-금융위기 이후, 출구전략 제대로 추진 못해
-코로나 사태 이후 무제한 유동성 공급 겹쳐
-물가 감안한 실질예금금리, 마이너스 국면
-은행에서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머니 무브’
-은행 저축성 예금, 4월 551조원->5월 544조원
-플렉스 세력, 고가 주식과 부동산으로 자금이동
Q. 방금 전에 ‘플렉스’라는 용어를 말씀하셨는데요. 무슨 의미인지 왜 이들 세력이 자산시장에서 영향을 발휘하는지도 말씀해주시지요.
-플렉스(Flex), 근육을 구부려 자신의 힘 과시
-일시불로 많은 돈 쓰며 주변에 자기 자랑
-똠방각하, 소설가 최기인이 쓴 소설에서 유래
-소득 양극화 심화, 자산가일수록 세력 확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창의력과 기술력 지배
-피케티의 자본론, 소득 양극화 갈수록 심화
Q.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 주택시장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세계주택시장, 경제활동 재개 시기별 온도차
-4월 재개된 중국, 일부 도시 집값 상승세
-5월에 본격 재개됐던 미국, 하락세 멈춰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 본격적인 하락세
-주택시장 온기, 상업용 건물 확산 여부 주목
-3분기 이후에는 호텔 중심 완만한 회복국면
-보잉 등 항공·여행 등 관련 주가 ‘상승세’
Q. 불과 2개월 반 전에는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주가가 오른 만큼 최근 주택시장에 훈풍이 부는 것은 주가 조정의 빌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가 회복 속도, 글로벌 증시 역사상 가장 빨라
-다우, 3월 23일 18,591→6월 8일 27,575…46%↑
-코스피, 3월 19일 1,457→6월 8일 2,184…49%↑
-월가와 여의도, 밸류에이션 부담과 고평가 논쟁
-로버트 실러의 CAPE 26배, 적정수준 24배
-한국 PER 25배, 2002년 7월 이후 최고수준
-유동성 과다시, 주가와 부동산 간 선순환 관계
Q. 코로나 사태로 경기가 어려울 때에는 주택시장이 살아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 중앙은행 자산효과 노려
-기준금리 제로와 QE 통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집값 상승→자산 증가→소비 증가→경기 회복
-한국,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 효과 가장 커
-그린스펀, 美 집값 하락 따른 자산 효과 ‘0.09’
-韓, 아파트 가격 하락에 따른 자산 효과 ‘0.23’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