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언론인의 英 금융가 탐사기 '상어와 헤엄치기' 출간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2008년 엄청난 금융위기가 세계를 휩쓸었다. 많은 사람이 탐욕적인 금융 자본주의의 폐해를 목격했고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분출했다. 그로부터 1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지금, 세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 답을 구할 수 있는 책이 네덜란드 언론인 요리스 라위언데이크의 '상어와 헤엄치기'(원제: Dit kan niet waar zijn)다.
유명 논픽션 작가이기도 한 라위언데이크는 2011년 영국 일간지 가디언으로부터 제안 하나를 받았다. 런던 시티(The City) 내부를 취재해 그 내용을 블로그에 게재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시티는 유럽의 금융 수도인 런던에서도 증권사와 보험사, 거대 은행들이 밀집한 지역이다. '가디언'의 제안은 최악의 금융위기에도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시티의 풍경은 금융위기 이전과 달라진 점이 없는 듯했다.
'상어와 헤엄치기'는 작가가 2011년부터 2년 반 동안 런던 금융계 종사자 200여 명을 만나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기록한 것이다. 그는 홍보팀으로부터 의례적이고 정돈된 답변을 듣는 대신, 대담한 '내부자들'을 찾아 나섰다. 프로젝트를 시작할 당시만 해도 '금융맹'이나 다름없는 상태였던 외국 언론인의 대담 요청은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 블로그가 점점 알려지는 것과 동시에 헤지펀드 매니저, 회계 담당자, 인사 관리자, 해고 직원들이 '침묵의 규칙'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책은 금융위기 이후 5년이 흘렀지만(인터뷰 당시 시점) 달라진 것이 없음을 보여준다. 규제가 강화된 듯 보이지만, 소수 금융기관이 시장을 독식해 거액을 버는 구조와 틈새시장은 그대로다. 가장 충격적인 문제는 바로 '텅 빈 조종석'이다. "은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위기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금융 시장에 무지했음을 한탄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모르고 있다.
금융인 개인의 탐욕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들이 눈앞 이익에 쫓겨 일탈하게끔 만드는 시스템이라는 게 저자의 판단이다. 그 핵심에는 회사 출입카드를 찍었을 때 울리는 경보음을 듣고서야 자신이 잘린 사실을 알 정도로 폭력적인 해고 문화가 있다. "5분 후에 문밖으로 쫓겨날 수 있다면, 사람들의 시야는 5분짜리가 된다."
저자가 금융의 블랙홀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안하는 것은 금융의 단순화다. 은행들을 작은 규모로 쪼개고, 지나치게 복잡한 금융 상품을 설계·운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객들은 자신이 무엇을 사는지, 은행 대차대조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책은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등이 금융기업의 자문을 맡거나 엄청난 강연료를 받는 현실을 중간중간 지적하는 일도 잊지 않는다.
한 권의 소설처럼 흥미롭게 읽히는 책이다. 금융의 세계를 인류학 현장연구 기법을 활용해 탐사한 덕분이다. 가령 금융을 하나의 행성으로, 자산운용·은행업·보험업을 대륙으로 표현하는 등 쉽게 이미지화하는 작가의 능력도 일조했다.
저자는 서구 이방인의 눈으로 이집트 사회를 바라본 '좋은 남자가 종종 아내를 때린다'(1998), 5년의 아랍 특파원 경험을 바탕으로 중동 문제를 보도하는 서구 언론의 프레임을 고발한 '웰컴 투 뉴스 비즈니스'(2006) 등으로 주목받았다. '상어와 헤엄치기'는 2015년 네덜란드에서 발간 당시 30만 부 넘게 팔리며 그해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열린책들. 김홍식 옮김. 416쪽. 1만7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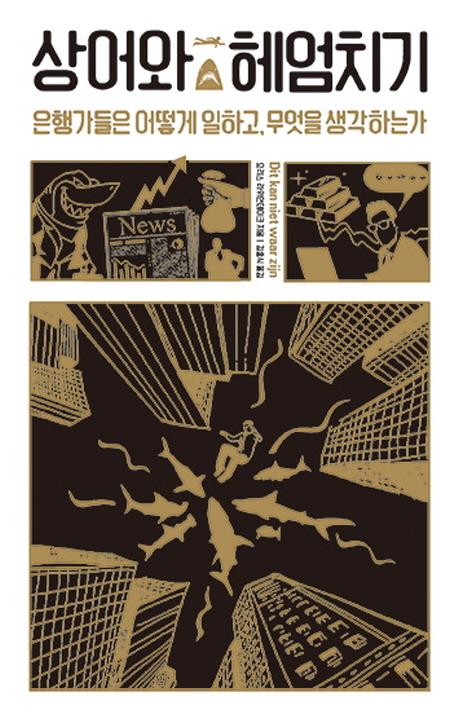
ai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