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구결과…피검사로 10~20년 전에 치매 위험도 예측법 개발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최병국 기자 = 중년에 전신성 염증을 심하게 앓으면 나중에 뇌가 줄어들어 치매에 걸릴 위험성이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키넌 워커 교수팀이 발표한 이 결과는, 아직 더 연구를 해야 하긴 하지만, 40~50대에 간단한 혈액검사로 10~20년 뒤 치매에 걸릴 위험도를 예측하는 방법의 개발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알츠하이머 등 치매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지만, 염증과 면역반응도 관련 있다는 가설이 있었다. 예컨대 치매 환자 중에서도 흉부나 요로 감염자는 기억력 상실 속도가 빨라진다거나 염증 치료가 치매 증상을 완화한다는 등의 연구결과도 있다.
염증은 원래 부상이나 감염에 대응하는 인체의 정상적 반응인데 중년에 당뇨·고혈압·급격한 체중 증가 등 여러 질병을 앓는 사람 가운데 극단적 과잉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단순 염증과 구별해 인체 면역체계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전신성 염증(systemic inflammatory)으로 부르며, 이로 인해 뇌 구조 등에 변화가 일어나고 뇌세포가 파괴돼 알츠하이머 등 신경퇴행성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도 이해됐다.
워커 교수팀은 45~65세(평균 53세) 1천600여 명을 대상으로 혈액검사로 전신성 염증이 있음을 보여주는 생체지표를 측정했다. 여기엔 섬유소원·알부민·백혈구 수·폰빌레브란트 인자(因子)·제8 인자 등 5가지가 포함됐다.
연구팀은 24년이 지난 뒤 이들의 뇌 입체 영상을 찍고 기억력 테스트를 했다.
그 결과 염증 지표가 3개 이상 있었던 사람들의 뇌 크기가 지표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기억력 및 치매와 관련된 뇌 부위가 5% 이상 작았다.
뇌 내부 공간인 뇌실의 크기는 평균 1천788입방밀리미터(㎣) 큰 반면에 기억 기능과 관련 있는 해마 크기는 110㎣, 시각기능 등을 담당하는 후두엽은 519㎣ 작았다.
전신성 염증의 정도가 한 등급 높아질 때마다 알츠하이머 위험을 높이는 APOE e4 유전자 한 카피가 늘어나는 정도의 영향이 있었다.
또 염증지표가 3개 이상이었던 사람들의 기억력 성적이 평균 10% 낮았다. 나이가 더 젊을 때 염증지표가 있었던 사람일수록 뇌 크기도 더 많이 줄었다.

워커 교수는 "이는 면역체계 이상반응이 치매의 중요 원인 중 하나라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이자 중년의 전신성 염증이 알츠하이머를 비롯한 치매와 관련된 뇌의 변화를 조기에 보여주는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염증지표 측정을 한 번 밖에 하지 않은 데다 기억 관련 뇌 크기가 줄어든 사람들이 실제 치매에 걸렸는지를 조사하지 않은 점 등의 한계가 있다.
그러나 뇌세포 손상과 소실 과정은 증상이 나타나기 몇십 년 전부터 시작되는 반면 아직 10~20년 전에 발병 위험도를 예상하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어서 추가 연구를 통해 간단하고 정확한 예측법이 개발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높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 연구결과는 미국신경학회(AAN) 학술지 '신경학'(Neurology) 최신호에 실렸다.
choibg@yna.co.kr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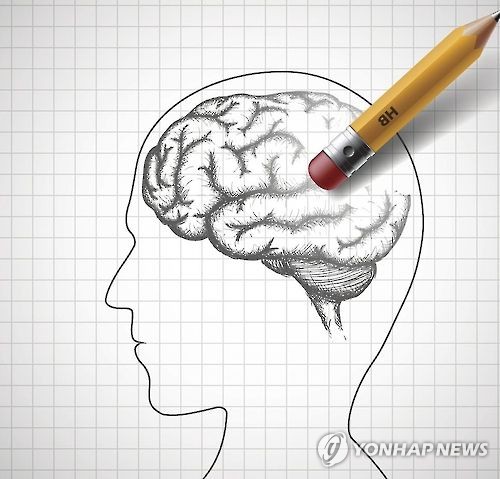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