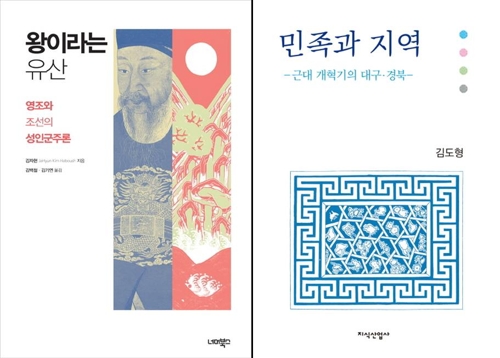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 왕이라는 유산 = 김자현 지음. 김백철·김기연 옮김.
조선왕조의 유교적 군주상과 영조의 치세를 분석했다. 2011년 별세한 김자현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1978년 영문으로 쓴 박사학위 논문을 보완해 1988년 펴낸 책을 우리말로 옮겼다. 미국에서는 전통시대 한국학 연구의 입문서로 알려졌다.
저자는 영조가 펼친 대표적 정책인 탕평책을 '붕당을 균등하게 만들거나 무력하게 하려는 시도'로 간주하는 학계의 견해에 회의감을 드러낸다.
그는 "영조가 붕당을 완전히 파괴하려 했다기보다는 붕당정치의 대안을 모색했다고 봐야 한다"며 "탕평을 통해 유혈사태를 피하고 조정 안에서 붕당 간 논쟁을 침묵하게 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면서 영조가 아들인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인 사건을 통치자와 개인 사이의 모순이 발현된 일로 해석한다. 영조는 끊임없이 탕평을 유지하면서 균역법 같은 정책을 추진해야 했기 때문에 사도세자와는 부자(父子)의 정을 나눌 여유마저 없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영조는 개인적 비극에 구애받지 않고 죽을 때까지 지속해서 성인 군주상을 추구했다"며 "목표의 이상과 통치의 현실 사이의 차이는 사도세자의 죽음과 같은 사적인 부분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역자인 김백철 계명대 교수는 "탕평을 주제로 한 박사학위 논문은 국내에서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나타났다"며 고전의 디지털화가 이뤄지기 전에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 저자의 노고를 칭송했다.
원제는 'The Confucian Kingship in Korea'.
너머북스. 448쪽. 2만5천원.
▲ 민족과 지역 = 김도형 지음.
연세대 사학과 교수로 일하다 최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 취임한 저자가 대구·경북 지역의 1860∼1920년대 민족운동사를 정리한 책.
저자가 조선 후기에서 대한제국, 일제강점기로 이어지는 시기의 역사를 조명하면서 대구·경북 지역이라는 공간을 주목한 이유는 이곳만큼 시대적 모순이 잘 드러나는 장소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북에서는 농민층이 급격하게 몰락하면서 많은 사람이 농민항쟁과 3·1 운동에 참여했고, 대구에서는 소수 자본가와 빈곤층 사이의 격차가 매우 크게 벌어졌다.
저자는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저항 정신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분석한다.
그는 경북 유생들이 퇴계의 학맥을 이은 남인으로서 서양 문명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냈으나, 일부는 계몽운동 노선으로 전환해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다고 설명한다. 또 대구에서 벌어진 국채보상운동과 일제에 항거한 의병 운동의 특징과 의의를 논한다.
그는 "지방은 언제나 중앙에 대해 종속된 위치였고, 근현대에 들어서 (종속의 정도는) 더 심화했다"면서도 "지방에서 일어난 사회운동이 한국 전체의 변혁을 주도했다"고 강조한다.
지식산업사. 432쪽. 2만5천원.
psh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