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호 교수, '중국 불상의 세계' 출간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지난해 강원도 양양 진전사지에서는 성인 손바닥만 한 8.7㎝ 크기의 자그마한 6세기 금동삼존불이 발견됐다.
불꽃무늬인 화염문이 있는 광배(光背·빛을 형상화한 불상 뒤쪽의 장식물) 일부와 받침대 역할을 하는 연꽃무늬 좌대가 조금 떨어져 나갔지만,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출토지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국보급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중국에는 이 불상과 매우 흡사한 유물이 있다. 난징(南京)에서 나온 6세기 금동삼존불로, 본존불에 부처가 아닌 보살을 둔 형식이나 전반적 생김새가 형제처럼 닮았다. 우리나라 불상 기법이 중국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미술사 연구자이자 문화재위원인 배재호 용인대 교수가 쓴 '중국 불상의 세계'는 1세기부터 청대까지 약 2천 년 동안 벌어진 중국 불상의 변화 양상을 추적한 책이다.
지난 2005년 국내 최초로 중국 불상 개설서 '중국의 불상'을 펴냈던 저자는 13년 만에 내놓은 신간에서 분량은 줄였으나, 원·명·청의 불상과 관련된 내용을 보강하고 최신 미술사 이론을 반영했다.
저자는 중국 불상의 특징으로 다양성을 꼽는다. 그는 "우리나라 불상의 얼굴은 큰 변화가 없지만, 여러 민족에 의해 조성된 중국 불상은 그들의 심미안에 따라 얼굴의 변화가 많았다"며 "중국 불상은 얼굴 표현과 신체 비례, 몸과 옷의 유기적 관계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설명한다.
그는 인도에서 건너온 불상이 점차 중국화해 수·당 시대에 전성기를 이뤘고, 송대에는 불상이 대중화했다고 주장한다. 이어 원대부터는 티베트 불교의 영향이 느껴지는 불상이 등장했다고 강조한다.
시대순으로 중국 불상을 서술한 저자는 마지막 부분에서 둔황(敦煌) 막고굴(莫高窟), 윈강(雲崗)석굴, 룽먼(龍門)석굴 등 중국 각지에 있는 석굴을 소개한다.
중국 불상의 흐름을 한 권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점은 성과라고 할 수 있으나, '중국의 불상'에 이어 이번 책도 도판이 컬러가 아닌 흑백이라는 점이 아쉽다.
경인문화사. 336쪽. 2만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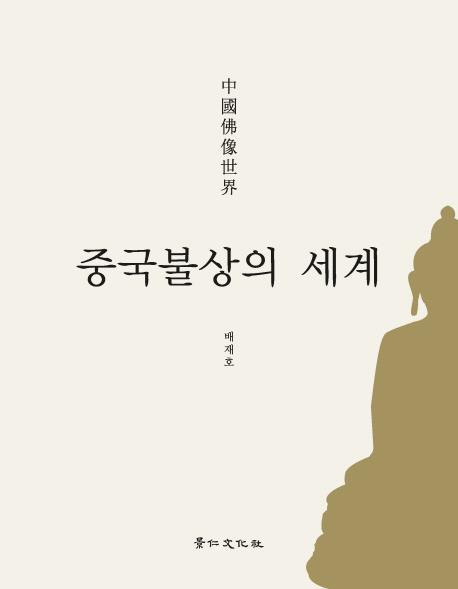
psh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