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빛 모서리'로 호평받고 절필…오랜만에 신작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돌아온 탕자가 있다면 이런 느낌 아닐까요(웃음)? 성서 속 탕자는 뭔가 다른 사람으로 나타난 것 같은데 저는 약간의 변화 정도를 안고 집으로 돌아온 느낌입니다."
1993년 첫 시집 '황금빛 모서리'로 문단의 호평과 독자들의 지지를 받은 김중식(51) 시인이 25년 만에 두 번째 시집 '울지도 못했다'(문학과지성사)로 돌아왔다.
시인은 이번 시집 뒤표지에 "첫 시집이 고난받는 삶의 형식이었다면, 이번 시집은 인간의 위엄을 기록하는 영혼의 형식이다", "짠맛 없는 바다가 없듯이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삶은 없다.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다른 세상은 없다. 좀 더 나은 사람을 향하여 갈 뿐이다. 세상은 딱 그만큼 달라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썼다.
그는 19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지난 25년간 달라진 것을 이렇게 부연했다.
"첫 시집 때는 제 비전이 혁명가 아니면 선승이 되는 것이었을 텐데 둘 다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삶이었고, 그만큼 힘들게 사는 방법이 시인의 길이었던 듯해요. 그땐 제가 엄숙주의자, 극단주의자였는데 살다 보니 사람들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도 나름대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는 세상이 지옥 같은 사막이라 하더라도, 진부하지만, 사랑이라든가 공동체 헌신이라든가 이런 가치를 가지고 간다면 우리가 같이 건너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세상만 아니라면 어디라도 가자,/해서 오아시스에서 만난 해바라기/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르겠으나/딱 한 송이로/백만 송이의 정원에 맞서는 존재감/사막 전체를 후광後光으로 지닌 꽃//앞발로 수맥을 짚어가는 낙타처럼/죄 없이 태어난 생명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성모聖母 같다/검은 망사 쓴 얼굴 속에 속울음이 있다/너는 살아 있으시라/살아 있기 힘들면 다시 태어나시라" ('다시 해바라기'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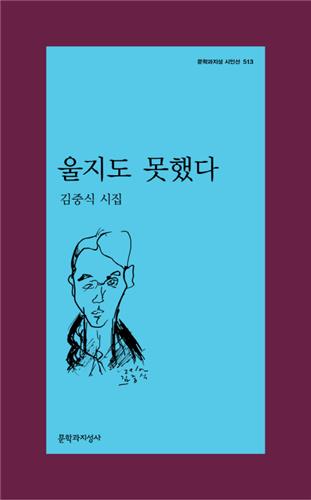
그는 첫 시집을 탈고하고 1997년 경향신문에 들어가 기자로 일하다 나와 2007년부터 국정홍보처에서 공직 생활을 했다. 대통령 비서관실에서 참여정부 성과를 정리하는 책을 쓰고 대통령 연설문도 만들었다. 이후 2012년 3월부터는 3년 반 동안 주이란한국대사관에서 문화홍보관으로 일했다. 다시 본격적으로 시를 쓰게 된 것은 이란에서다.
"전에도 간혹 메모는 했는데 거기서 집중적으로 쓸 수 있었던 건 금욕의 나라여서 밖에서 놀만 한 거리가 없다는 점이 컸어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운동도 하는데도 밤새도록 온전히 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죠. 한국에서는 갖기 어려운 시간이죠."
그는 지금은 옛 국민의당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혁명이 아니면 사치였던 청춘/뱃가죽에 불붙도록 식솔과 기어온 생/돌아갈 곳 없어도 가고 싶은 데가 많아서/안 가본 데는 있어도 못 가본 덴 없었으나//독사 대가리 세워서 밀려오는 모래 쓰나미여,/바다는 또 어느 물 위에 떠 있는 것인가/듣도 보도 못 한 물결이 옛 기슭을 기어오르고/두 눈은 침침해지고 뵈는 건 없는데" ('그대는 오지 않고' 부분)
"어떤 인간이든 경제적 자유와 시간이 없다면 어떤 행복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전에 청춘 시절에는 미래를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그 짓(시쓰기)만 하며 살겠다 할 때는 영혼과 정신이 그런 경제적 부자유도 당연히 돌파해야 한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경제적 자유 없이는 누구든 자기를 위한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죠. 현실적으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바쳐서 한국 시의 극점에 도전해볼 수 있는 시인은 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 외에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경제적 부자유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 절대 빈곤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번 시집 첫머리에 아내에게 바치는 헌사를 담았다.
"아내가 저를 거둬줘서 지금까지 길러준 예술적 후원자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아내가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대신에 제가 가족을 건사하는 위치에 있었더라면 가정은 분명히 해체됐거나 파괴됐을 텐데, 그 반대여서 지금까지 버텨온 것 같아요. 우리 사회의 발전이나 진보를 평가하는 잣대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여성의 삶의 질을 기준으로 삼는 게 올바른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제 딸을 포함한 우리 시대 딸들이 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게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이라 생각해요."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