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d의 '고용' 조항을 오해한 결과
새 총재는 중립성 가치 잊지 말라
정규재 논설위원실장 jkj@hankyung.com
한국은행 총재 후보를 논하는 자리마다 등장하는 학력·학연 및 영어능력과 인맥 따위의 스펙론을 듣고 있노라면 우리 사회의 부박함을 새삼 떠올리게 된다. 특정 후보의 고교 시절 천재성에 대한 회고들도 그렇다. 학교 성적은 그렇게 한국인의 골수에 박힌 단어다. 판사들은 옷을 벗을 때까지 사시 성적표를 등에 붙이고 다닌다지 않는가. 아무도 판결에 주목하지 않는 것처럼 한은의 임무를 따져 총재 자격을 논하는 사람도 없다.
지난주 ‘한은의 기능과 역할’을 둘러싼 논전은 총재 후보들에 대한 하마평과는 별도로 적지않은 관심을 모았다. 발표자는 “통화 정책 외에 경제성장과 고용증대, 적절한 소득분배로까지 한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한은 내에서는 꽤 인기가 있는 주장인 모양이다. 세미나 주최자인 한은의 내밀한 욕망을 드러낸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곤란하다. 위험한 발상이다. 업무 범위를 그렇게 확장한다면 한은은 필시 머지않아 정부의 하수인이 되거나 하나의 부처로 전락하고 만다.
발권력을 동원하자는 유혹은 언제나 철없는 연애처럼 달콤하다. 지난주의 금융위원회만해도 그랬다. 정부는 한은으로 하여금 주택금융공사에 추가로 1500억원을 출자하고 주택저당증권(MBS)도 본격적으로 매입하도록 요구했다. 발권력을 동원해 공기업 부채와 자본금을 확충한다는 기발한 발상은 한국 정부의 전매 특허다. 공기업 부채 감축이라는 이 난리통에서도 금융관련 공기업 부채는 슬쩍 예외로 해놓았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기발한 관료들이다.
물론 한은 총재들로서는 유혹과 압력을 동시에 받을 것이다. 김중수 총재 역시 금리인하를 거부하는 대신 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슬쩍 끼워 넣었었다. 이름도 금융중개지원대출로 바꾸어 달았다. 언어는 이렇게 종종 진실을 가리는 데 악용된다. 한은 업무의 확대는 과연 반길 일인가. 그럴 리가 없다. 한은 출자금에는 이자도 비용도 없다. 찍어내면 된다. 조달 코스트가 없기 때문에 적정 자본이나 부채에 대한 분석도 판단도 불가능하다. MBS 매입도 마찬가지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양적완화라는 이름으로 MBS를 매입하고 있으니 우리라고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인지 모르지만, 미국은 제로 금리다. 그것도 공개시장 개입의 담보물이다.
만일 공기업 부채를 한은이 직접 매입해주기로 든다면 세금을 걷을 필요도 없고, 공기업 부채를 걱정할 까닭도 없고, 국가부채 운운하며 재정건전성을 따질 이유도 없다. 아예 세금을 폐지하고 발권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떨지. 한은은 이미 수출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주주다. 세금으로 할 일을 발권으로 대체했다.
금리정책은 원래 재미가 없다. 그것은 동심원적이어서 차별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다. 그래서 행사할 권력도 없다. 권력은 선택적이어야 짜릿하다. 개펄에 밀물이 들면 지렁이도 게도 망둥이도 같이 영향을 받는다. 부표도 뜨고 쓰레기도 뜬다. 통화정책은 부자와 빈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차입자와 대부자를 가리지 않는다. 보편적이며 무차별적이다. 그래서 아무도 굽신거리지 않는다. 한은 중립성은 그렇게 명예인 동시에 멍에다.
한은이 차별적 정책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다면 중립성은 포기해야 한다. 성장과 소득분배는 이미 정치다. Fed가 ‘고용’을 중앙은행의 과업으로 명시한 것은 고용정책을 펴라는 것이 아니라 고용과 인플레의 모순, 즉 트레이드 오프(trade-off)를 견디라는 것이다. 한은이 그것조차 이해 못할 지력은 아닐 것이다. 부디 말장난은 삼가는 것이 좋다. 성장과 분배는 선거에 의해 교체되는 정부의 과업이다. 완전한 지력이거나 독재 권력이 아니면서 적절한 소득균형 수준을 결정할 수는 없다. 청와대는 지금쯤은 한은 총재 후보들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토론도 질문도 해볼 것이 아닌가. 어떤 자질이 필요한지를 모르니 기껏 출신대학 따지는 것밖에 더 하겠는가. 사회의 수준을 좀 높이자.
정규재 논설위원실장 jkj@hankyung.com
관련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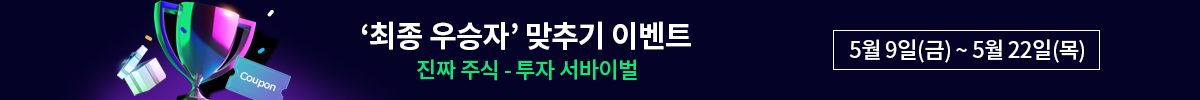


 한국은행 총재 후보를 논하는 자리마다 등장하는 학력·학연 및 영어능력과 인맥 따위의 스펙론을 듣고 있노라면 우리 사회의 부박함을 새삼 떠올리게 된다. 특정 후보의 고교 시절 천재성에 대한 회고들도 그렇다. 학교 성적은 그렇게 한국인의 골수에 박힌 단어다. 판사들은 옷을 벗을 때까지 사시 성적표를 등에 붙이고 다닌다지 않는가. 아무도 판결에 주목하지 않는 것처럼 한은의 임무를 따져 총재 자격을 논하는 사람도 없다.
한국은행 총재 후보를 논하는 자리마다 등장하는 학력·학연 및 영어능력과 인맥 따위의 스펙론을 듣고 있노라면 우리 사회의 부박함을 새삼 떠올리게 된다. 특정 후보의 고교 시절 천재성에 대한 회고들도 그렇다. 학교 성적은 그렇게 한국인의 골수에 박힌 단어다. 판사들은 옷을 벗을 때까지 사시 성적표를 등에 붙이고 다닌다지 않는가. 아무도 판결에 주목하지 않는 것처럼 한은의 임무를 따져 총재 자격을 논하는 사람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