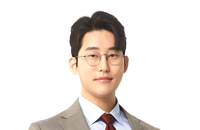이윤은 많은 소비자들을 만족시킨 결과물
기업은 인류가 고안한 효율적인 조직체
 매년 대입 면접에 나가 학생들을 평가한다는 모 대학 경제학과 교수. 그는 늘 기본적인 질문을 먼저 던진다고 한다. “기업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는 학생들의 대답에 놀라곤 한다고 전한다. 학생들의 대답은 이렇게 요약된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것보다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해 어려운 사람을 도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윤을 적대시하고 기업을 사회복지 단체로 알고 있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학교가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매년 대입 면접에 나가 학생들을 평가한다는 모 대학 경제학과 교수. 그는 늘 기본적인 질문을 먼저 던진다고 한다. “기업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는 학생들의 대답에 놀라곤 한다고 전한다. 학생들의 대답은 이렇게 요약된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것보다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해 어려운 사람을 도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윤을 적대시하고 기업을 사회복지 단체로 알고 있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학교가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기업 기원론
기업은 왜 생겼을까? 한번도 고민해보지 않은 질문일 수 있다. 늘 옆에 있으면 존재의 기원을 잊기 쉽다. 기업기원론은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시장거래를 내부거래로 전환하기 위해 기업이 나타났다.’ 어렵다. 나무 책상을 생산한다고 가정해 보자. 나무 책상을 만들려면 원자재, 벌목공, 목수, 페인트공, 톱, 대패, 트럭운송자 등을 구해야 한다. 시장거래를 통해 이런 것을 모아야 제품을 생산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매번 이렇게 하면 많은 거래비용이 발생한다. 이것을 사고, 저런 사람을 구하러 찾아 나서야 하고…. 단계마다 엄청난 시간과 거래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에 이런 사람과 원자재, 장비, 도구 등을 ‘특정 조직’ 안에 모아 놓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시장에서 찾아다닐 때보다 물적, 심적, 시간적 거래비용을 확 줄일 수 있다. 이것을 기업이론화한 사람이 있다. 미국 시카고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코즈는 1937년 ‘기업의 본질’이라는 논문에서 이론화했다. 외부 것을 내부화하는 것이 기업이라는 얘기다. 기업 내에서 이뤄지는 근로계약 같은 거래를 전문용어로 ‘내부거래’라고 한다. 종합하면 기업은 시장거래를 내부거래로 전환해 거래비용을 줄이는 조직이다.
기업의 종류
 물론 기업에도 종류가 있다. 우리가 말하는 주식회사는 무엇일까. 주식회사는 나중에 생겼다. 합명회사, 합자회사라는 것이 먼저 있었다. 합명회사는 신뢰관계가 깊은 소수의 사람들이 만드는 공동기업이다. 회사가 도산할 경우 회사 자산을 매각해 빚을 갚고도 빚이 더 남으면 만든 사람들이 자기 재산까지 팔아 갚아야 한다. 무한책임이 적용된다. 지분을 남에게 팔려면 모든 출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자본을 출자할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진다.
물론 기업에도 종류가 있다. 우리가 말하는 주식회사는 무엇일까. 주식회사는 나중에 생겼다. 합명회사, 합자회사라는 것이 먼저 있었다. 합명회사는 신뢰관계가 깊은 소수의 사람들이 만드는 공동기업이다. 회사가 도산할 경우 회사 자산을 매각해 빚을 갚고도 빚이 더 남으면 만든 사람들이 자기 재산까지 팔아 갚아야 한다. 무한책임이 적용된다. 지분을 남에게 팔려면 모든 출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자본을 출자할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진다.합자회사는 이런 피해를 줄이고 자본을 더 모으기 위해 무한책임 사원과 유한책임 사원을 섞어 놓은 형태다. 출자한도 내에서만 책임지는 유한책임 사원이 있다는 점이 합명회사와 다른 점이다. 자본 조달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여전히 무한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 애로가 발생한다.
주식회사는 출자한 모든 주주가 유한책임을 지는 형태여서 책임 정도가 낮아진다. 위험에 대한 책임이 줄어들어 자본 출자자를 찾기 쉬워진다. 여러 사람들이 자본을 모아 운영하는 자발적인 결사체가 주식회사다.
기업의 이윤과 손실
 이윤에 대한 반감은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상인들이 이윤을 붙여 파는 것을 못마땅해했다. ‘이용을 위한 생산’이어야 하지 ‘이윤을 위한 생산’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었다. 그때는 아마도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그랬을지도 모른다.
이윤에 대한 반감은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상인들이 이윤을 붙여 파는 것을 못마땅해했다. ‘이용을 위한 생산’이어야 하지 ‘이윤을 위한 생산’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었다. 그때는 아마도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그랬을지도 모른다.이윤은 정당하고 도덕적이라는 게 현대경제학의 해석이다. 해리 버로우즈 액튼은 “이윤 추구 행위란 도덕적 측면에서 봤을 때 소비자나 임금 근로자를 포함해 시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다른 참여자들의 행위와 동등하다”고 말했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과 프레데릭 하이에크는 이윤은 소비자를 만족시켰을 때나 가능한 것이라며 이윤의 정당성을 옹호했다. 반대로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것은 손실이 나타나며, 손실을 지속적으로 본다면 기업은 청산된다는 설명이다. 기업들이 이윤을 거둬들이고 싶다고 해서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미제스는 소비자는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매일매일 투표한다고 본다. 이 투표에서 표를 많이 받는 기업만이 이윤을 얻는다.
‘과다한’ 이윤이라는 비난에 대해 그는 생산과 수요 간에 불균형이 클 때 이윤이 발생하는 만큼 ‘과다한’이란 표현은 옳지 않다고 말한다. 모든 것이 균일하게 돌아가는 경제라면 이윤이란 아예 없다는 것이다. 불균형을 채워준 결과가 이윤이라는 지적이 재미있다.
이윤을 없애면?
기업들은 이윤을 재투자해 잠재적 경쟁에 대비한다. 그러지 않으면 경쟁자에게 추월당해 손실을 입는다. 임금과 재투자, 사업 확장보다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행위란 없는 셈이다.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이윤을 철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윤을 추구한 결과 소비자들은 더 싸고 좋은 물건을 대량으로 소비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차를 개발할 이윤 동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불편한 마차를 타고 다니고 있을지 모른다.
고기완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dadad@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