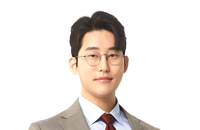이런 시스템 부재의 이면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 바로 돈(비용) 문제다. 국민 의료비 절감이란 명분 아래 건강보험 수가는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통제됐다. 감염병을 치료하는 데 건보 지원금은 한 달에 고작 1만890원이라고 한다. 하루 363원꼴이다. 그러면서 병원의 적정투자를 기대하는 것은 난센스다. 제대로 된 응급실, 1인 병실, 전문 간병 모두가 돈 문제로 귀결된다. 국내 최고라는 병원조차 격리자 치료를 위한 음압병상이 없다는 데 모두가 개탄한다. 그러나 음압병상 하나 설치하는 데 평균 1억원이 들고 운영할수록 적자인 현실은 외면한다.
치명적인 사고는 대개 ‘공짜 포퓰리즘’이 민간의 낮은 수익성과 결합할 때 생겨난다. 1년 전 세월호 사고도 따지고 보면 영세성과 안전성의 상충관계에서 비롯된 참사다. 시장이 형성되지 못한 채 아무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기에 평형수를 빼고 적재량의 3배를 싣는 ‘악마의 곡예운항’이 벌어졌다. 세금을 먹는 무상급식과 낡은 교실, 지하철 누적부채와 노후 전동차도 그와 비슷한 조합이다. 값싼 전기료와 블랙아웃 위험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여름 전기요금을 깎아주겠다니 놀랍다.
제값을 못 받는 서비스가 모두를 만족시키는 경우는 없다. ‘공유지의 비극’ 탓이다. 특히 의료 안전 등 공공서비스는 중국집 군만두처럼 딸려오는 게 아니다.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예방하려면 지불할 것은 지불해야만 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삶에는 그에 합당한 청구서가 따라온다.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