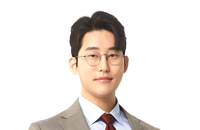(45) 박성현의 '개인이라 불리는 기적' (상)

“혹시 우리 과 학생 아니신가?”
“아저씨는 누구세요?”
졸업하던 해, 강의실 앞에서 마주친 교수님과 오갔던 대화다. 나는 미안해하지 않았고 그는 불쾌해 하지 않았다. 그 세월이 그랬다. 대학시절, 나는 그 시간의 절반을 총학생회실에서 보냈다. 2학년 때는 차장으로, 3학년 때는 부장으로. 1980년대 총학생회의 기획부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운동권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하기 쉬운데 죄송하지만 아니다. 언더(지하 이념 서클)에서 오픈(공개 학생 기구)을 띄우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건 메이저 캠(시위를 자체 가동할 수 있는 운동력이 있는 학교)의 경우이고 마이너 캠(다른 학교 시위에 묻어간다)에서는 언더의 체력이 달려 그게 안 된다. 마이너 캠에서는 이른바 ‘권’과 리버럴이 합의해 총학생회를 장악하고 자리를 배분한다. 나는 리버럴쪽이었다.
선배 하나가 내 정체를 꿰뚫어보고 이렇게 말했다. “이 자식은 얼핏 보면 좌익이지만 실은 뼛속까지 부르주아야.” 당시 선배는 자유주의라는 말을 몰랐다. 그래서 떠올린 말이 당시 척결해야 할 악의 대명사처럼 쓰이던 부르주아라는 단어였을 것이다. 예리한 놈. 졸업식 때 입고 갈 양복 사 입을 돈도 없었는데 부르주아는 무슨 얼어죽을. 이데올로기에 흥미를 느낀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현실 변혁 같은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머릿수로 뭘 해보려는 집단주의도 싫었고 가식적인 민중 친화적 풍토도 싫었다. 물론 드러내고 반발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학교에서는 루카치를 읽었지만 집에서는 카프카를 읽었다. 카프카의 이런 구절이 좋았다.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내가 혼자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만 있고 ‘나’는 없는 사회
 1980년대 대학가 서점에는 딱 두 종류의 책밖에 없었다. 마르크스가 쓴 책, 마르크스에 대해 쓴 책. 마르크스주의자가 되는 건 필수였고 볼셰비키가 되는 건 선택이었다. 마르크스는 집단의 철학자이고 경제학자였다. 마르크스에게 개인 같은 건 없었다. 하긴 1980년대에 개인이라는 건 없었다. 나는 한 번도 홀로 ‘나’인 적이 없었고 항상 ‘우리’ 중 하나로서의 ‘나’였다. 군사 파쇼와 싸우는 우리들 자체가 파쇼(이탈리아어로 묶음이라는 뜻이다)였다. 우리는 같은 책을 읽고 같은 노래를 불렀으며 동시에 분노하고 동시에 달려야 했다. 거부나 이견은 ‘우리’로부터의 배제와 단절과 말살로 돌아왔다. 노동 운동 관련 세미나를 하다가 이렇게 물어본 적 있다. “이 사람, 혹시 엠페도클레스 콤플렉스 환자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전태일이었고 엠페도클레스 콤플렉스란 불에 타죽고 싶어 하는 병증을 말한다. 맞아 죽을 뻔했다. 나는 세상에 대해 영원히 입을 다물기로 했다.
1980년대 대학가 서점에는 딱 두 종류의 책밖에 없었다. 마르크스가 쓴 책, 마르크스에 대해 쓴 책. 마르크스주의자가 되는 건 필수였고 볼셰비키가 되는 건 선택이었다. 마르크스는 집단의 철학자이고 경제학자였다. 마르크스에게 개인 같은 건 없었다. 하긴 1980년대에 개인이라는 건 없었다. 나는 한 번도 홀로 ‘나’인 적이 없었고 항상 ‘우리’ 중 하나로서의 ‘나’였다. 군사 파쇼와 싸우는 우리들 자체가 파쇼(이탈리아어로 묶음이라는 뜻이다)였다. 우리는 같은 책을 읽고 같은 노래를 불렀으며 동시에 분노하고 동시에 달려야 했다. 거부나 이견은 ‘우리’로부터의 배제와 단절과 말살로 돌아왔다. 노동 운동 관련 세미나를 하다가 이렇게 물어본 적 있다. “이 사람, 혹시 엠페도클레스 콤플렉스 환자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전태일이었고 엠페도클레스 콤플렉스란 불에 타죽고 싶어 하는 병증을 말한다. 맞아 죽을 뻔했다. 나는 세상에 대해 영원히 입을 다물기로 했다. 나 같은 인간이 아주 없지는 않았나 보다. 서울대 사회학과 운동권이었던 이건범의 《내 청춘의 감옥》은 수형 생활을 담담하게 써 내려간 회고담이다. 그는 운동권 노래를 부르는 도중 화음을 넣어 선배에게 ‘쿠사리’를 먹는가 하면 징역 생활 내내 다른 운동권처럼 철학책을 읽는 대신 소설을 읽는다. 소설에는 인간이 있다. 그는 철학이나 역사를 성찰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성찰을 반복했다. 다음은 책의 한 문장이다.
나 같은 인간이 아주 없지는 않았나 보다. 서울대 사회학과 운동권이었던 이건범의 《내 청춘의 감옥》은 수형 생활을 담담하게 써 내려간 회고담이다. 그는 운동권 노래를 부르는 도중 화음을 넣어 선배에게 ‘쿠사리’를 먹는가 하면 징역 생활 내내 다른 운동권처럼 철학책을 읽는 대신 소설을 읽는다. 소설에는 인간이 있다. 그는 철학이나 역사를 성찰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성찰을 반복했다. 다음은 책의 한 문장이다.“세상이 달라지는데 ‘자율적이고 충만한 개인’이 얼마나 중요한 전제 조건인가를 고민하면서부터 나는 철의 규율로 단련된 혁명 조직 그리고 그 조직이 주도하는 폭력혁명과 헤어져야 했다. 아니 그렇게 혁명이 돼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변했다. 개인의 내면세계를 일구고, 더디더라도 민주주의를 거쳐 최대한의 공통분모를 만드는 게 앞으로 내가 우리 사회를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이라고 봤다. 그럼으로써 나는 ‘이념’의 포승줄에서 풀려나 ‘나’에게로 돌아왔다.”
이 사람은 타고난 자유주의자였다. ‘운동업계’에서는 절대 성공하지 못할.
‘떼’의 근성 안에 있는 폭력과 잔혹함
 사상가인 박성현 역시 운동권 출신이다. 자유주의자는 성향을 숨길 수 없다. 박성현은 수배 도중 니체를 품고 다녔다(남민전의 전사였던 김남주가 레닌 선집을 끼고 다녔던 것과 대비된다). 나중에 박성현은 니체와 자신의 오랜 숙고를 섞어 책을 한 권 낸다. 그게 《개인이라 불리는 기적》이다. 박성현은 집단 혹은 떼와 대비되는 존재로서의 개인을 조명한다. 세상과 팽팽한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자아로서의 개인을 통해 역사를 말하고 철학을 논한다. 먼저 역사 이야기부터 하자. 니체 스타일로 말하면 ‘떼의 계보학’쯤 되겠다.
사상가인 박성현 역시 운동권 출신이다. 자유주의자는 성향을 숨길 수 없다. 박성현은 수배 도중 니체를 품고 다녔다(남민전의 전사였던 김남주가 레닌 선집을 끼고 다녔던 것과 대비된다). 나중에 박성현은 니체와 자신의 오랜 숙고를 섞어 책을 한 권 낸다. 그게 《개인이라 불리는 기적》이다. 박성현은 집단 혹은 떼와 대비되는 존재로서의 개인을 조명한다. 세상과 팽팽한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자아로서의 개인을 통해 역사를 말하고 철학을 논한다. 먼저 역사 이야기부터 하자. 니체 스타일로 말하면 ‘떼의 계보학’쯤 되겠다.“호모사피엔스는 수만 년 동안 문중, 대가족, 씨족을 가장 중요한 생존 단위이자 생존 전략으로 삼아 살아왔다. (중략) 정착 농경사회에서는 사정이 더 엄격했다. 사람은 떼에 속하고 떼는 땅에 속했기 때문이다. (중략) 인간은 아주 오랫동안 떼로 살아왔다. 따라서 공공연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의 판단 기준과 선택을 내세우는 사람, 즉 개인은 ‘공공의 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전통 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은 낯설고 위험한 종족이었으며 매우 예외적인 현상이었다.”
박성현은 이 떼에서 이탈한 개인들의 대표 주자로 디오게네스를 꼽는다.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묻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댁이 햇볕을 가리고 있으니 좀 비켜달라고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그는 명백히 이단아다. 전쟁에서 지는 날이면 한 국가가 몰살당하거나 노예가 되는 상황에서 강력한 전체주의는 필수다. 그는 그 전체의 바깥에 있었다. 그는 스스로 홀로 개인이 되었다. 박성현이 두 번째로 꼽은 인물은 루터다. 루터는 신앙 자체로 죄를 용서받는 것이지 교회의 권위 혹은 교황이 인정한 선행에 의해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루터의 생각에 신 앞에는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있었다. 그래서 신과 인간 사이에서 권력을 행사하던 교회라는 집단을 밀어냈다.
(다음 호에서 계속)
남정욱 < 숭실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