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근호 기자 ] 개인과 기업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조세회피처(tax haven)’를 활용하는 전략은 현대 금융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2013년 조세회피의 역사를 다룬 책 《보물섬》을 출간한 영국의 경제분석가 니컬러스 색슨은 “조세회피처를 떼어놓고 현대 사회와 경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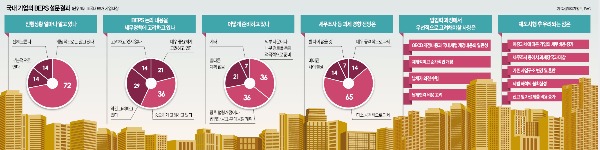
가장 초기의 조세회피처로는 미국 뉴저지주와 델라웨어주가 꼽힌다. 1880년대 세수 확보가 시급했던 뉴저지주는 본사를 뉴저지주에 두는 기업에 설립·등록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낮은 법인세를 적용했다. 뉴저지로 기업들이 몰려드는 것을 본 델라웨어주도 1898년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더 엄밀한 의미로 현대적인 조세회피처가 생겨난 것은 스위스가 1934년 은행 비밀보장법을 제정하면서였다. 출처를 숨기고 세금을 피하고 싶은 세계 각국의 자금이 몰려들면서 스위스는 오랫동안 ‘검은돈의 천국’이란 오명을 들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정의에 따르면 조세회피처는 단순히 세율이 낮은 곳이 아니다. 낮은 세율 외에도 조세정보교환(비밀주의), 조세행정의 투명성 등도 조세회피처를 규정하는 기준�?된다.
1957년 영국 런던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로달러시장은 1960~1990년대에 조세회피처의 황금기를 만들어냈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오일 머니 등으로 늘어난 역외 달러는 미국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유로달러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됐다. 런던이 세계 외환거래의 중심지가 됐고, 영국령 해외영토들이 이를 지원하는 조세회피처로 부상했다.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바하마, 케이맨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저마다 케이맨제도에 투자회사나 펀드를 등록하면서 국제결제은행(BIS)의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케이맨제도는 세계 네 번째로 큰 금융센터에 해당했다.
최근엔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베네룩스 3국과 아일랜드가 조세회피처로 자주 활용된다. 법인세율이 낮고 지주회사와 관련된 규제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애플과 구글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활용해 유명해진 일명 ‘더블 아이리시 위드 더치 샌드위치’ 방식도 아일랜드와 네덜란드를 이용한 전략이다. 구글의 아일랜드 자회사에 모인 세계 각국의 로열티 수입은 세율이 낮은 네덜란드 자회사로 보내져 세금을 아꼈고, 네덜란드 자회사를 관리하는 아일랜드 법인은 버뮤다에 등록해 과세를 피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