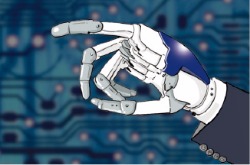 지난 주말 미국 프로골프(PGA) 프로암대회에서 ‘엘드릭’이란 로봇이 파3 홀인원을 기록했다고 한다. 일본 시세이도는 37년 만에 자국에 세우는 공장이 사람 대신 로봇만 쓴다고 해서 논란이다. 9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는 “로봇이 전문가가 되기 위한 경력 쌓기를 방해한다”는 문제 제기성 칼럼을 게재했다. 요즘 하루에도 몇 건씩 쏟아지는 로봇·인공지능 관련 뉴스들이다.
지난 주말 미국 프로골프(PGA) 프로암대회에서 ‘엘드릭’이란 로봇이 파3 홀인원을 기록했다고 한다. 일본 시세이도는 37년 만에 자국에 세우는 공장이 사람 대신 로봇만 쓴다고 해서 논란이다. 9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는 “로봇이 전문가가 되기 위한 경력 쌓기를 방해한다”는 문제 제기성 칼럼을 게재했다. 요즘 하루에도 몇 건씩 쏟아지는 로봇·인공지능 관련 뉴스들이다.세계적으로 ‘로봇 공포증(로보포비아)’이 부쩍 심해졌다.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란 걱정이다. 설상가상으로 다보스포럼은 5년 내 주요 15개국에서 일자리 710만개가 사라진다고 잔뜩 겁을 줬다. 최근 출간된 인간은 필요 없다에선 카지노 딜러 로봇, 커피숍 판매 로봇, 심지어 매춘 로봇까지 소개하고 있다.
실제로 산업현장의 위험한 정밀·반복작업은 로봇으로 대체된 지 오래다. 로봇은 휴가나 임금인상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인명구조·군사용 로봇도 투입되고 있다. 이제는 주식투자 로봇 등이 화이트칼라와도 경쟁할 판이다. 지식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인공지능이 체스, 퀴즈, 루빅큐브에서 인간 챔피언을 꺾고 바둑황제 이세돌에게 도전장을 �쨈? IBM의 체스 인공지능 ‘왓슨’은 의료분야에 투입됐다고 한다. 인공지능이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 기술 진보를 따라잡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원초적 공포심을 자극한다.
로봇이란 명칭은 체코어로 강제노동이란 뜻의 ‘robota’에서 나왔다. SF 작가 아이작 아시모프는 1942년 ‘로봇 3원칙’을 세웠다.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명령에 복종하며, 앞의 두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신을 보호하는 존재다. 그러나 대중이 인식하는 로봇은 다르다.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인공지능 HAL9000, ‘아이 로봇’의 안드로이드처럼 인간에게 적대적이다. 이런 인식이 로봇의 발달,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상승작용을 일으켜 로봇 공포증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현실은 SF와 다르다. 가사도우미 로봇조차 여전히 초보단계다. ‘모라벡의 역설’처럼 인간에게 어려운 것을 척척하는 로봇도 정작 인간에게 쉬운 것은 어려워 한다. 인간이면 누구나 호기심과 아이디어가 자연스럽지만 로봇과 인공지능에는 그런 게 없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만드는 것도, 조종하는 것도 다 사람이다. 쓰기 나름이란 얘기다.
과거 자동차, 컴퓨터가 처음 등장했을 때도 다들 일자리를 걱정했다. 로봇을 두려워만 말고 ‘로봇 유토피아’를 만들 순 없을까.
오형규 논설위원 ohk@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