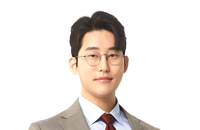의리는 중국인들의 행위규범이라고 했다. 규범(norm)이 되려면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또 준수해야 한다. 전편에서 소개했듯이 한곳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죽었던 혈연사회에서는 삼강오륜으로도 충분히 됐을 것이다. 그런데 당나라를 전후로 중국 내외부의 환경 변화로 인해 국내외 무역이 발달하게 됐다. 이제 혈연이라는 ‘아는 사람끼리’로부터 ‘모르는 사람’과의 접촉이 본격화됐다. ‘아는 이’들 간의 규범만을 제시한 ‘삼강오륜’ 외에, 확장된 사회에 맞는 규범이 필요하게 됐다. 베이징대의 류스딩(劉世定) 교수는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하던 사회구조가 혈연 밖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서양 규범이 ‘혈연에서, 종교로 그리고 법률’로 바뀌었다면, 중국은 혈연 대신에 ‘의’를 채택하게 됐다”고 강조한다.
의리는 중국인들의 행위규범이라고 했다. 규범(norm)이 되려면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또 준수해야 한다. 전편에서 소개했듯이 한곳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죽었던 혈연사회에서는 삼강오륜으로도 충분히 됐을 것이다. 그런데 당나라를 전후로 중국 내외부의 환경 변화로 인해 국내외 무역이 발달하게 됐다. 이제 혈연이라는 ‘아는 사람끼리’로부터 ‘모르는 사람’과의 접촉이 본격화됐다. ‘아는 이’들 간의 규범만을 제시한 ‘삼강오륜’ 외에, 확장된 사회에 맞는 규범이 필요하게 됐다. 베이징대의 류스딩(劉世定) 교수는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하던 사회구조가 혈연 밖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서양 규범이 ‘혈연에서, 종교로 그리고 법률’로 바뀌었다면, 중국은 혈연 대신에 ‘의’를 채택하게 됐다”고 강조한다.‘의’가 행위규범으로 등장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이 모호한 개념이 어떻게 대다수 중국인에게 전파될 수 있었을까. 뭔가 추상적인 개념인 경우, 이것을 상징 또는 아이콘으로 만들어 전달하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薩뭣?義의 아이콘은 관우
 관우 연구의 대가인 후샤오웨이(胡小偉)와 류스딩 교수는 “관우는 명장 및 충신에서 무신(武神)으로, 그리고 명·청(明淸)시대에 이르러,재신(財神)으로 추대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중국인들은 이 의리의 영웅 또는 아이콘으로 관우를 선택한 것이다.
관우 연구의 대가인 후샤오웨이(胡小偉)와 류스딩 교수는 “관우는 명장 및 충신에서 무신(武神)으로, 그리고 명·청(明淸)시대에 이르러,재신(財神)으로 추대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중국인들은 이 의리의 영웅 또는 아이콘으로 관우를 선택한 것이다.어렸을 적, 중국인들의 집에 가면 유비와 그 의 형제인 관우와 장비가 그려진 커다란 그림(사진)이 걸려 있었다. 이상하게도 맏형인 유비는 오히려 서 있고, 관우만 혼자 의자에 앉아 있었다. 삼국지에서의 느낌과 달리, 관우를 더 존중한다. 중국의 3대 종교인 유·불·도교에서 모두 추앙받는 유일한 인물이 관우다.
의리는 무협 세계에서만 존중받는 가치가 아니다. ‘강호(江湖)’는 소위 제도권을 벗어난 삶의 형태, 무림인들 또는 암흑가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원래의 의미는 말 그대로 ‘강’과 ‘호수’였다. 사람들이 모여 살려면 물이 필수다. 강호 주변이야말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고, 또 상업이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즉 강호는 사람이 사는 곳이며,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은 (상업이 발달함에 따라) 점점 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다. 모르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전통 중국의 삼강오륜 등에는 ‘부자, 군신, 장유, 부부 및 친구’ 등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만이 있고,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 설정이 없다. 상업 발달은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준칙이 필요했고, 결국 포괄적으로 그것을 ‘의리’라고 했으며, 관우야말로 그 모범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한편 실리를 추구했던 중국인들은 관우에게 의식세계에서의 우상을 넘어서, 의리를 지켜야 돈도 벌 수 있다는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지위마저 부여했다. 바로 “이의취재(以義取財: 의리를 통해 재물을 모은다)”의 논리를 다져가며 관우를 재신으로 추대하게 된다.
유비와 장비를 우연히 만나서 도원결의하고, 평생 ‘신의’를 지킨 관우는 그렇게 중국인들에게 ‘의리’의 화신이 됐다. 류스딩 교수는 관우라는 아이콘이 보여주는 특징을 다음의 세 가지로 소개한다. 첫째 혈연을 초월한 사회규범의 확장. 둘째 오랜 책임의 관계 강조. 셋째 ‘의’와 이익성취는 상충이 아니라 상생관계다. 굳이 풀어 보면 모르는 이들과도 혈연 같은 깊은 신뢰관계가 가능하며, 오랫동안 서로 지켜야 하고, 이는 의식형태의 가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의 성공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
義와 利益은 상생관계
중국인들과 어울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면 관우를 기억해 보자. 중국 사람들이 부르면 나가서 만나자. 처음 만나 불편할 것 같다고 해서 미루지 말고,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대해보자. 그리고 그들과 자주, 오랜 시간을 보내도록 노력하자. 중국 사람들은 흔히 “공로는 없어도, 수고는 했다(雖無功勞, 但有苦勞)”고 말한다.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됐어도, 함께한 시간을 중시한다.
단기적인 효율만을 따져서는 중국인으로부터 “의리있다”는 말을 들을 수 없다. 공과 사의 ‘우리식의 명쾌한’ 구분은 ‘중국식 의리’와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중국 사람들과 어울림의 첫 실천은 ‘의리를 지키는(講義氣)’ 것이다. 물론 상대방에게는 의리를 요구하면서, 스스로는 그것을 이용하려는 소인배들은 중국이나 한국이나 어디에나 있으니, 이런 이들은 당연히 잘 경계해야 할 것이다.
류재윤 < 한국콜마 고문 >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