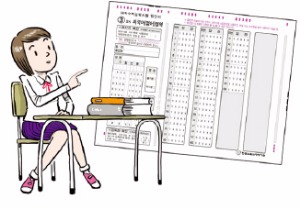 “교과서만 잘 봐도 풀 수 있다더니….” “국어가 ‘죽어’로 보였다.” “지문 하나를 통째로 날려 먹은 시험은 처음이다.” “이럴 줄 알았으면 재수 안 했을 텐데, 1교시 풀면서 삼수해야 하나 고민했다.”
“교과서만 잘 봐도 풀 수 있다더니….” “국어가 ‘죽어’로 보였다.” “지문 하나를 통째로 날려 먹은 시험은 처음이다.” “이럴 줄 알았으면 재수 안 했을 텐데, 1교시 풀면서 삼수해야 하나 고민했다.”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난이도에 대한 불만이 많다. 지난 5년간의 ‘물수능’에 비해 전 영역이 어렵게 출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두 문제 실수 때문에 당락이 갈리는 ‘물수능’보다는 ‘불수능’이 낫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어차피 시험은 경쟁이고 올바른 경쟁을 위해서는 잘 가려내야 한다. 변별력이 있어야 억울함도 없다.” “‘맹물시험’보다 눈치작전 등의 혼란이 줄어들 것이다.”
이번 시험에서 국어의 지문은 최대 2600자에 달했다. 과학전문 용어가 나오는가 하면 논리적 추론을 요구하는 문제도 등장했다. 개정된 교육 과정으로 처음 치른 수학도 어려운 문제가 많았다. 당연히 만점자는 작년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모든 영역에서 고루 득점한 학생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어느 해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수능이다. 냉온탕을 넘나들다 보니 문제점도 많았다. ‘불수능’보다는 ‘물수능’의 부작용이 더 컸다. 수학, 영어 과목의 만점자가 속출했고, 한 문제 차이로 등급이 달라지는 바람에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낭패도 겪었다. 초·중·고 12년 학업 결산이 실수 한 번으로 끝장나기도 했다.
실력이 아니라 실수로 떨어지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학생들은 재수를 택하게 된다. 재수생의 58%가 그렇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대학 1학년 때 휴학·자퇴하고 다시 시험을 보는 반수(半修)도 신입생의 17%(5만여명)에 이른다. 이들의 등록금만 5000억원이 넘는다. 공부를 열심히 하든 게을리하든 성적에 큰 차이가 없는 건 불합리하다.
수능을 쉽게 내면 학업 부담이 줄어들고 사교육도 감소할 것이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수능을 쉽게 낸 지난 5년 사이에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했다. 이런저런 요인을 따져 볼 때, 시험 난이도는 약간 높더라도 변별력이 있는 게 더 낫다.
장기적으로는 시험의 성격도 고민해봐야 한다. 미래 학습능력을 따지는 미국식 대학수학능력시험(SAT) 같은 것인지, 고교 과정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는 유럽식 평가시험인지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바칼로레아처럼 입체적인 사고를 키우기는커녕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평면적인 게 우리 수능이다. 이래서야 글로벌 경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나.
고두현 논설위원 kdh@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