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은서 기자 ]

“모든 것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고정된 요소는 오직 사람뿐이죠.”(스티브 헌트 SAP 글로벌인재연구소장)
기업은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 어떻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뿐이라면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문제는 조직이다. ‘움직이는 골대(목표)’에도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조직을 적응시키는 건 훨씬 어려운 문제다.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으로 유명한 독일 SAP의 글로벌인재연구소를 맡고 있는 헌트 소장은 “사람들이 변화를 싫어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조직원들이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려면 목적의식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0일 서울 도곡동 SAP코리아를 찾은 그는 인사컨설팅 전문 기업 머서코리아의 정지영 부사장과의 대담에서 기업을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민첩한 조직(애자일 조직)으로 바꾸는 노하우를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과 인사관리 분야 전문가인 유규창 한양대 경영대 교수가 사회를 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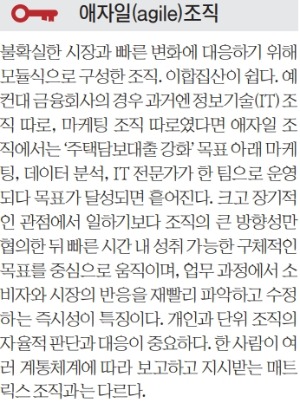 ▶유규창 교수=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에서도 볼 수 있듯,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변화를 따라잡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유규창 교수=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에서도 볼 수 있듯,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변화를 따라잡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스티브 헌트 소장=그럴 때 유일한 대안은 사람이다. 사업 수익성이 떨어지는데 인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반면 수익을 많이 내고 있더라도 인재가 떠나면 미래가 없는 조직이다. 사람이 미래다. 민첩하게 미래에 대응하는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온다.
▶정지영 부사장=과거엔 대량생산을 추구하면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계획을 세우고 면밀하게 여러 상황을 통제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효율성보다 혁신이 중요하다.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 예측하기도 어려운데 변화에 빨리 적응해야만 한다. 과거엔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중간 점검하고 연말에 평가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몇 달 단위로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늘어난다. 평가와 계획 수립이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헌트 소장=대기업의 조직문화를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처럼 바꿔야 한다. 직원 30명짜리 스타트업에서는 누가 뭘 하고 있고, 뭘 할 수 있는지를 모두 다 알고 있다. 반면 직원이 3000명, 3만 명인 대기업에선 누가 뭘 하는지도 잘 모른다. 적임자가 누군지도 분명치 않다. 과거엔 어쩔 수 없는 문제였지만, 정보기술(IT)이 발달한 지금은 정보 격차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대기업도 민첩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과거에 해당 직원이 뭘 했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뭘 할 수 있는가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다면 인재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역량을 키워주는’ 인사를 할 수 있다.
▶유 교수=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
▶헌트 소장=머신러닝 등을 활용해 직무 중심으로 일을 정의하고 사람을 찾을 필요가 있다. 많은 기업은 노동력이 부족(labor shortage)한 것이 아니라 (특정 분야의) 기술력을 지닌 사람이 부족(skill shortage)하다. 회사 차원에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린다면 조직원도 그 분야를 익히면 승진 기회가 늘어난다고 판단하고 배우려 할 것이다.
▶정 부사장=필요한 기술을 누가 지니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가 시스템에 바로 업데이트돼야 가능할 것이다. 보상과 승진, 배치가 그런 정보와 무관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
▶헌트 소장=맞는 말이다. 자극이 필요하다. 한 예로 전공과 무관한 곳에 근무하던 회계학 전공자가 자기 정보를 공개하자 타 부서에서 곧바로 스카우트했다. 그 사례가 알려지면서 사내에서 정보를 공개하려는 움직임이 커졌다. 이런 흐름이 활발해지려면 1년에 한 번 인사이동하는 식으론 안 된다. 성과관리, 보상도 상시화돼야 한다.
▶유 교수=경영학에선 오래전부터 조직원이 스스로 자신의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것을 이상적인 형태로 제시했다. 기술 발달이 이런 이상을 구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같다.
▶정 부사장=지금 논의되는 애자일 조직은 막연한 ‘이상향’이 아니라 현실에서 당장 필요로 하는 조직 형태다. 민첩한 조직으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산업의 종류나 국적, 문화와 관계없이 기업 경영자들에게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유 교수=서구 기업과 달리 한국 기업은 수직적 문화가 강하지 않는가.
▶정 부사장=그렇다. 하지만 정도에 차이가 있다.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이른바 애자일 조직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기업들은 직급 등이 뚜렷하지 않다. 반면 삼성 같은 경우 굉장히 위계질서가 세다. 분명 같은 하이테크 기업이고 빠르게 변화에 적응하는데 방법론이 다른 것이다. 계획과 관리 통제를 중시하는 문화가 있다. 그러나 변화하려는 부분도 보인다. 예컨대 삼성전자 내 ‘C랩’에선 대리급이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의 수장을 맡고 차장, 부장을 팀원으로 거느린다. 꼭 필요한 분야에서는 극도의 민첩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유 교수=한국 기업은 주로 대규모 공채로 직원을 뽑고 순환보직을 한다.
▶헌트 소장=미국 군대 채용과정도 한국 공채와 비슷하지만, 고졸 신병을 9개월 만에 항공기 정비 전문가로 탈바꿈시킨다. 대규모 공채로 인재를 확보했더라도 적성을 면밀히 검토해 빠르게 전문가 트랙에 배치할 수 있다.
▶유 교수=한국과 일본의 종신고용 문화는 조직원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는 배경으로 꼽히기도 한다.
▶헌트 소장=미국식 문화라고 해서 변화에 유리하지만은 않다. 안전판이 없다 보니 뭔가를 시도했다가 자칫 일자리를 잃고 건강보험 걱정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양 극단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
▶유 교수=빠른 변화를 강조하면 조직 내 피로감이 커질 수 있다.
▶정 부사장=사람은 누구든 변화에 어느 정도 피로감을 갖게 마련이다. 재미도 없는데 자꾸 맞춰야 하니까 피곤한 것이다. 내가 스스로 몰입하는 이슈라면 덜 피곤하다. 변화를 통해 일이 더 잘 되면 성취감을 느낀다. 따라서 직원을 어떻게 프로젝트에 몰입하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헌트 소장=동감한다. 또 일과 가정의 균형도 맞춰야 한다. 내가 완전히 탈진한 상태라면 변화에 대한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SAP는 아이를 학교에서 데려오기 위해 콘퍼런스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설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민첩한 조직이 된다는 건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회사가 된다는 것이기도 하다.
▶유 교수=그렇다. 직원에 대한 이해, 지속적인 코칭을 통한 목표 공유, 상호 학습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
정리=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