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두현 기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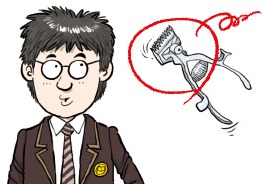 중·고교 학생들의 두발·교복 자유화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머리카락 길이 규제를 없애고 염색·파마를 허용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자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다. 한쪽에서는 “이제 두발 규제를 완전히 풀 때가 됐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학생들의 염색과 파마는 절대 안 된다”며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중·고교 학생들의 두발·교복 자유화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머리카락 길이 규제를 없애고 염색·파마를 허용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자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다. 한쪽에서는 “이제 두발 규제를 완전히 풀 때가 됐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학생들의 염색과 파마는 절대 안 된다”며 국민청원을 제기했다.논쟁의 핵심은 ‘학생의 기본권’과 ‘학생 보호를 위한 지도 재량권’의 대립이다. 그 배경에는 교육법상 ‘특별권력관계 논쟁’이 깔려 있다. 특별권력관계란 공법상의 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학생들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이는 학생의 기본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이에 관한 판례 중 하나가 미국의 ‘틴케 기준’이다. 1965년 오하이오주 공립학교 학생들이 월남전 반대 표시로 검은 완장을 두르고 등교했다가 정학 처분을 받았다. 연방대법원은 당시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학교의 특수성에 비춰 일정한 한계와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일본에서도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위해 최소한의 제약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18세 미만 청소년 보호를 위해 기본권 제한을 인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두발자유화는 1982년, 교복자유화는 1983년에 시작됐다. 이후 학교 밖 생활지도의 어려움, 지나친 소비 경쟁 등의 부작용 때문에 보완조치가 잇따랐다. 2000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뒤에도 학교별 적용 방식이 달랐다.
현재는 서울 시내 중·고교의 84%가 머리카락 길이 제한을 없앴다. 그러나 염색과 파마가 가능한 학교는 드물다. 올해 초 두발과 복장 규정을 개정한 한 고교에서도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의견이 엇갈렸다. 등하교 시 지정된 교복 착용과 두발 길이 제한에 교사와 학부모가 각각 100%, 93.8% 찬성했고 학생은 45.9% 동의했다. 학생들의 반대 의견이 절반을 넘었지만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한국의 두발·복장 자유화 논란에는 법적·교육적 기준 외에도 ‘일제 잔재’라는 감정적 잣대가 곁들여져 있다. 1970년대 정부 단속에 대한 반발심리까지 더해졌다. 서울교육청은 내년까지 학내 토론을 통해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일선 학교가 결정할 일에 교육감이 직접 나서는 바람에 오히려 학교 자율을 침해한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렵게 됐다.
kdh@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