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원순 기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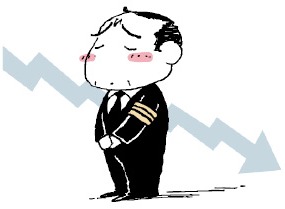 한자 교육을 덜 받은 탓일까.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우리 지명의 연원이 생소한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다. 경상도는 경주(慶州)와 상주(尙州)에서 나왔다. 전라도는 전주(全州)와 나주(羅州), 충청도는 충주(忠州)와 청주(淸州)에서 비롯됐다. 이들 도시는 고려 때부터 지역별 거점이었다. 들이 넓고 교통도 좋아 물산이 넉넉하고 인구도 많았다.
한자 교육을 덜 받은 탓일까.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우리 지명의 연원이 생소한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다. 경상도는 경주(慶州)와 상주(尙州)에서 나왔다. 전라도는 전주(全州)와 나주(羅州), 충청도는 충주(忠州)와 청주(淸州)에서 비롯됐다. 이들 도시는 고려 때부터 지역별 거점이었다. 들이 넓고 교통도 좋아 물산이 넉넉하고 인구도 많았다.유서 깊은 이런 ‘전통 도시’도 도시화라는 세계적 메가트렌드 앞에선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산업화 전문화 정보화 첨단화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집중화에 타격받는 지방의 쇠락은 애처로울 지경이다. 도시화와 경제 발전은 뗄 수 없는 관계지만, 한국에서는 수도권 과밀화와 함께 진행되고 있어 이중의 난제다. 지방은 황폐화를 걱정하는 상황인데, 서울과 주변 도시는 과밀화에 따른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수원·고양·용인시는 이미 대도시의 국제 기준인 밀리언시티(million city)다. 성남·부천시도 그 직전에 있다. 핵심은 인구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적정 규모의 인구 확보에 고심하면서 치열한 ‘21세기 인구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옛 거점 도시 중 상주시가 먼저 도시화에 따른 된서리를 맞았다. 이달 들어 인구가 1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이를 위기로 인식한 상주 공무원들이 그제 상복을 연상시키는 검은 옷 차림으로 출근해 주목을 끌었다. 조선 8도 부목군현(府牧郡縣) 중 들 넓기로 손꼽혔던 상주의 현실이다. 1965년 26만5000명을 정점으로 반세기 만에 시세가 절반 아래로 꺾였다.
위기의 전통 도시는 상주만이 아니다. 영주·영천시 같은 곳도 아슬아슬하게 10만 명을 유지하고 있다. 군지역은 더 절박하다. 철원 횡성 담양 합천 하동 등은 인구 5만 명 확보에 바쁘다. 5만이면 수도권의 한 개 동 수준이다. 임실 구례 순창 청송은 ‘인구 3만 달성’이 군정의 최대 과제다.
‘저출산 고령화 도시화’의 삼각파도 속에 재정난을 겪은 일본 지자체들 퇴락이 남의 일이 아니다. 일본에서는 ‘2040년까지 지자체의 절반이 사라질 것’(마스다 리포트)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돼 온 나라가 충격에 휩싸인 적이 있다. 한국이 이런 것까지 일본을 닮아가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면 교부세가 줄고, 공무원도 감축해야 한다. ‘지역특화’ ‘지역경쟁’ 같은 근본 해법을 거론하기조차 조심스럽다. 자칫 악순환의 덫에 빠질 지역 주민들이 걱정이다. 등 굽은 소나무마냥 향리를 지켜온 이들에게 출향 도시민들이 따스한 눈길이라도 주면 좋겠다.
huhws@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