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정진 기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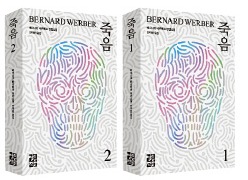 ‘누가 날 죽였지?’
‘누가 날 죽였지?’갑작스레 죽음을 맞이하고 떠돌이 영혼이 돼버린 인기 추리소설 작가 가브리엘 웰즈는 이런 질문을 하며 눈을 뜬다. 자신의 죽음을 살인이라고 확신한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매 뤼시 필라피니를 만난다. 떠돌이 영혼이 된 웰즈와 영매 필라피니는 각각 저승과 이승에서 끈질기게 수사하며 죽음에 얽힌 진실을 파헤친다.

프랑스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사진)의 신작 《죽음》(열린책들)은 떠돌이 영혼이 자신의 죽음을 수사하는 추리소설이다. 음침하고 어두운 추리소설 스타일과 달리 시종일관 생(生)과 사(死)의 세계에서 산 자와 죽은 자가 벌이는 기이한 대화를 경쾌하고 흥미진진하게 연결했다. 소설에 등장하는 ‘영매’는 ‘신내림’을 받은 무당과 비슷한 존재여서 낯설지 않게 느껴진다. 영매 필라피니와 영혼 웰즈가 서로 갈등하고 또 돕는 과정을 통해 죽음이 인간에게 가장 신비로운 주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베르베르는 죽음 이후에야 삶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주인공 웰즈의 여정을 동화 ‘미운 오리 새끼’의 백조에 대입했다. 웰즈는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주간지 기자로 다양한 기획기사를 쓰다 작가로 데뷔해 범죄학, 생물학, 심령술 등 다양한 분야의 관심사항을 소설 속에 녹여낸다. 어린 백조가 오리들에게 구박받듯 웰즈 역시 장르문학을 하위 문학으로 취급하는 프랑스 평론가들에게 혹평받지만 매년 꾸준한 리듬으로 신간을 발표하며 독자들의 지지를 받는다. 이는 모두 작가 베르베르 자신의 이야기다. 그만큼 자전적 요소가 강한 소설이다. “글쓰기가 나를 구원한다”고 했던 베르베르였던 만큼 이번 작품에서도 죽은 웰즈가 이제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다는 것에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묘사하며 글쓰기에 대한 애정을 강하게 드러낸다.
작가는 허세 가득한 프랑스 평론가와 순수문학 작가들을 재치있게 풍자하면서도 이 시대 문학을 단순히 순수와 장르(대중문학)의 대립구조로만 남겨놓지 않는다. 장르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장르마다 좋고 나쁨이 있다는 주장을 통해 어느 쪽의 우위보다 화합을 시도했다는 점도 의미있게 다가온다.
작가는 웰즈의 비석에 ‘나는 살아있고 당신은 죽었다’는 글귀를 적는다. ‘죽음이 실패이고 출생은 승리’라는 일반적인 인식에 던지는 의문이다. 소설 말미에 처음 질문했던 ‘나는 왜 죽었지?’ 대신 ‘나는 왜 태어났지?’라는 새로운 의문을 던지며 마무리한다. 베르베르는 소설 속에서 “죽음은 우리를 모든 육신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주지만 반대로 출생은 자신을 꽃피우기 힘든 억압적 세계로 들어가는 일”이라고 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작가의 관점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관련뉴스














